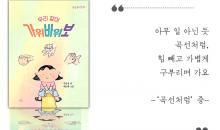[한라광장]식민의 역사, 식민의 땅 제주
- 입력 : 2015. 01.20(화) 00:00

제주는 식민지인가. 누군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탐라국 시대부터 제주4·3과 개발독재시대를 관통하면서 제주에 대한 중앙의 시각은 식민지적 시선의 반복이었다. 여기에서 식민지적 시선이라고 한 것은 중앙과 제주가 맺는 관계의 특수성 때문이다. 일본이 조선을 강제 점령하였듯이 식민과 피식민의 관계가 뚜렷하면 극복해야 할 과제도 분명히 보인다.
그렇지만 식민과 피식민의 관계가 모호하다면, 즉 식민지가 피식민지를 문화적으로 지배하고 그 지배의 방식을 교묘하게 은폐한다면 그것은 식민지 상황보다 더 위험하다. 마치 전투에서 적이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가장 탁월한 전술인 것처럼. 식민지 상황을 국가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내부의 문제로 바라본 것은 헤치터였다. 그는 국가가 다른 국가를 지배하는 것만이 식민지 상황이 아니라고 보았다. 헤치터의 견해를 발전시켜본다면 제주는 정치적으로도, 경제·문화적으로도 내부식민지적 상황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아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1949년 제주를 찾은 서재권은 공산주의 독균 보균자들이 제주 성내에 우글거린다고 썼다. 이승만 등 당시 집권세력은 제주도민 전체를 '절멸(絶滅)'시키려 했다. 민족이 민족 내부 구성원을 '절멸'의 대상으로 인식한 것은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 절멸을 피하기 위한 제주도민들의 선택은 '반공'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었다. 해병대에 자원입대하면서 스스로를 반공의 화신으로 내세웠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1960년대가 되자 '공산주의 독균'에 감염 되었던 제주에 '관광개발'과 '낙원제주 건설'이라는 깃발이 휘날렸다. 우리는 위로부터 강요된 개발에 환호하기도 하고 제주적인 것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그렇게 수십년을 개발의 깃발 아래에서 보냈다.
'낙원 제주건설'을 외치며 '제2의 하와이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낙원 제주건설'이 '국제자유도시 건설'로 바뀌었지만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순진하게' 국가가 결정하면 선산을 옮기고 마을 공동목장을 팔았다. 그곳에 관광단지가 조성되었고 대규모 리조트 단지가 개발되고 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애국가가 나오면 차렷 자세로 도열하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국가의 호명에 충실하게 응답했다.
'국제자유도시'는 결국 자본의 무한 증식을 위해 규제의 빗장을 풀어버리는 일이었다. 얼마나 규제를 풀어야 피해가 적을지 국가는 제주를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그럴 때마다 국가는 예산이라는 당근을 흔들었다. 경주마를 길들이듯 몇 푼의 돈을 쥐어주기도 했다.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현실은 참혹했다.
대를 이어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난 가장은 제주를 떠났다. 매일이 지옥이었고 지옥을 잊기 위해 술을 마셨다. 그렇게 목숨을 잃은 이들도 여럿이었다. 싼 값에 사들인 땅을 국가는 웃돈을 주고 대기업과 외국인들에게 넘겨버렸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발전의 길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을 앞서서 실천한 이들이 바로 제주의 지배층이었다.
지난 10여 년은 고삐 풀린 말처럼 국가의 식민지배가 제주를 흔들었다. 중앙권력으로부터 지배를 위임받은 지역의 정치인들은 그것을 자신의 권력처럼 마구 휘둘렀다. 땅을 팔고 규제를 풀었다. 그 땅에 카지노가 들어서고 거리엔 중국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다. 성찰이 없다면 일깨워줘야 한다. 각성한 시민의 힘으로, 그들을 소환해야 한다. 반성하라고 책임지라고 외쳐야 한다. 제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동현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하지만 탐라국 시대부터 제주4·3과 개발독재시대를 관통하면서 제주에 대한 중앙의 시각은 식민지적 시선의 반복이었다. 여기에서 식민지적 시선이라고 한 것은 중앙과 제주가 맺는 관계의 특수성 때문이다. 일본이 조선을 강제 점령하였듯이 식민과 피식민의 관계가 뚜렷하면 극복해야 할 과제도 분명히 보인다.
그렇지만 식민과 피식민의 관계가 모호하다면, 즉 식민지가 피식민지를 문화적으로 지배하고 그 지배의 방식을 교묘하게 은폐한다면 그것은 식민지 상황보다 더 위험하다. 마치 전투에서 적이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가장 탁월한 전술인 것처럼. 식민지 상황을 국가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내부의 문제로 바라본 것은 헤치터였다. 그는 국가가 다른 국가를 지배하는 것만이 식민지 상황이 아니라고 보았다. 헤치터의 견해를 발전시켜본다면 제주는 정치적으로도, 경제·문화적으로도 내부식민지적 상황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아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1949년 제주를 찾은 서재권은 공산주의 독균 보균자들이 제주 성내에 우글거린다고 썼다. 이승만 등 당시 집권세력은 제주도민 전체를 '절멸(絶滅)'시키려 했다. 민족이 민족 내부 구성원을 '절멸'의 대상으로 인식한 것은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 절멸을 피하기 위한 제주도민들의 선택은 '반공'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었다. 해병대에 자원입대하면서 스스로를 반공의 화신으로 내세웠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1960년대가 되자 '공산주의 독균'에 감염 되었던 제주에 '관광개발'과 '낙원제주 건설'이라는 깃발이 휘날렸다. 우리는 위로부터 강요된 개발에 환호하기도 하고 제주적인 것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그렇게 수십년을 개발의 깃발 아래에서 보냈다.
'낙원 제주건설'을 외치며 '제2의 하와이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낙원 제주건설'이 '국제자유도시 건설'로 바뀌었지만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순진하게' 국가가 결정하면 선산을 옮기고 마을 공동목장을 팔았다. 그곳에 관광단지가 조성되었고 대규모 리조트 단지가 개발되고 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애국가가 나오면 차렷 자세로 도열하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국가의 호명에 충실하게 응답했다.
'국제자유도시'는 결국 자본의 무한 증식을 위해 규제의 빗장을 풀어버리는 일이었다. 얼마나 규제를 풀어야 피해가 적을지 국가는 제주를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그럴 때마다 국가는 예산이라는 당근을 흔들었다. 경주마를 길들이듯 몇 푼의 돈을 쥐어주기도 했다.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현실은 참혹했다.
대를 이어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난 가장은 제주를 떠났다. 매일이 지옥이었고 지옥을 잊기 위해 술을 마셨다. 그렇게 목숨을 잃은 이들도 여럿이었다. 싼 값에 사들인 땅을 국가는 웃돈을 주고 대기업과 외국인들에게 넘겨버렸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발전의 길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을 앞서서 실천한 이들이 바로 제주의 지배층이었다.
지난 10여 년은 고삐 풀린 말처럼 국가의 식민지배가 제주를 흔들었다. 중앙권력으로부터 지배를 위임받은 지역의 정치인들은 그것을 자신의 권력처럼 마구 휘둘렀다. 땅을 팔고 규제를 풀었다. 그 땅에 카지노가 들어서고 거리엔 중국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다. 성찰이 없다면 일깨워줘야 한다. 각성한 시민의 힘으로, 그들을 소환해야 한다. 반성하라고 책임지라고 외쳐야 한다. 제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동현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2025.12.28(일) 20:14
2025.12.28(일)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