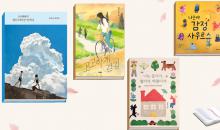- 입력 : 2025. 08.22(금) 03: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지난 7월 26일 진행된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3차행사에 참가자들이 동명리곶자왈 입구 '안소랭이' 습지 앞에서 물 문화(물통쓰임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양치류 숲길에서 느낀 치유와 회복
잊힌 숲에서 되살아난 기억과 삶
[한라일보]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더운 날씨 탓인지 참가자가 예상보다 적었다. 2025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3차가 진행되는 날이다. 19명의 참가자들은 '종합운동장' 만남의 장소에서 모여 저지마을로 향했다. 오늘의 길잡이는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변덕진해설사이다.

인사 및 소개를 마치고 해설사는 저지 마을에 대해 안내를 했다. 저지 마을은 2007년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되었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살기 좋은 마을, 가고 싶은 생태관광지 마을로도 선정 되었다며 설명하는 얼굴엔 마을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묻어났다. 그는 탐방에 앞서 "오늘 탐방은 독특한 지형 곶자왈 과 사람, 기후 위기에 처한 생물들의 생태 이야기를 주제로 삼아 봤다"라며 탐방을 시작했다.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습지 앞에서 제주도는 상수도가 나오기 전에는 물이 귀해서 빗물을 이용했고 물을 구분 하여 썼던 쓰임새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습지를 '물통'이라 불렀다며 "옛날엔 이 물로 빨래도 하고 가축에게도 물을 먹였으며 아이들은 수영도 했다" 고 어릴 적 친구들과 수영하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분위기를 한껏 이어나갔다.
이동하여 식수로 쓰였던 물통도 안내하였다. 습지에는 생물들이 자라고 있었고 그 중에 독특하게 생긴 우렁이알이 많이 관찰되어 사진을 찍는 참가자도 있었다.

지난 7월 26일 진행된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3차행사에 참가자들이 곶자왈 문화(잣성·친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안소랭이물 전경

우렁이알

으름덩굴
탐방은 명리동 곶자왈 에서 먼저 시작하였다. 변덕진 해설사는 곶자왈의 이름부터 풀어주었다. "명리동 곶자왈은 이곳에서 살아온 명리동 사람들의 터전입니다."라고 하며 곶자왈의 형성을 조리 있게 설명하여 주었다. 이곳은 도너리오름 에서 분출한 묽은 용암이 만든 용암지형이다. 흐른 용암이 판처럼 굳어 물을 가두고, 곶자왈 숲속 곳곳에도 습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 공유화 재단이 이 일대를 매입해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예전엔 제주 땅의 30%가 곶자왈이었지만, 지금은 6% 이하로 줄었고. 개발은 빠르지만, 보존은 쉽지 않다고 힘을 주어 설명하였다. 그는 곶자왈은 지하수 함양 지대와 생태적 가치가 있는 곳이며 이러한 곳이 점점 줄어드는 실정에 대해 안타까움을 덧붙였다.
곶자왈은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탄소 흡수원, 치유의 공간, 양치식물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명리동 곶자왈은 출입이 제한된 곳이다. 오늘 우리는 처음 곶자왈을 밟아 보는 마음에 신비감이 들었다. 암괴지대에 형성된 숲은 사이사이에 초록을 머금은 이끼와 양치류, 제 멋대로 자란 덩굴들로 가득 찼다. 마치 깊은 숲 한가운데 밀림지대에 들어와 있는 듯했다. 양치류의 보고라고 알려진 곶자왈은 더부살이고사리·밤일엽·가는쇠고사리·석위 등이 많이 관찰 되었다. 다양한 식물들을 보며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겨우 참았다. 길도 없는 이곳을 변덕진해설사는 주저 없이 앞서 길을 잘도 헤쳐 나갔다. 여름 숲은 포란 시기를 맞은 멧비둘기 와 섬휘파람새가 노래하고, 초피· 으름·탱자·도토리나무는 탐스러운 결실들을 내 놓고 있다. 두 시간 넘게 발목에 힘을 주며 걸었다. 입구에 이르러 미지의 세계를 헤쳐 나온 듯 일행들은 안도의 숨을 내 쉰다. 길의 끝자락, 변덕진해설사는 '안소랭이' 물통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종가시 나무

초피나무

밤일엽
돌투성이를 일궈 밭을 일궜으니 생존을 위한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볏바른궤 전경
설명을 듣던 나이 드신 일행이 "나도 나무 팔러 간적이 있다"고 실감나게 경험담을 이야기 하여 분위기가 고조 되었다. 이어서 변덕진해설사는 저지곶자왈의 보물은 '제주백서향'과 야생생물멸종위기 2급인'개가시나무'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연이어 양치식물 에 대한 이야기로 양치식물은 지구에서 먼저 나타날 때 지구가 아주 따뜻해서 나무처럼 컸었다고 했다. 지하에 묻혀 석탄의 원료가 된 식물이라고 생태에 대한 설명도 아끼지 않았다.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은 인간이 필요이상으로 탄소를 쓰기 때문이라고 하며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설명을 조심스럽게 마무리를 하였다.

김정자
곶자왈을 활용한 지혜·인내·강인함이 고스란히 묻혀 있는 제주곶자왈. 척박한 삶을 살아 내야만 했던 제주인 들은 곶자왈과 닮았다. 그래서 누군가 물으면 제주 사람을 알려면 곶자왈을 걸어보라고 말 하고 싶다.
도착지점에서 해설사는 "곶자왈의 생태적 가치와 지하수함양기능은 너무도 소중하고 보존되어야 할 곳"이라고 강조하며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탐방은 자연을 걷는 여정 이자, 그 안에 살아 있는 사람과 기억을 만나는 일이었다.
< 글·사진 김정자 '글쓰는자연관찰자'>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1

합격자 대부분이 '지인'… 돌문화공원 불공정 채용 논란
- 2

제주시청 공무원 음주사고 후 측정 거부해 검찰 송치
- 3

"서광로 주민이 테스트베드냐" 섣부른 BRT 추진 질타
- 4

제주발 'GM볼' 역베팅 투자사기 피해·범죄 규모 '눈덩이'
- 5

제주자치도 공무원 또 증원.. 이번엔 근로감독 22명
- 6

[종합] 제주 삼양동·봉개동 도의원 선거구 현행 유지 가닥
- 7

[현장] “직원 총출동”… 설 맞아 물량 쏟아진 우편집중국
- 8

제주 올해 지방공무원 572명 선발.. 2006년 이후 최대
- 9

"만다린 무관세 수입 위기?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 10

제주 공략 나선 국힘… 중앙당 제2공항 특위 위원장 선임
- 03:00

[2025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13) 벌라릿굴-수산…
- 03:00

[2025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12) 골체오름 입구…
- 03:00

[2025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11)신양해수욕장-…
- 03:00

[2025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10)한라대 실습 목…
- 03:00

[2025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9)절물자연휴양림…
- 03:00

[2025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8)하도목장~동검…
- 02:00

[2025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7)곤을동4·3유적…
- 03:00

[2025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6) 영암자비암~웃…
- 03:00

[2025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5)5·16도로 수악교…
- 03:00

[2025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4) 선덕사 입구-천…















 2026.02.14(토) 19:40
2026.02.14(토)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