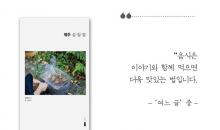[사설] 용천수 사라지는데 복원사업 쉽지 않네
- 입력 : 2018. 08.20(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용천수는 지층 속을 흐르던 지하수가 지표와 연결된 지층이나 암석의 틈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오는 물이다. 지하수가 본격 개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용천수는 귀한 대접을 받았다. 당시 용천수는 제주의 유일한 식수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제주의 해안이나 중산간에는 용천수와 샘물이 솟아나는 곳에 마을이 형성된 것이다. 제주인의 생명수 역할을 했던 용천수가 점차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서 복원사업도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한 용천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는 모두 1025곳의 용천수가 분포하고 있다. 이중 매립 또는 멸실 등으로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364곳을 제외하면 현재 661곳의 용천수가 남아 있는 상태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는 동지역 119곳 등 395곳이고, 서귀포시는 동지역 133곳 등 266곳이다. 특히 도내 용천수 1025곳 가운데 270곳은 도로개설 등으로 매립되거나 멸실됐다. 또 94곳은 용천수 위치 확인이 안될 정도로 완전히 사라졌다. 이에 따라 현재 남아 있는 용천수는 661곳이다. 이 가운데 일부 지역은 용출량이 줄어들거나 오염원에 노출될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도내 곳곳에 분포한 용천수를 관리·보전하기 위한 복원사업도 녹록지 않다. 서귀포시의 경우 2009년부터 마을 용천수 복원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39곳을 복원했다. 서귀포시 지역 용천수가 모두 266곳임을 감안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용천수 복원사업은 해마다 적게는 9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8000만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식생 복원과 쉼터 조성, 울타리 정비, 조경시설을 하고 있다. 올해도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나 현재까지 6400만원을 들여 예래동 돔벵이물, 퐁남물, 남바치물 등 3곳을 복원하는데 그쳤다. 배정된 사업비는 1억3600만원이 남았다.
물론 용천수 복원사업이 저조한데 대해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용천수에 전적으로 의존했으나 이제는 거의 지하수를 이용하면서 관심이 멀어진 탓이다. 때문에 지역주민의 공동체 공간으로서 생태·문화·역사적 가치를 지닌 용천수 복원사업도 저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용천수는 예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삶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녹아든 곳이다. 제주인에게 용천수는 삶 그 자체나 다름없다. 앞으로 물이 말라버리거나 아예 사라지는 용천수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서귀포시 지역만 해도 용천수가 많게는 371곳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100곳 이상 줄어들었다. 용천수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관리 방안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제주도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한 용천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는 모두 1025곳의 용천수가 분포하고 있다. 이중 매립 또는 멸실 등으로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364곳을 제외하면 현재 661곳의 용천수가 남아 있는 상태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는 동지역 119곳 등 395곳이고, 서귀포시는 동지역 133곳 등 266곳이다. 특히 도내 용천수 1025곳 가운데 270곳은 도로개설 등으로 매립되거나 멸실됐다. 또 94곳은 용천수 위치 확인이 안될 정도로 완전히 사라졌다. 이에 따라 현재 남아 있는 용천수는 661곳이다. 이 가운데 일부 지역은 용출량이 줄어들거나 오염원에 노출될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도내 곳곳에 분포한 용천수를 관리·보전하기 위한 복원사업도 녹록지 않다. 서귀포시의 경우 2009년부터 마을 용천수 복원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39곳을 복원했다. 서귀포시 지역 용천수가 모두 266곳임을 감안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용천수 복원사업은 해마다 적게는 9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8000만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식생 복원과 쉼터 조성, 울타리 정비, 조경시설을 하고 있다. 올해도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나 현재까지 6400만원을 들여 예래동 돔벵이물, 퐁남물, 남바치물 등 3곳을 복원하는데 그쳤다. 배정된 사업비는 1억3600만원이 남았다.
물론 용천수 복원사업이 저조한데 대해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용천수에 전적으로 의존했으나 이제는 거의 지하수를 이용하면서 관심이 멀어진 탓이다. 때문에 지역주민의 공동체 공간으로서 생태·문화·역사적 가치를 지닌 용천수 복원사업도 저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용천수는 예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삶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녹아든 곳이다. 제주인에게 용천수는 삶 그 자체나 다름없다. 앞으로 물이 말라버리거나 아예 사라지는 용천수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서귀포시 지역만 해도 용천수가 많게는 371곳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100곳 이상 줄어들었다. 용천수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관리 방안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02:30
[사설] 제주도 하반기 정기인사, 다시 출발선에…
- 00:30
[사설] 불법주정차 만연…사고 야기 경각심 절실
- 01:30
[사설] 중소기업 고용시장 활로가 보이지 않는다
- 01:00
[사설] 트라우마센터 국비 전액 지원 관철시켜야
- 01:00
[사설] 민생회복 소비쿠폰, 내수 진작 마중물로
- 00:30
[사설] 추자 해상풍력단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 01:00
[사설] 고수온 피해 예방 근본대책 마련해야
- 00:30
[사설] 하원테크노캠퍼스, 경쟁은 지금부터다
- 00:30
[사설] 올 장마 끝, 폭염·1차산업 피해 등 유비무…
- 00:00
[사설] 가정폭력·아동학대 전국 상위권 ‘불명…















 2025.07.13(일) 10:05
2025.07.13(일)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