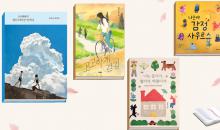[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36] 3부 오름-(95)쳇망오름과 개오름, 지형특성 반영
쳇망오름 고대어 '수티마르', 고구려어 기원
- 입력 : 2025. 07.22(화) 03:00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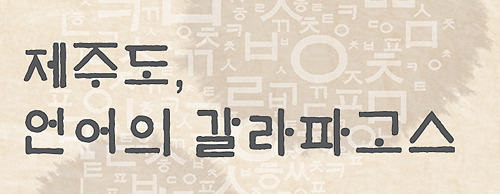
거리가 먼 개오름 지명해독
쳇망오름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표고 1354.9m의 오름이다. 1709년 탐라지도에 개산악(盖山岳), 1734~1754년 사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삼읍도총지도에 건송악(乾松岳)으로 표기했다. 지형도나 안내지도 등 일부에서 망체오름, 천망악(川望岳)으로도 표기한 예가 있다. 네이버지도에는 망체오름, 카카오맵에는 쳇망오름으로 표기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오름안내지도에는 쳇망오름으로 표기했다.
 1700년대 초반에 개산악(盖山岳)이라 했다는 것은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아무도 해독을 시도하지 않았다. 개산악(盖山岳)의 '산(山)'은 '뫼 산'이라고 하지만 제주 지명에서 주로 '마르'를 차자할 때 사용하고 있다. '개(盖)'는 '덮을 개'라고 한다. 그러므로 한자 뜻 그대로 해석한다면 개산악(盖山岳)이란 '마르를 덮은 오름'의 뜻이 될 텐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말이 안 된다.
1700년대 초반에 개산악(盖山岳)이라 했다는 것은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아무도 해독을 시도하지 않았다. 개산악(盖山岳)의 '산(山)'은 '뫼 산'이라고 하지만 제주 지명에서 주로 '마르'를 차자할 때 사용하고 있다. '개(盖)'는 '덮을 개'라고 한다. 그러므로 한자 뜻 그대로 해석한다면 개산악(盖山岳)이란 '마르를 덮은 오름'의 뜻이 될 텐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말이 안 된다.
이 글자가 동원된 오름이 또 있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표고 344.7m의 개오름이다. 이 오름의 지형적 특징은 중앙에 골짜기가 있다는 점이다. 개오름이라는 지명은 오름 모양이 개 모양이라거나 풍수지리설에서 나온 이름이라는 설명이 널리 유포되어 있다. 이런 설명은 구악(拘岳)이라는 표기에서 기인한다. 개악(蓋岳)이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밥그릇 뚜껑이라거나 양산처럼 생겼기 때문이라고도 푼다.

골짜기가 있는 오름 '갈올'
1709년 탐라지도 등에 개악(盖岳), 이후 문헌들에는 개봉(盖峯), 구악(拘岳) 등으로 표기하였다. 오늘날 지도에는 개오름으로 나온다. 이 오름을 개악(盖岳)이라고 표기했던 바로 1709년 탐라지도에 쳇망오름은 개산악(盖山岳)이라고 표기한 것이다. '덮을 개(盖)'라는 한자에 견인돼서 밥그릇 뚜껑 같다는 설명이 나왔다. 구(拘)는 '개 구'자이다. 그러므로 이 글자를 해석하여 개와 같은 형상이라서 개오름으로 했다는 설이 만들어졌다. 모두 어떻게든 이야기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다. 다만 이 지명에 나오는 글자들의 공통점은 '개'라는 소리를 반영해 보려는 노력의 하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실 구악(拘岳)의 구(拘)는 '개 구'자이므로 훈가자로 쓴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무 이상이 없는 지명이다. 구악이라고 쓰고 개오름이라고 읽으라는 취지다.
이 지명에 대해 조금 더 짚고 넘어가자. '개남오롬' 혹은 '개낭오롬'에서 소리가 바뀌어 '개오롬'으로 한 것이라고 추정한 예가 있다. 그 이유로 이 오름 바로 위에 개남전(蓋南田)이란 지명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개남'은 제주어 '개낭'이므로 개낭이 많이 나는 '밧'이라는 정도의 뜻을 갖는 지명일 것이라는 취지다. '개오름'이라는 지명도 이와 공통 기원일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려면 '개=개낭'이라는 등식이 성립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또 이곳에 지명에 반영될 만큼 장기적이면서 특징적으로 '개낭'이 자랐을까 하는 점도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한낱 개인적 생각일 뿐이다.
오름의 지명은 그 오름의 특징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골짜기가 있는 오름은 고대어로 '갈올(골올)'이다. '갈올'의 '갈'에서 'ㄹ'이 탈락하여 '가올'이 되고, 다시 '가올', '개올', '개오름' 등으로 된다. 300년 전 이 쳇망오름을 개산악(盖山岳)이라고 했다면 당시에는 '갈마르'라고 불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오름은 이웃하는 사재비동산과의 사이에도, 이스렁오름과의 사이에도 골짜기 깊다. 골이 있는 오름이다.
'갈올'에 승리한 '수티마르'
쳇망오름이란 무슨 말인가? 쳇망의 '체'에 대해서 대체로 가루를 치거나 액체를 거르는 체에서 온 말로 보고 있다. 이 오름 모양이 '쳇망' 혹은 '망체' 같다는 데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설명한다. '체망'이나 '망체'라는 어휘는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는다. 다만 제주어사전에 '쳇망'은 체에 가리기 위해 씌우는 그물이라거나 쳇바퀴에 메워 액체나 가루 따위를 거르는 그물 모양의 물건이라고 나온다. 오름의 특성과 관련시킬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어형이 비슷하니 갖다 붙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까마득한 고대어를 어찌 현대어로 풀 수 있겠는가.
'쳇망'이거나 '망체'거나 여기 나오는 '망'은 '마르'에서 기원한 말이다. 지금은 잊힌 개산악(盖山岳)이라는 지명에 '마르'의 의미인 '산(山)'이 있다는 점에서 선명하다. '망'이란 마르>말>마>의 변화를 거치다가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 만>망으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체'라는 말은 본 기획 어승생오름과 달랑쉬 편 등에서 볼 수 있다. 고려 때에는 봉우리를 술(述)이라 쓰되 '숱(sut)'이라 발음했으며, 이보다 훨씬 전인 고구려 때에는 성지(省知)라 쓰고, '수티(suti)'라고 했었다. 고구려어는 기본적으로 개음절어이므로 오늘날 국어의 폐음절어로 복원하면 'ㅅ+ㅌ+ㅣ'의 구성이다. '치'에 가까운 발음이다. 여기에 '마르'를 만나 '치말'이 되고 다시 오름을 의미하는 '올' 이나 '오리' 등과 만나 발음하는 과정에 '치말올' 혹은 '치말오리'를 거쳐 위의 '마르→만→망'의 과정으로 쳇망오름으로 된 것이다. 건송악(乾松岳)이라는 지명은 '마를 건'과 '솔 송'의 조합이다. '마르쇠오름'을 훈가자 표기 방식으로 쓴 것이다. 망체오름이란 뜻이다. 천망악(川望岳)이라는 표기는 음가자 차자 표기 방식이다. 쳇망오름을 표기한 것이다.
'체'라는 말은 본 기획 어승생오름과 달랑쉬 편 등에서 볼 수 있다. 고려 때에는 봉우리를 술(述)이라 쓰되 '숱(sut)'이라 발음했으며, 이보다 훨씬 전인 고구려 때에는 성지(省知)라 쓰고, '수티(suti)'라고 했었다. 고구려어는 기본적으로 개음절어이므로 오늘날 국어의 폐음절어로 복원하면 'ㅅ+ㅌ+ㅣ'의 구성이다. '치'에 가까운 발음이다. 여기에 '마르'를 만나 '치말'이 되고 다시 오름을 의미하는 '올' 이나 '오리' 등과 만나 발음하는 과정에 '치말올' 혹은 '치말오리'를 거쳐 위의 '마르→만→망'의 과정으로 쳇망오름으로 된 것이다. 건송악(乾松岳)이라는 지명은 '마를 건'과 '솔 송'의 조합이다. '마르쇠오름'을 훈가자 표기 방식으로 쓴 것이다. 망체오름이란 뜻이다. 천망악(川望岳)이라는 표기는 음가자 차자 표기 방식이다. 쳇망오름을 표기한 것이다.
지명이란 오랜 세월 경쟁하면서 정착하는 변화를 거친다. 쳇망오름은 고구려어 '수티마르' 기원인데 조선에 들어와 경쟁어 '개산악(갈올)'을 쓰기도 했다. 쳇망오름이란 '수티마르' 즉, 봉우리가 평평한 마루로 된 오름이라는 뜻이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쳇망오름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표고 1354.9m의 오름이다. 1709년 탐라지도에 개산악(盖山岳), 1734~1754년 사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삼읍도총지도에 건송악(乾松岳)으로 표기했다. 지형도나 안내지도 등 일부에서 망체오름, 천망악(川望岳)으로도 표기한 예가 있다. 네이버지도에는 망체오름, 카카오맵에는 쳇망오름으로 표기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오름안내지도에는 쳇망오름으로 표기했다.

쳇망오름, 높이 솟은 봉우리지만 평평하다. 만세동산에서 찍었다. 김찬수
이 글자가 동원된 오름이 또 있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표고 344.7m의 개오름이다. 이 오름의 지형적 특징은 중앙에 골짜기가 있다는 점이다. 개오름이라는 지명은 오름 모양이 개 모양이라거나 풍수지리설에서 나온 이름이라는 설명이 널리 유포되어 있다. 이런 설명은 구악(拘岳)이라는 표기에서 기인한다. 개악(蓋岳)이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밥그릇 뚜껑이라거나 양산처럼 생겼기 때문이라고도 푼다.

개오름, 오름 가운데 골짜기가 뚜렷하다. 비치미오름에서 찍었다.
골짜기가 있는 오름 '갈올'
1709년 탐라지도 등에 개악(盖岳), 이후 문헌들에는 개봉(盖峯), 구악(拘岳) 등으로 표기하였다. 오늘날 지도에는 개오름으로 나온다. 이 오름을 개악(盖岳)이라고 표기했던 바로 1709년 탐라지도에 쳇망오름은 개산악(盖山岳)이라고 표기한 것이다. '덮을 개(盖)'라는 한자에 견인돼서 밥그릇 뚜껑 같다는 설명이 나왔다. 구(拘)는 '개 구'자이다. 그러므로 이 글자를 해석하여 개와 같은 형상이라서 개오름으로 했다는 설이 만들어졌다. 모두 어떻게든 이야기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다. 다만 이 지명에 나오는 글자들의 공통점은 '개'라는 소리를 반영해 보려는 노력의 하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실 구악(拘岳)의 구(拘)는 '개 구'자이므로 훈가자로 쓴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무 이상이 없는 지명이다. 구악이라고 쓰고 개오름이라고 읽으라는 취지다.
이 지명에 대해 조금 더 짚고 넘어가자. '개남오롬' 혹은 '개낭오롬'에서 소리가 바뀌어 '개오롬'으로 한 것이라고 추정한 예가 있다. 그 이유로 이 오름 바로 위에 개남전(蓋南田)이란 지명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개남'은 제주어 '개낭'이므로 개낭이 많이 나는 '밧'이라는 정도의 뜻을 갖는 지명일 것이라는 취지다. '개오름'이라는 지명도 이와 공통 기원일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려면 '개=개낭'이라는 등식이 성립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또 이곳에 지명에 반영될 만큼 장기적이면서 특징적으로 '개낭'이 자랐을까 하는 점도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한낱 개인적 생각일 뿐이다.
오름의 지명은 그 오름의 특징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골짜기가 있는 오름은 고대어로 '갈올(골올)'이다. '갈올'의 '갈'에서 'ㄹ'이 탈락하여 '가올'이 되고, 다시 '가올', '개올', '개오름' 등으로 된다. 300년 전 이 쳇망오름을 개산악(盖山岳)이라고 했다면 당시에는 '갈마르'라고 불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오름은 이웃하는 사재비동산과의 사이에도, 이스렁오름과의 사이에도 골짜기 깊다. 골이 있는 오름이다.
'갈올'에 승리한 '수티마르'
쳇망오름이란 무슨 말인가? 쳇망의 '체'에 대해서 대체로 가루를 치거나 액체를 거르는 체에서 온 말로 보고 있다. 이 오름 모양이 '쳇망' 혹은 '망체' 같다는 데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설명한다. '체망'이나 '망체'라는 어휘는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는다. 다만 제주어사전에 '쳇망'은 체에 가리기 위해 씌우는 그물이라거나 쳇바퀴에 메워 액체나 가루 따위를 거르는 그물 모양의 물건이라고 나온다. 오름의 특성과 관련시킬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어형이 비슷하니 갖다 붙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까마득한 고대어를 어찌 현대어로 풀 수 있겠는가.
'쳇망'이거나 '망체'거나 여기 나오는 '망'은 '마르'에서 기원한 말이다. 지금은 잊힌 개산악(盖山岳)이라는 지명에 '마르'의 의미인 '산(山)'이 있다는 점에서 선명하다. '망'이란 마르>말>마>의 변화를 거치다가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 만>망으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지명이란 오랜 세월 경쟁하면서 정착하는 변화를 거친다. 쳇망오름은 고구려어 '수티마르' 기원인데 조선에 들어와 경쟁어 '개산악(갈올)'을 쓰기도 했다. 쳇망오름이란 '수티마르' 즉, 봉우리가 평평한 마루로 된 오름이라는 뜻이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합격자 대부분이 '지인'… 돌문화공원 불공정 채용 논란
- 2

"서광로 주민이 테스트베드냐" 섣부른 BRT 추진 질타
- 3

제주시청 공무원 음주사고 후 측정 거부해 검찰 송치
- 4

제주자치도 공무원 또 증원.. 이번엔 근로감독 22명
- 5

제주발 'GM볼' 역베팅 투자사기 피해·범죄 규모 '눈덩이'
- 6

[종합] 제주 삼양동·봉개동 도의원 선거구 현행 유지 가닥
- 7

제주 올해 지방공무원 572명 선발.. 2006년 이후 최대
- 8

[현장] “직원 총출동”… 설 맞아 물량 쏟아진 우편집중국
- 9

"만다린 무관세 수입 위기?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 10

제주 공략 나선 국힘… 중앙당 제2공항 특위 위원장 선임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63] 3부 오름-(122)사…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62] 3부 오름-(121) 사…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61] 3부 오름-(120)더…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60] 3부 오름-(119)넉…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9] 3부 오름-(118)여…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8] 3부 오름-(117)들…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7] 3부 오름-(116)부…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6] 3부 오름-(115) 돌…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5] 3부 오름-(114)성…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4] 3부 오름-(113) 이…















 2026.02.15(일) 16:28
2026.02.15(일)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