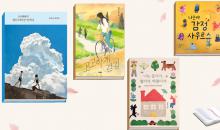[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31] 3부 오름-(90) 붉은오름은 ‘불은오름’
오름 지명은 고대어, 현대어로 풀리지 않아
- 입력 : 2025. 06.17(화) 03:00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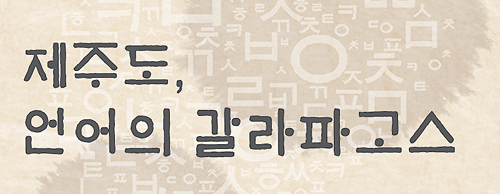
불룩하게 솟아 붉은오름
[한라일보]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158에 위치한 표고 560m, 자체높이 129m의 오름이다. 남조로 남원방향 도로 우측에 있는 오름으로, 제주도 발행의 '제주의 오름'이라는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도로 건너편의 감은이오름과 마주 보며, 물찻오름에서 보면 동쪽으로 우뚝한 오름이다.
 1703년 탐라순력도에 건을근악(件乙近岳)을 시작으로 건을근악(件乙斤岳), 적악(赤岳), 적악봉(赤岳峰), 주악(朱岳) 등이 나타난다.
1703년 탐라순력도에 건을근악(件乙近岳)을 시작으로 건을근악(件乙斤岳), 적악(赤岳), 적악봉(赤岳峰), 주악(朱岳) 등이 나타난다.
탐라순력도나 제주삼읍도총지도에 표기된 건을근악(件乙近岳)과 건을근악(件乙斤岳)의 '건을(件乙)'의 '건(件)'이란 '건기(件記)'에서 따온 글자다. '건기(件記)'란 순우리말 '발기'를 달리 표기한 것이다.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을 죽 적어 놓은 글을 과거엔 '발기'라 했다. 오늘날 한자가 보편화되면서 '건기(件記)'라 적는다. '건을(件乙)'이란 표기에서 '을(乙)'을 굳이 쓴 이유는 '건'이라 읽지 말고 '발'이라 읽으라는 표시다. 따라서 건을근악(件乙近岳)과 건을근악(件乙斤岳)의 '건을근'은 '발근'을 나타내려고 쓴 표기다. 그러므로 18세기까지 이 오름은 '발근오름'이라 발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발음 그대로 그 뜻을 나타낸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해독 상 쟁점이 될 수 있다. 탐라순력도나 제주삼읍도총지도의 저자들이 한자를 몰라서 이렇게 어렵게 글자를 골라 쓴 것이 아니다. 현지 발음을 그대로 쓰는 게 낫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후 나타난 적악(赤岳), 주악(朱岳) 등의 '적(赤)', '주(朱)' 등은 '붉을 적', '붉을 주'자다. 문제는 이게 훈가자로 쓴 것인지 훈독자로 쓴 것인지 독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생겼다. 훈가자로 해석하면 발음 그대로 '불근'이 돼서 '불근악(件乙近)'과 같아진다. 그러나 훈독자로 해석한다면 '붉은'이 돼버리는 것이다. 오늘날 제주도 내 지명학자들은 이 후자를 쫓아 '붉은오름'이라 표기하고 '흙이 붉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위가 평평하여 대비되는 구도리
사실 이 오름의 지명은 '불근오름'이며, 이 '불근'은 원래 '발'이었던 데서 '발은'으로 전성됐다가 '붉은'이 연상돼 변한 음이다. '발' 혹은 이 발음이 개음절화한 '바라'란 고대어로 '높은' 혹은 '산'이란 뜻이다.
 '봉우리'라는 뜻으로도 분화했다. 퉁구스어에서 기원한다. 그중 만주어로는 '보란'이 벼랑산을 지시하고, 솔론고어로는 '비라칸'이 산을 지시한다. 그러므로 붉은오름이란 고대인들이 '보란' 혹은 '비라'라 부르던 것이 '보란오름' 혹은 '비라오름'으로 '오름'이 덧붙으면서 분화한 것이다.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그 원래의 뜻은 잊히고 '붉다'의 뜻이 연상되면서 심지어 '흙이 붉어서' 붙은 이름이라는 데까지 오게 됐다.
'봉우리'라는 뜻으로도 분화했다. 퉁구스어에서 기원한다. 그중 만주어로는 '보란'이 벼랑산을 지시하고, 솔론고어로는 '비라칸'이 산을 지시한다. 그러므로 붉은오름이란 고대인들이 '보란' 혹은 '비라'라 부르던 것이 '보란오름' 혹은 '비라오름'으로 '오름'이 덧붙으면서 분화한 것이다.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그 원래의 뜻은 잊히고 '붉다'의 뜻이 연상되면서 심지어 '흙이 붉어서' 붙은 이름이라는 데까지 오게 됐다.
한림읍 금악리의 밝은오름(밝은오름), 명월리의 밝은오름(붉은오름), 애월읍 유수암리의 븕은오름(붉은오름, 붉은오름), 구좌읍 송당리 밝은오름(붉은오름), 제주시 봉개동의 밝은오름(붉은오름), 제주시 아라동 붉은오름(븕은오름, 붉은오름), 제주시 해안동의 밝은오름(붉은오름), 대정읍 상모리 밝은오름(붉은오름), 성산읍 신풍리 붉은오름, 성산읍 신양리 붉은오름, 안덕면 동광리 밝은오름(붉은오름), 표선면 가시리 밝은오름(붉은오름), 웃세오름 남서쪽의 붉은오름 등이 모두 이와 같은 어원에서 기원한다.
이렇게 해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구도리(오름) 혹은 구두리(오름)와 가문이(오름)로 더욱 선명해진다. 구도리 혹은 구두리라는 지명은 '굳+오리' 혹은 '굳+우리'의 구조다. '굳'이란 오늘 구덩이라는 말로 흔히 쓰인다. 이 말은 '굿'이라는 말로도 쓰는데, 사실 이 말은 '굳'에서 온 말이다. 땅이 움푹하고 깊게 파인 곳을 지시한다. 여기에 어미 '엉'이 붙은 말이다. '오리' 혹은 '우리'는 산을 지시하는 '올' 혹은 '울'에서 온 말이다. 물장올, 절울이 같은 지명에서 볼 수 있다. 이 지명은 구덩이가 있는 오름이라는 뜻이다. 다만 외부에서 볼 때 붉은오름이 불룩하게 솟아올랐다면, 구도리는 위가 평평해서 대비가 된다.
봉우리가 여러 개인 감은이
가문이오름은 붉은오름과 같은 번지에서 분리된 가시리 산158-2번지 일대다. 남서쪽으로 침식돼 얕게 벌어진 말굽형 화구를 이루고 있다. 표고 496.2m, 자체높이 106m로 붉은오름에 비해 훨씬 낮다.
1653년 탐라지와 1864년경 대동지지에 감은악(感恩岳), 1703년 탐라순력도의 산장구마편과 1709년 탐라지도 등에 거문악(巨文岳), 1703년 탐라순력도 교래대렵편, 18세기 중반 제주삼읍도총지도, 1899년 제주군읍지 등에 흑악(黑岳)으로 표기됐다.
 현지에서는 검은오름, 검은이오름, 감은이오름 등으로 채록된다. 이 오름에 천연림이 우거져 검게 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거나, 흙이 검어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명이 있다. 전형적인 어형의 유사성에 기댄 해석이다. 제주 지명해독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오류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오류는 근본적으로 고대어를 현대어로 풀이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이 지명에 대한 첫 기록은 1653년 탐라지인데 여기에는 감은악(感恩), 약 50년 후인 1703년 탐라순력도에는 거문악(巨文岳)이라 했다. 이 당시 기록자들은 굳이 '감은(感恩)'이라거나 '거문(巨文)'으로 음차했다.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글자를 동원했나? 이것은 숲이 우거져 검게 보인다거나 흙이 검어 '검은(오름)'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마주하는 붉은오름이 불룩 솟아오른 데 비해서 여러 개의 낮은 봉우리로 이뤄진 오름이다.
현지에서는 검은오름, 검은이오름, 감은이오름 등으로 채록된다. 이 오름에 천연림이 우거져 검게 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거나, 흙이 검어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명이 있다. 전형적인 어형의 유사성에 기댄 해석이다. 제주 지명해독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오류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오류는 근본적으로 고대어를 현대어로 풀이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이 지명에 대한 첫 기록은 1653년 탐라지인데 여기에는 감은악(感恩), 약 50년 후인 1703년 탐라순력도에는 거문악(巨文岳)이라 했다. 이 당시 기록자들은 굳이 '감은(感恩)'이라거나 '거문(巨文)'으로 음차했다.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글자를 동원했나? 이것은 숲이 우거져 검게 보인다거나 흙이 검어 '검은(오름)'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마주하는 붉은오름이 불룩 솟아오른 데 비해서 여러 개의 낮은 봉우리로 이뤄진 오름이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한라일보]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158에 위치한 표고 560m, 자체높이 129m의 오름이다. 남조로 남원방향 도로 우측에 있는 오름으로, 제주도 발행의 '제주의 오름'이라는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도로 건너편의 감은이오름과 마주 보며, 물찻오름에서 보면 동쪽으로 우뚝한 오름이다.

왼쪽 불룩하게 솟은 오름이 붉은오름, 맨 오른쪽은 구도리, 가운데는 감은이오름.
탐라순력도나 제주삼읍도총지도에 표기된 건을근악(件乙近岳)과 건을근악(件乙斤岳)의 '건을(件乙)'의 '건(件)'이란 '건기(件記)'에서 따온 글자다. '건기(件記)'란 순우리말 '발기'를 달리 표기한 것이다.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을 죽 적어 놓은 글을 과거엔 '발기'라 했다. 오늘날 한자가 보편화되면서 '건기(件記)'라 적는다. '건을(件乙)'이란 표기에서 '을(乙)'을 굳이 쓴 이유는 '건'이라 읽지 말고 '발'이라 읽으라는 표시다. 따라서 건을근악(件乙近岳)과 건을근악(件乙斤岳)의 '건을근'은 '발근'을 나타내려고 쓴 표기다. 그러므로 18세기까지 이 오름은 '발근오름'이라 발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발음 그대로 그 뜻을 나타낸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해독 상 쟁점이 될 수 있다. 탐라순력도나 제주삼읍도총지도의 저자들이 한자를 몰라서 이렇게 어렵게 글자를 골라 쓴 것이 아니다. 현지 발음을 그대로 쓰는 게 낫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후 나타난 적악(赤岳), 주악(朱岳) 등의 '적(赤)', '주(朱)' 등은 '붉을 적', '붉을 주'자다. 문제는 이게 훈가자로 쓴 것인지 훈독자로 쓴 것인지 독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생겼다. 훈가자로 해석하면 발음 그대로 '불근'이 돼서 '불근악(件乙近)'과 같아진다. 그러나 훈독자로 해석한다면 '붉은'이 돼버리는 것이다. 오늘날 제주도 내 지명학자들은 이 후자를 쫓아 '붉은오름'이라 표기하고 '흙이 붉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위가 평평하여 대비되는 구도리
사실 이 오름의 지명은 '불근오름'이며, 이 '불근'은 원래 '발'이었던 데서 '발은'으로 전성됐다가 '붉은'이 연상돼 변한 음이다. '발' 혹은 이 발음이 개음절화한 '바라'란 고대어로 '높은' 혹은 '산'이란 뜻이다.

구도리오름 분화구 안에는 깊은 구덩이 형태의 계곡이 형성돼 있다. 김찬수
한림읍 금악리의 밝은오름(밝은오름), 명월리의 밝은오름(붉은오름), 애월읍 유수암리의 븕은오름(붉은오름, 붉은오름), 구좌읍 송당리 밝은오름(붉은오름), 제주시 봉개동의 밝은오름(붉은오름), 제주시 아라동 붉은오름(븕은오름, 붉은오름), 제주시 해안동의 밝은오름(붉은오름), 대정읍 상모리 밝은오름(붉은오름), 성산읍 신풍리 붉은오름, 성산읍 신양리 붉은오름, 안덕면 동광리 밝은오름(붉은오름), 표선면 가시리 밝은오름(붉은오름), 웃세오름 남서쪽의 붉은오름 등이 모두 이와 같은 어원에서 기원한다.
이렇게 해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구도리(오름) 혹은 구두리(오름)와 가문이(오름)로 더욱 선명해진다. 구도리 혹은 구두리라는 지명은 '굳+오리' 혹은 '굳+우리'의 구조다. '굳'이란 오늘 구덩이라는 말로 흔히 쓰인다. 이 말은 '굿'이라는 말로도 쓰는데, 사실 이 말은 '굳'에서 온 말이다. 땅이 움푹하고 깊게 파인 곳을 지시한다. 여기에 어미 '엉'이 붙은 말이다. '오리' 혹은 '우리'는 산을 지시하는 '올' 혹은 '울'에서 온 말이다. 물장올, 절울이 같은 지명에서 볼 수 있다. 이 지명은 구덩이가 있는 오름이라는 뜻이다. 다만 외부에서 볼 때 붉은오름이 불룩하게 솟아올랐다면, 구도리는 위가 평평해서 대비가 된다.
봉우리가 여러 개인 감은이
가문이오름은 붉은오름과 같은 번지에서 분리된 가시리 산158-2번지 일대다. 남서쪽으로 침식돼 얕게 벌어진 말굽형 화구를 이루고 있다. 표고 496.2m, 자체높이 106m로 붉은오름에 비해 훨씬 낮다.
1653년 탐라지와 1864년경 대동지지에 감은악(感恩岳), 1703년 탐라순력도의 산장구마편과 1709년 탐라지도 등에 거문악(巨文岳), 1703년 탐라순력도 교래대렵편, 18세기 중반 제주삼읍도총지도, 1899년 제주군읍지 등에 흑악(黑岳)으로 표기됐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합격자 대부분이 '지인'… 돌문화공원 불공정 채용 논란
- 2

"서광로 주민이 테스트베드냐" 섣부른 BRT 추진 질타
- 3

제주시청 공무원 음주사고 후 측정 거부해 검찰 송치
- 4

제주자치도 공무원 또 증원.. 이번엔 근로감독 22명
- 5

[종합] 제주 삼양동·봉개동 도의원 선거구 현행 유지 가닥
- 6

제주 올해 지방공무원 572명 공채.. 2006년 이후 최대
- 7

제주발 'GM볼' 역베팅 투자사기 피해·범죄 규모 '눈덩이'
- 8

[현장] “직원 총출동”… 설 맞아 물량 쏟아진 우편집중국
- 9

"만다린 무관세 수입 위기?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 10

제주 공략 나선 국힘… 중앙당 제2공항 특위 위원장 선임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63] 3부 오름-(122)사…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62] 3부 오름-(121) 사…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61] 3부 오름-(120)더…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60] 3부 오름-(119)넉…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9] 3부 오름-(118)여…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8] 3부 오름-(117)들…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7] 3부 오름-(116)부…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6] 3부 오름-(115) 돌…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5] 3부 오름-(114)성…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4] 3부 오름-(113) 이…















 2026.02.15(일) 22:09
2026.02.15(일) 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