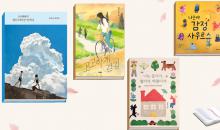[2025 제주도교육청 학생기자단] 밈(Meme), 웃음 뒤에 숨은 힘
- 입력 : 2025. 08.26(화) 02:00 수정 : 2025. 08. 26(화) 15:47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서현규 학생기자(제주제일고 2학년)>
SNS 통한 디지털 문화현상
긍정적·부정적 인식 공존
어떻게 사용할 지 고민을
[한라일보] 요즘 인터넷에서 가장 빠르게 퍼지는 콘텐츠 중 하나는 바로 '밈(meme)'이다. 밈은 짧은 영상, 이미지, 혹은 문장처럼 가볍고 쉬운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콘텐츠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제 밈은 일상적인 소통 도구가 되었다.
원래 '밈(meme)'이라는 말은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사용한 개념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생각이나 행동이 퍼져나가는 방식을 설명할 때 쓰였다. 하지만 현재의 밈은 SNS를 통해 빠르게 복제되고 소비되는 디지털 문화 현상이다.
밈이 청소년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단순하다. 짧고 빠르고, 무엇보다 '재미있기' 때문이다. 보통 수업이 끝난 쉬는 시간이나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릴스에 올라온 밈을 이용해 서로 소통하는 건 이젠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 때로는 밈 하나로 친구와 금방 친해지기도 하고, 어떤 밈을 아느냐에 따라 '요즘 애들'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밈이 항상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밈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 표현을 담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과거 한 연예인을 조롱하는 밈이 퍼지면서 그 사람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 또한 여성이나 특정 지역, 직업군에 대해 왜곡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담는 밈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밈의 또 다른 문제는 밈의 소비 속도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밈이 나타나고 사라진다. 밈처럼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해지다 보면, 길고 깊은 생각을 요구하는 내용에는 집중하기 어려워진다. 실제로 "짧은 영상에만 익숙해져 책을 잘 못 읽겠다"는 청소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밈은 나쁘기만한 것이 아니다. 잘 만든 밈은 정보 전달력도 뛰어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힘도 크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나 기후 위기 관련 캠페인에서 밈을 활용해 청소년 참여를 높인 사례도 있다. 또 교내 동아리 홍보 포스터에 밈 형식을 접목시켜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도 한다.
결국 중요한 건 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는가이다. 우리가 밈을 볼 때 단순히 웃고 넘기기보다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시선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누구를 웃기기 위한 것인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는지' 조금만 더 고민해본다면, 우리는 더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 수 있다.
밈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우리 세대의 언어이자 문화가 됐다. 밈의 힘을 알고, 그 힘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밈 사용자 아닐까? <서현규 학생기자(제주제일고 2학년)>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긍정적·부정적 인식 공존
어떻게 사용할 지 고민을
[한라일보] 요즘 인터넷에서 가장 빠르게 퍼지는 콘텐츠 중 하나는 바로 '밈(meme)'이다. 밈은 짧은 영상, 이미지, 혹은 문장처럼 가볍고 쉬운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콘텐츠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제 밈은 일상적인 소통 도구가 되었다.
원래 '밈(meme)'이라는 말은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사용한 개념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생각이나 행동이 퍼져나가는 방식을 설명할 때 쓰였다. 하지만 현재의 밈은 SNS를 통해 빠르게 복제되고 소비되는 디지털 문화 현상이다.
밈이 청소년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단순하다. 짧고 빠르고, 무엇보다 '재미있기' 때문이다. 보통 수업이 끝난 쉬는 시간이나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릴스에 올라온 밈을 이용해 서로 소통하는 건 이젠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 때로는 밈 하나로 친구와 금방 친해지기도 하고, 어떤 밈을 아느냐에 따라 '요즘 애들'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밈이 항상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밈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 표현을 담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과거 한 연예인을 조롱하는 밈이 퍼지면서 그 사람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 또한 여성이나 특정 지역, 직업군에 대해 왜곡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담는 밈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밈의 또 다른 문제는 밈의 소비 속도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밈이 나타나고 사라진다. 밈처럼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해지다 보면, 길고 깊은 생각을 요구하는 내용에는 집중하기 어려워진다. 실제로 "짧은 영상에만 익숙해져 책을 잘 못 읽겠다"는 청소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밈은 나쁘기만한 것이 아니다. 잘 만든 밈은 정보 전달력도 뛰어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힘도 크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나 기후 위기 관련 캠페인에서 밈을 활용해 청소년 참여를 높인 사례도 있다. 또 교내 동아리 홍보 포스터에 밈 형식을 접목시켜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도 한다.
결국 중요한 건 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는가이다. 우리가 밈을 볼 때 단순히 웃고 넘기기보다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시선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누구를 웃기기 위한 것인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는지' 조금만 더 고민해본다면, 우리는 더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 수 있다.
밈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우리 세대의 언어이자 문화가 됐다. 밈의 힘을 알고, 그 힘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밈 사용자 아닐까? <서현규 학생기자(제주제일고 2학년)>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합격자 대부분이 '지인'… 돌문화공원 불공정 채용 논란
- 2

제주시청 공무원 음주사고 후 측정 거부해 검찰 송치
- 3

"서광로 주민이 테스트베드냐" 섣부른 BRT 추진 질타
- 4

제주발 'GM볼' 역베팅 투자사기 피해·범죄 규모 '눈덩이'
- 5

제주자치도 공무원 또 증원.. 이번엔 근로감독 22명
- 6

[종합] 제주 삼양동·봉개동 도의원 선거구 현행 유지 가닥
- 7

[현장] “직원 총출동”… 설 맞아 물량 쏟아진 우편집중국
- 8

제주 올해 지방공무원 572명 선발.. 2006년 이후 최대
- 9

"만다린 무관세 수입 위기?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 10

제주 공략 나선 국힘… 중앙당 제2공항 특위 위원장 선임
- 00:00

[문명숙 시민기자의 눈] 깨끗한 제주 만들기, 오…
- 00:00

[열린마당] 화목보일러의 낭만은 안전관리로부…
- 00:00

[현장시선] 체류가 여는 지역소비, 제주 관광의 …
- 00:00

[열린마당] 제주 저탄소농업, 땅을 살리면 농업…
- 03:00

[김완병의 목요담론] “자식들한테 우던 닮았다…
- 01:00

[열린마당]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성패를 가…
- 01:00

[열린마당] 겨울철 전기용품, 습관이 안전을 좌…
- 02:00

[김용성의 한라시론] AI 시대, 창의성을 위한 '창…
- 02:00

[강준혁의 건강&생활] 겨울철 독감과 감기 대처…
- 01:00

[열린마당] 유학사상에서 삶의 지혜를 배웁시다















 2026.02.14(토) 19:40
2026.02.14(토)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