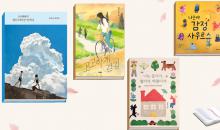[영화觀] 봄밤
안고 앓고 알게 되고
- 입력 : 2025. 07.28(월) 03:30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영화 '봄밤'
[한라일보] 취한다는 것은 때로는 나를 잃어서라도 나를 잊지 않겠다는 몸부림이다. 심란한 마음에 들이 붓는 독주는 반드시 몸을 먼저 통과해야 하는데 다칠 걸 알면서도 먼저 바르는 약, 발라서는 안 될 부위에 쏟아 붓는 약으로 우리는 기어코 몸을 취하게 만든다. 비틀거리는 몸 위에 정신이 어디 똑바로 걸을 수 있을까. 무너지는 마음 위로 어떤 몸이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을까. 취하는 일은 그렇게 몸과 마음을 시험하는 일이다. 이미 시험에 든 자에게는 어떨까. 취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음을 알게 된 이에게 아픈 몸을 가진 이가 다가온다. 취한 영경에게 아픈 수환이 온다. 아픈 수환에게 취한 영경이 간다. 마르지 않는 독주의 샘과 저물지 않는 밤의 우물이 출렁인다. 둘 사이 거리가 좁혀질 듯 멀어진다. 부둥켜 안았는데도 틈이 벌어져 있고 앓고 있는데도 충만한 회복을 느끼는 사이가 만들어진다. 서로를 안고 앓고 알게 되는 이 일이 누군가의 생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 않을 도리가 있을까.
강미자 감독의 영호 <봄밤>은 70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러닝타임의 장편 영화다. 배우 한예리가 영경을, 김설진이 수환을 연기하고 영화는 둘의 서툰 몸짓과 격한 울음과 복잡한 침묵을 온전히 보여주기 위해 다른 요소들을 최소화 하는 방식을 택한다. 벼랑 끝에서 만난 영경과 수환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 길을 찾는 것보다 죽을 길이 있다는데 동의하며 그 동의는 둘을 안전한 곳에 함께 하게 한다. 안전하다는 것은 보호 받는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 둘은 서로일 때 그렇게 느낀다. 둘이 함께할 때 안전함을 느끼기에 둘은 그렇게 서로를 선택한다. 영경과 수환의 관계는 서로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지만 더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독려하고 재촉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억지스러운 일이며 서로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부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영경은 아픈 수환을, 수환은 취한 영경을 교정하려 들지 않는 채로 서로를 기다린다. 누가 뭐라고 해도 둘은 장한 커플이다. 취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에 영경은 번번히 수환과 한 곳에 머무르는 데에 실패하지만 수환은 실망하지 않고 영경이 다시 오기를 기다린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 요양 병원 휠체어에 발이 묶인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기다리는 일이다, 오로지 영경의 귀환을. 그렇게 두 사람 사이 떠나고 기다리고 돌아오는 일이 영화 내내 반복된다.
<봄밤>은 내내 읊조리는 영화다. 영경의 주사는 김수영의 시 '봄밤'을 외는 일이다.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와중에도 영경은 시의 구절 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토해낸다.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강물 위에 떨어진 불빛처럼/혁혁한 업적을 바라지 말라'. 이는 영경이 세상에 하는 말이자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고 자신과 수환의 삶을 껴안는 말이기도 하다. 낙관이 어려운 투병의 시기에 놓인 두 사람이 서로를 치병하는 방식이 그렇다. 알콜 중독자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인 두 사람이 처한 고난의 매일은 고통으로 부대끼지만 서로가 생긴 이후 이 고통의 감각 위에도 다른 겹이 덧입혀진다. 당신이 있기에 향할 수 있음을, 우리가 되었기에 기댈 수 있음을 알게 된 두 사람의 모양은 분명 이전과는 다르다. 이 두터운 양감을 영화는 해체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바라본다. 암막이 드리우듯 생기는 시간의 틈 또한 그대로 둔다. 인물의 변화나 성장이 극의 필수 조건이라면 <봄밤>은 기꺼이 그 조건에 다른 답을 내어 놓는 영화다. 감히 평균으로 만들 수 없는 사랑의 모양을 통째로 보여 주는 방식으로, 다듬거나 요약하지 않는 애초의 시선으로 말이다.
 <봄밤>은 여러모로 시를 닮은 영화이기에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영화를 암송하게 될 것이다. 눈으로 본 영화를, 귀로 들은 대사를 내 안에서 뭉친 뒤 뱉어 내려면 이 영화의 러닝 타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나는 채 벌어지지 않는 한 밤의 목련 봉우리를 앞에 두고 설피 울던 영경의 소리들로, 숨 죽인 바람이 흔들어 대던 목련의 웅성임으로 <봄밤>의 첫 행을 시작해 본다. 술에 취에 비틀거리며 수환에게 향하던 영경의 몸짓으로 이 시의 첫 연을 마무리한다. 두 번째 연의 시작에는 영경의 술잔을 채우던 수환의 눈빛을 새겨 넣는다. 그렇게 단단히 뭉쳤던 이 영화의 덩어리를, 응어리를 나로 다시 풀어낸다. 어떤 영화는 본 이를 앓게 만드는데 <봄밤>이 그렇다.
<봄밤>은 여러모로 시를 닮은 영화이기에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영화를 암송하게 될 것이다. 눈으로 본 영화를, 귀로 들은 대사를 내 안에서 뭉친 뒤 뱉어 내려면 이 영화의 러닝 타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나는 채 벌어지지 않는 한 밤의 목련 봉우리를 앞에 두고 설피 울던 영경의 소리들로, 숨 죽인 바람이 흔들어 대던 목련의 웅성임으로 <봄밤>의 첫 행을 시작해 본다. 술에 취에 비틀거리며 수환에게 향하던 영경의 몸짓으로 이 시의 첫 연을 마무리한다. 두 번째 연의 시작에는 영경의 술잔을 채우던 수환의 눈빛을 새겨 넣는다. 그렇게 단단히 뭉쳤던 이 영화의 덩어리를, 응어리를 나로 다시 풀어낸다. 어떤 영화는 본 이를 앓게 만드는데 <봄밤>이 그렇다.
<진명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강미자 감독의 영호 <봄밤>은 70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러닝타임의 장편 영화다. 배우 한예리가 영경을, 김설진이 수환을 연기하고 영화는 둘의 서툰 몸짓과 격한 울음과 복잡한 침묵을 온전히 보여주기 위해 다른 요소들을 최소화 하는 방식을 택한다. 벼랑 끝에서 만난 영경과 수환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 길을 찾는 것보다 죽을 길이 있다는데 동의하며 그 동의는 둘을 안전한 곳에 함께 하게 한다. 안전하다는 것은 보호 받는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 둘은 서로일 때 그렇게 느낀다. 둘이 함께할 때 안전함을 느끼기에 둘은 그렇게 서로를 선택한다. 영경과 수환의 관계는 서로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지만 더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독려하고 재촉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억지스러운 일이며 서로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부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영경은 아픈 수환을, 수환은 취한 영경을 교정하려 들지 않는 채로 서로를 기다린다. 누가 뭐라고 해도 둘은 장한 커플이다. 취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에 영경은 번번히 수환과 한 곳에 머무르는 데에 실패하지만 수환은 실망하지 않고 영경이 다시 오기를 기다린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 요양 병원 휠체어에 발이 묶인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기다리는 일이다, 오로지 영경의 귀환을. 그렇게 두 사람 사이 떠나고 기다리고 돌아오는 일이 영화 내내 반복된다.
<봄밤>은 내내 읊조리는 영화다. 영경의 주사는 김수영의 시 '봄밤'을 외는 일이다.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와중에도 영경은 시의 구절 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토해낸다.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강물 위에 떨어진 불빛처럼/혁혁한 업적을 바라지 말라'. 이는 영경이 세상에 하는 말이자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고 자신과 수환의 삶을 껴안는 말이기도 하다. 낙관이 어려운 투병의 시기에 놓인 두 사람이 서로를 치병하는 방식이 그렇다. 알콜 중독자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인 두 사람이 처한 고난의 매일은 고통으로 부대끼지만 서로가 생긴 이후 이 고통의 감각 위에도 다른 겹이 덧입혀진다. 당신이 있기에 향할 수 있음을, 우리가 되었기에 기댈 수 있음을 알게 된 두 사람의 모양은 분명 이전과는 다르다. 이 두터운 양감을 영화는 해체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바라본다. 암막이 드리우듯 생기는 시간의 틈 또한 그대로 둔다. 인물의 변화나 성장이 극의 필수 조건이라면 <봄밤>은 기꺼이 그 조건에 다른 답을 내어 놓는 영화다. 감히 평균으로 만들 수 없는 사랑의 모양을 통째로 보여 주는 방식으로, 다듬거나 요약하지 않는 애초의 시선으로 말이다.

<진명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합격자 대부분이 '지인'… 돌문화공원 불공정 채용 논란
- 2

"서광로 주민이 테스트베드냐" 섣부른 BRT 추진 질타
- 3

제주시청 공무원 음주사고 후 측정 거부해 검찰 송치
- 4

제주발 'GM볼' 역베팅 투자사기 피해·범죄 규모 '눈덩이'
- 5

제주자치도 공무원 또 증원.. 이번엔 근로감독 22명
- 6

[종합] 제주 삼양동·봉개동 도의원 선거구 현행 유지 가닥
- 7

제주 올해 지방공무원 572명 선발.. 2006년 이후 최대
- 8

[현장] “직원 총출동”… 설 맞아 물량 쏟아진 우편집중국
- 9

"만다린 무관세 수입 위기?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 10

제주 공략 나선 국힘… 중앙당 제2공항 특위 위원장 선임















 2026.02.15(일) 09:12
2026.02.15(일)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