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35] 3부 오름-(94)따라비오름, 위가 평평한 오름
따라비와 사스미, 평평하고 솟아오른 대비지명
- 입력 : 2025. 07.15(화) 03:30
-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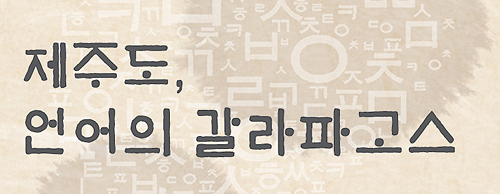
비판할 땐 자기주장과 근거 제시를
[한라일보]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62번지다. 표고 342m, 자체높이 107m다. 원형 분화구의 큰 원 안에 3개의 소형 화구를 갖는 특이한 형태다. 그다지 높지도 않고, 정상부가 평탄한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탐방에 부담이 적은 오름이다. 그 형태와 주변 풍광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오름으로 인기가 높다.
'따라비'라는 지명에 대해 설명이 분분하다. 제주도가 발행한 '제주의 오름'이라는 책에는 여기저기 소개된 지명 풀이들을 모아 놓았다.
 첫째는 이 오름 동쪽에 모지오름이 이웃해 있어 마치 지아비 지어미가 서로 따르는 모양이라서 따라비라 한다는 풀이가 있다. 둘째는 이 오름 가까이에 모지오름, 장자오름, 새끼오름이 모여 있어 가장 격이라 하여 '따애비'라 불리던 것이 '따래비'로 와전된 것. 셋째는 이 오름과 동쪽의 모지오름과는 시아버지와 며느리형국이라 하여 '땅 하래비'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넷째는 고구려어에 어원을 둔 '다라비'가 원이름으로 '다라'라는 말은 고구려어 달을(達乙), '달(達)'에서 온 것으로 '높다'는 뜻이고, '비'는 제주 산명에 쓰이는 '미'에 통하는 접미사로 '다라비=다라미' 즉, '높은 산'이라는 뜻이 된다고 한다. 이 '다라비'가 '따라비'로 경음화한 것이 지금의 지명이라는 내용도 소개했다.
첫째는 이 오름 동쪽에 모지오름이 이웃해 있어 마치 지아비 지어미가 서로 따르는 모양이라서 따라비라 한다는 풀이가 있다. 둘째는 이 오름 가까이에 모지오름, 장자오름, 새끼오름이 모여 있어 가장 격이라 하여 '따애비'라 불리던 것이 '따래비'로 와전된 것. 셋째는 이 오름과 동쪽의 모지오름과는 시아버지와 며느리형국이라 하여 '땅 하래비'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넷째는 고구려어에 어원을 둔 '다라비'가 원이름으로 '다라'라는 말은 고구려어 달을(達乙), '달(達)'에서 온 것으로 '높다'는 뜻이고, '비'는 제주 산명에 쓰이는 '미'에 통하는 접미사로 '다라비=다라미' 즉, '높은 산'이라는 뜻이 된다고 한다. 이 '다라비'가 '따라비'로 경음화한 것이 지금의 지명이라는 내용도 소개했다.
세 번째까지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어형의 유사성에 이끌린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넷째 고구려어 기원설은 지나친 천착이라는 한마디로 무시한 이도 있지만, 어원을 해독하는 방식에 따랐으며, 원래의 뜻에도 근접한 설명이다. 비판할 때는 자기의 주장을 분명히 밝히고 근거도 제시했으면 좋겠다.
 '따라비'는 고대어 '달'에서 기원
'따라비'는 고대어 '달'에서 기원
이 오름 지명은 1703년 탐라순력도의 교래대첩 등에 다라비악(多羅非岳), 1703년 탐라순력도 한라장촉과 1770년경 제작된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다라비(多羅非), 1899년 제주군읍지에 지조악(地祖岳)으로 표기했다. 오늘날은 따라비오름으로 부른다. 고전에서도 이같이 다라비악(多羅非岳), 다라비(多羅非), 지조악(地祖岳)으로 표기했다.
다라비악(多羅非岳)은 다라비(多羅非)에 오름을 나타내는 '악(岳)'이 덧붙은 것이다. '다라비(多羅非)'라는 한자표기는 '다라비'라는 발음을 그대로 차용한 음가지 차용 방식으로 쓴 것이다. 여기에 사용한 한자는 그저 발음만을 표기하려고 한 것이지 그 뜻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따라비'라는 발음은 이미 1700년도 초반에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지조악(地祖岳)의 '지(地)'는 '따 지'자이므로 훈가자 방식으로 차자한 것이다. '따라비'의 '따'를 표현하려고 동원했다. '조(祖)'는 '할아비 조'자다. 역시 음가자 차용 방식으로 동원한 것이다. 그 뜻과는 관련이 없다. 즉, '따+할아비'의 구조가 돼 이 오름의 이름이 '따라비'임을 표현하였다. 어떻게 표기했든 이 오름의 지명은 '다라비' 혹은 '따라비'라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말에 어두음은 경음화 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가시를 까시, 댕기다를 땡기다, 세다를 쎄다, 저기를 쩌기, 적다를 쩍따 등으로 발음한다. 짜장면도 원래는 자장면이었다. 이런 현상을 감안한다면 '따라비'란 원래 '다라비'였음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다라비'란 '다라+비'의 구조다. '다라'는 '달'의 개음절 발음이다. 고대어 '달'은 나중에 '달'로도 분화했고, '닥라'로도 발음했다. 또한 이 오름 지명에 남아있는 것처럼 '다라'로도 분화한 것이다. 이 부분은 앞 회의 월라산(닥라미)의 설명을 참조하실 수 있다.
'달'이란 평평한 지형을 말한다. 북방어 특히 몽골어계 기원이다. 몽골문어에서 '달리' 혹은 '달', 칼카어에서 '달', 칼미크어에서 '달러'다. '따라비'의 '따라'는 '다라'의 경음화로 생겨난 발음이다. 원래는 '달>닥라>다라'의 변화를 겪었다. 이 오름은 위가 평평하다.
사스미는 봉우리오름
그럼 '비'는 무엇일까? 이 말은 산 특히 작은 산을 지시한다. '비르' 혹은 '뵤로'로 발음한다. 퉁구스어 기원이다. '다라비'는 '다라비르' 혹은 '다라빌'로 발음했을 것이다. 여기서 'ㄹ'이 탈락한 형태가 '다라비'이고, 이 말이 어두 경음화 현상으로 '따리비'가 된 것이다. 위가 평평한 작은 산이란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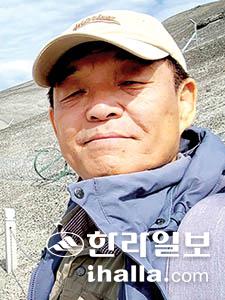 '따라비'가 위가 평평한 산이란 해독은 바로 가까이 마주하고 있는 대록산의 지명을 보면 더욱 선명해진다. 이 오름은 높은 봉우리를 큰사스미 혹은 대록산, 낮은 봉우리를 족은사스미 혹은 소록산이라고도 한다. 이 '사슴이'라는 말은 실제 발음은 '사스미' 혹은 '사사미'로 들린다. 한글로 표기하면서 언어 습관상 '사슴이'라 적게 된 것이다. 이렇게 '사슴이'라고 적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슴을 떠올리게 마련이다. 본 기획 59회에 자세히 다뤘다.
'따라비'가 위가 평평한 산이란 해독은 바로 가까이 마주하고 있는 대록산의 지명을 보면 더욱 선명해진다. 이 오름은 높은 봉우리를 큰사스미 혹은 대록산, 낮은 봉우리를 족은사스미 혹은 소록산이라고도 한다. 이 '사슴이'라는 말은 실제 발음은 '사스미' 혹은 '사사미'로 들린다. 한글로 표기하면서 언어 습관상 '사슴이'라 적게 된 것이다. 이렇게 '사슴이'라고 적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슴을 떠올리게 마련이다. 본 기획 59회에 자세히 다뤘다.
이 오름 지명에 나오는 '사스' 혹은 '사사'는 '삿'에서 기원한다. '(높은) 봉우리'를 지시한다. 오늘날 '솟다'의 명사다. 고구려어 기원이다. 이 봉우리를 지시하는 '삿'이라는 고구려어는 제주어에서는 산맥을 형성하는 봉우리를 의미한다. 이런 연유로 '사사'에 '마르'의 축약형 '미'가 덧붙어 '사사미'가 된 것이다. 이에 비하여 '따라비'는 위가 평평한 산을 지시하고 있다. 안덕면 감산리의 다래오름도 위가 평평하여 '달'이라는 지명을 갖는 오름의 하나다. 이 오름은 본 기획을 통하여 물이 흐르는 오름이라고 해독한 바 있으나 여기서 수정한다. 이 외에도 애월읍 봉성리의 다래오름, 아라동 월평의 들레오름, 표선면 토산리의 달마르 등도 '달'에서 기원한 지명들이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한라일보]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62번지다. 표고 342m, 자체높이 107m다. 원형 분화구의 큰 원 안에 3개의 소형 화구를 갖는 특이한 형태다. 그다지 높지도 않고, 정상부가 평탄한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탐방에 부담이 적은 오름이다. 그 형태와 주변 풍광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오름으로 인기가 높다.
'따라비'라는 지명에 대해 설명이 분분하다. 제주도가 발행한 '제주의 오름'이라는 책에는 여기저기 소개된 지명 풀이들을 모아 놓았다.

따라비오름 정상부, 건너편에 보이는 오름은 큰사슴이오름(대록산)이다. 김찬수
세 번째까지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어형의 유사성에 이끌린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넷째 고구려어 기원설은 지나친 천착이라는 한마디로 무시한 이도 있지만, 어원을 해독하는 방식에 따랐으며, 원래의 뜻에도 근접한 설명이다. 비판할 때는 자기의 주장을 분명히 밝히고 근거도 제시했으면 좋겠다.

번널오름에서 찍은 큰사슴이오름(왼쪽 풍력발전단지 건너편)과 따라비오름(오른쪽).
이 오름 지명은 1703년 탐라순력도의 교래대첩 등에 다라비악(多羅非岳), 1703년 탐라순력도 한라장촉과 1770년경 제작된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다라비(多羅非), 1899년 제주군읍지에 지조악(地祖岳)으로 표기했다. 오늘날은 따라비오름으로 부른다. 고전에서도 이같이 다라비악(多羅非岳), 다라비(多羅非), 지조악(地祖岳)으로 표기했다.
다라비악(多羅非岳)은 다라비(多羅非)에 오름을 나타내는 '악(岳)'이 덧붙은 것이다. '다라비(多羅非)'라는 한자표기는 '다라비'라는 발음을 그대로 차용한 음가지 차용 방식으로 쓴 것이다. 여기에 사용한 한자는 그저 발음만을 표기하려고 한 것이지 그 뜻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따라비'라는 발음은 이미 1700년도 초반에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지조악(地祖岳)의 '지(地)'는 '따 지'자이므로 훈가자 방식으로 차자한 것이다. '따라비'의 '따'를 표현하려고 동원했다. '조(祖)'는 '할아비 조'자다. 역시 음가자 차용 방식으로 동원한 것이다. 그 뜻과는 관련이 없다. 즉, '따+할아비'의 구조가 돼 이 오름의 이름이 '따라비'임을 표현하였다. 어떻게 표기했든 이 오름의 지명은 '다라비' 혹은 '따라비'라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말에 어두음은 경음화 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가시를 까시, 댕기다를 땡기다, 세다를 쎄다, 저기를 쩌기, 적다를 쩍따 등으로 발음한다. 짜장면도 원래는 자장면이었다. 이런 현상을 감안한다면 '따라비'란 원래 '다라비'였음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다라비'란 '다라+비'의 구조다. '다라'는 '달'의 개음절 발음이다. 고대어 '달'은 나중에 '달'로도 분화했고, '닥라'로도 발음했다. 또한 이 오름 지명에 남아있는 것처럼 '다라'로도 분화한 것이다. 이 부분은 앞 회의 월라산(닥라미)의 설명을 참조하실 수 있다.
'달'이란 평평한 지형을 말한다. 북방어 특히 몽골어계 기원이다. 몽골문어에서 '달리' 혹은 '달', 칼카어에서 '달', 칼미크어에서 '달러'다. '따라비'의 '따라'는 '다라'의 경음화로 생겨난 발음이다. 원래는 '달>닥라>다라'의 변화를 겪었다. 이 오름은 위가 평평하다.
사스미는 봉우리오름
그럼 '비'는 무엇일까? 이 말은 산 특히 작은 산을 지시한다. '비르' 혹은 '뵤로'로 발음한다. 퉁구스어 기원이다. '다라비'는 '다라비르' 혹은 '다라빌'로 발음했을 것이다. 여기서 'ㄹ'이 탈락한 형태가 '다라비'이고, 이 말이 어두 경음화 현상으로 '따리비'가 된 것이다. 위가 평평한 작은 산이란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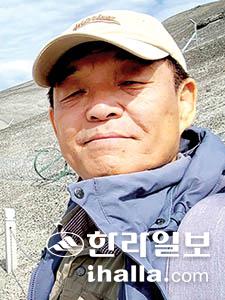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이 오름 지명에 나오는 '사스' 혹은 '사사'는 '삿'에서 기원한다. '(높은) 봉우리'를 지시한다. 오늘날 '솟다'의 명사다. 고구려어 기원이다. 이 봉우리를 지시하는 '삿'이라는 고구려어는 제주어에서는 산맥을 형성하는 봉우리를 의미한다. 이런 연유로 '사사'에 '마르'의 축약형 '미'가 덧붙어 '사사미'가 된 것이다. 이에 비하여 '따라비'는 위가 평평한 산을 지시하고 있다. 안덕면 감산리의 다래오름도 위가 평평하여 '달'이라는 지명을 갖는 오름의 하나다. 이 오름은 본 기획을 통하여 물이 흐르는 오름이라고 해독한 바 있으나 여기서 수정한다. 이 외에도 애월읍 봉성리의 다래오름, 아라동 월평의 들레오름, 표선면 토산리의 달마르 등도 '달'에서 기원한 지명들이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6] 3부 오름-(115) 돌…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5] 3부 오름-(114)성…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4] 3부 오름-(113) 이…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3] 3부 오름-(112) 새…
- 02: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2] 3부 오름-(111)비…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1] 3부 오름-(110)볼…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0] 3부 오름-(109)베…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49] 3부 오름-(108)수…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48] 3부 오름-(107)머…
- 03:3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47] 3부 오름-(106)ᄉ…















 2025.12.26(금) 14:00
2025.12.26(금) 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