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33] 3부 오름-(92)신산오름, 위가 평평한 오름
등성마루가 평평한 마르 혹은 오름 ‘달’
- 입력 : 2025. 07.01(화) 03:00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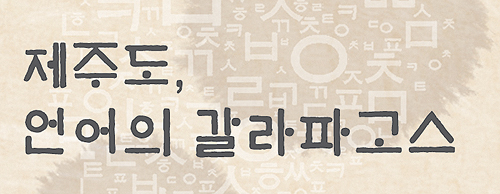
어느 날 갑자기 감산이 신산으로
[한라일보]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표고 175m, 자체높이 30m의 오름이다. 제주도가 발행한 '제주의 오름'이라는 책에는 신산오름이란 한자명 신산(神山) 글자 그대로의 뜻이라고 설명한다.
원래는 '감산'이라고 했는데, 신(神)을 뜻하는 북방어에서 온 것으로 결국 감산의 한자명 신산(神山)은 신령스러운 산을 뜻하는 한자표기라고 했다. 물론 이 책은 오름의 지명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서가 아니므로 어디선가 인용한 내용일 것이다. 이 글은 1990년 나온 김종철의 '오름 나그네'를 2020년 재출간한 '오름나그네2(다비치)'의 157쪽에 똑같이 나온다. 그러니 이 '제주의 오름'은 인용 표시 없이 이 책을 베낀 것이다.
 이 지명은 세종실록에 '감산(甘山)'으로 기록한 것이 처음일 것이다. 이후 1653년에 나온 증보 탐라지 등에 감산(紺山), 1872년에 나온 제주읍지에 감산(柑山), 같은 해에 나온 대정군읍지에는 감산악(紺山岳)으로 표기했다. 그러던 것이 1968년 원대정군지에는 감산(紺山), 신산(神山)으로 표기했다.
이 지명은 세종실록에 '감산(甘山)'으로 기록한 것이 처음일 것이다. 이후 1653년에 나온 증보 탐라지 등에 감산(紺山), 1872년에 나온 제주읍지에 감산(柑山), 같은 해에 나온 대정군읍지에는 감산악(紺山岳)으로 표기했다. 그러던 것이 1968년 원대정군지에는 감산(紺山), 신산(神山)으로 표기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감산(甘山)'을 시작으로 감산(紺山), 감산((柑山), 신산(神山)이 검색되는 것이다.
문제는 위의 제주의 오름이라는 책에 나오는 바와 같이 오늘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신산(神山)이란 지명은 1968년에야 세상에 나온 이름이다. 물론 주변 비문에 신산악(神山岳). 신산봉(神山峰). 신산(神山), 신산오름이라고도 표기한 것으로 채록된 바 있다. 이 비문들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바 없다. 비문의 기록이란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다. 요즈음도 마을에서 지명을 풀이할 때 자못 그럴싸하게 해독(?)하여 내놓기도 하고, 풍수지리상 명당이라느니 하는 식으로 포장하는 걸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마을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그게 어원상 맞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신산’은 신과 무관
이 신산오름만 하더라도 세종실록에는 '감산(甘山)'이라고 했다. 이 기록이 나온 해는 세종 12년이니 1412년을 말한다. 지금부터 613년 전 기록이다. 이후 1653년 감산(紺山), 1872년 감산(紺山)을 거쳐 갑자기 1968년 원대정군지라는 책에 감산(紺山)이라는 지명과 함께 신산(神山)이 비로소 등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감산이란 지명은 수백 년 이래로 계속 써온 지명이다. 그런 것이 57년 전 신산(神山)이란 지명이 돌연 등장했다. 이렇게 최근에 난데없이 등장한 신산(神山)에 대해서 아무런 검증 없이 문자 그대로의 뜻이라면서 신령스러운 산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과연 이 오름의 어떤 점이 신령스럽다는 것인가?
 어느 연구서에는 감산(甘山), 감산(紺山), 감산((柑山)의 '감(甘, 紺, 柑)'은 '감'의 음가자 표기라 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설명이 없으니 알 길이 없다. 다만 신산(神山)의 '신(神)'에서 온 지명이라고 주장하려니 '신(神)'을 의미하는 '감'을 소환한 것 같다. '감'이란 말에는 사실 '신'이란 뜻이 있다. 퉁구스어로는 '쿰-'이 주로 신을, 돌궐어에서 '캄'이 '샤먼(巫)'을 지시한다. 일본어에선 '카미(かみ)'가 신을 나타낸다. 문제는 왜 이 오름을 신령과 연관시켰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지금도 이곳 마을을 '감산리'라고 하지 '신산리'라고 하지는 않는다. 세종실록 이래로 감산(甘山), 감산(紺山), 감산((柑山)으로 바뀌면서도 감산리라는 마을 지명으로 이어져 왔다.
어느 연구서에는 감산(甘山), 감산(紺山), 감산((柑山)의 '감(甘, 紺, 柑)'은 '감'의 음가자 표기라 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설명이 없으니 알 길이 없다. 다만 신산(神山)의 '신(神)'에서 온 지명이라고 주장하려니 '신(神)'을 의미하는 '감'을 소환한 것 같다. '감'이란 말에는 사실 '신'이란 뜻이 있다. 퉁구스어로는 '쿰-'이 주로 신을, 돌궐어에서 '캄'이 '샤먼(巫)'을 지시한다. 일본어에선 '카미(かみ)'가 신을 나타낸다. 문제는 왜 이 오름을 신령과 연관시켰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지금도 이곳 마을을 '감산리'라고 하지 '신산리'라고 하지는 않는다. 세종실록 이래로 감산(甘山), 감산(紺山), 감산((柑山)으로 바뀌면서도 감산리라는 마을 지명으로 이어져 왔다.
세종실록 집필자들은 왜 '감산(甘山)'이라고 표기했을까를 짚어보자.
우선 여기에 나오는 '산(山)'이란 '마르'의 줄임말 '뫼'를 차자한 글자다. 그럼 '감(甘)'은 무엇인가. 이 글자는 '달 감'자다. 이 '달'은 '(맛이) 달다'의 '달'이다. 1459년 월인석보에는 '달'로 썼고, 현대 제주어에서도 '달다'라 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600여 년 전엔 이 오름을 '달마르'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제주어를 한자로 표기하려니 '달 감'자와 '뫼 산'자를 동원한 것이다. 훈가자 차자방식이다. 그러나 이후 '달 감'의 '감(甘)'이 지명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감산(紺山), 감산((柑山) 등으로 변형된 글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신산오름의 제주 고대어는 ‘달마르’
그런데 이 '달'이란 제주도 고대어에선 아주 뜻밖의 의미로도 썼다. 등성마루가 평평한 마르 혹은 오름을 지칭했다. 여기서 평평하다는 것은 비스듬하면서 평평한 게 아니라 수평에 가까운 평평을 의미했다. 몽골어 기원이다. 같은 언어권의 몽골문어에서 '달리' 혹은 '달', 칼카어에서 '달', 칼미크어에서 '달러'다.
신산오름은 위가 평평하다. 제주 고대인들은 '달마르'라고 부른 것인데, 세종실록 집필자들은 훈가자 차자 방식을 동원하여 감산(甘山)으로 기록했고, 이 '감(甘)'이 지명으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하여 점차 감산(紺山), 감산((柑山) 등으로 변형해 썼다. 그러다가 현대에 들어 '감'이 '신(神)'을 지시하기도 한다는데 착안하여 '신산(神山)'으로도 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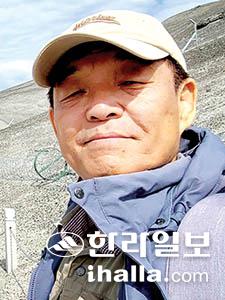 같은 안덕면에 감낭오름이 있다. 이 오름의 지명은 감남봉(監南峰), 감남악(甘南岳), 감목봉(柑木峰) 등으로 나타난다. 이 이름들도 모두 '달'에서 기원하고 분화한 이름이다. 본 기획에서 '달'은 물을 지시한다고 해독했으나 위가 평평한 지형 특성으로 볼 때 신산오름처럼 위가 평평한 오름이란 뜻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 '낭'은 '남(南)'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물을 의미하는 '노르'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감낭오름은 위가 평평하고 물이 있는 오름이라는 뜻으로 수정한다. 신산오름은 신성한 산이 아니라 위가 평평하다는 뜻의 지명이다.
같은 안덕면에 감낭오름이 있다. 이 오름의 지명은 감남봉(監南峰), 감남악(甘南岳), 감목봉(柑木峰) 등으로 나타난다. 이 이름들도 모두 '달'에서 기원하고 분화한 이름이다. 본 기획에서 '달'은 물을 지시한다고 해독했으나 위가 평평한 지형 특성으로 볼 때 신산오름처럼 위가 평평한 오름이란 뜻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 '낭'은 '남(南)'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물을 의미하는 '노르'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감낭오름은 위가 평평하고 물이 있는 오름이라는 뜻으로 수정한다. 신산오름은 신성한 산이 아니라 위가 평평하다는 뜻의 지명이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한라일보]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표고 175m, 자체높이 30m의 오름이다. 제주도가 발행한 '제주의 오름'이라는 책에는 신산오름이란 한자명 신산(神山) 글자 그대로의 뜻이라고 설명한다.
원래는 '감산'이라고 했는데, 신(神)을 뜻하는 북방어에서 온 것으로 결국 감산의 한자명 신산(神山)은 신령스러운 산을 뜻하는 한자표기라고 했다. 물론 이 책은 오름의 지명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서가 아니므로 어디선가 인용한 내용일 것이다. 이 글은 1990년 나온 김종철의 '오름 나그네'를 2020년 재출간한 '오름나그네2(다비치)'의 157쪽에 똑같이 나온다. 그러니 이 '제주의 오름'은 인용 표시 없이 이 책을 베낀 것이다.

신산오름, 안덕면 창천리의 신산오름, 이 오름의 남서쪽으로 감산리가 있다. 김찬수
여기까지만 본다면 '감산(甘山)'을 시작으로 감산(紺山), 감산((柑山), 신산(神山)이 검색되는 것이다.
문제는 위의 제주의 오름이라는 책에 나오는 바와 같이 오늘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신산(神山)이란 지명은 1968년에야 세상에 나온 이름이다. 물론 주변 비문에 신산악(神山岳). 신산봉(神山峰). 신산(神山), 신산오름이라고도 표기한 것으로 채록된 바 있다. 이 비문들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바 없다. 비문의 기록이란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다. 요즈음도 마을에서 지명을 풀이할 때 자못 그럴싸하게 해독(?)하여 내놓기도 하고, 풍수지리상 명당이라느니 하는 식으로 포장하는 걸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마을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그게 어원상 맞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신산’은 신과 무관
이 신산오름만 하더라도 세종실록에는 '감산(甘山)'이라고 했다. 이 기록이 나온 해는 세종 12년이니 1412년을 말한다. 지금부터 613년 전 기록이다. 이후 1653년 감산(紺山), 1872년 감산(紺山)을 거쳐 갑자기 1968년 원대정군지라는 책에 감산(紺山)이라는 지명과 함께 신산(神山)이 비로소 등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감산이란 지명은 수백 년 이래로 계속 써온 지명이다. 그런 것이 57년 전 신산(神山)이란 지명이 돌연 등장했다. 이렇게 최근에 난데없이 등장한 신산(神山)에 대해서 아무런 검증 없이 문자 그대로의 뜻이라면서 신령스러운 산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과연 이 오름의 어떤 점이 신령스럽다는 것인가?

감낭오름, 안덕면 동광리에 있다. 신산오름과 감낭오름은 위가 평평하다.
세종실록 집필자들은 왜 '감산(甘山)'이라고 표기했을까를 짚어보자.
우선 여기에 나오는 '산(山)'이란 '마르'의 줄임말 '뫼'를 차자한 글자다. 그럼 '감(甘)'은 무엇인가. 이 글자는 '달 감'자다. 이 '달'은 '(맛이) 달다'의 '달'이다. 1459년 월인석보에는 '달'로 썼고, 현대 제주어에서도 '달다'라 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600여 년 전엔 이 오름을 '달마르'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제주어를 한자로 표기하려니 '달 감'자와 '뫼 산'자를 동원한 것이다. 훈가자 차자방식이다. 그러나 이후 '달 감'의 '감(甘)'이 지명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감산(紺山), 감산((柑山) 등으로 변형된 글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신산오름의 제주 고대어는 ‘달마르’
그런데 이 '달'이란 제주도 고대어에선 아주 뜻밖의 의미로도 썼다. 등성마루가 평평한 마르 혹은 오름을 지칭했다. 여기서 평평하다는 것은 비스듬하면서 평평한 게 아니라 수평에 가까운 평평을 의미했다. 몽골어 기원이다. 같은 언어권의 몽골문어에서 '달리' 혹은 '달', 칼카어에서 '달', 칼미크어에서 '달러'다.
신산오름은 위가 평평하다. 제주 고대인들은 '달마르'라고 부른 것인데, 세종실록 집필자들은 훈가자 차자 방식을 동원하여 감산(甘山)으로 기록했고, 이 '감(甘)'이 지명으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하여 점차 감산(紺山), 감산((柑山) 등으로 변형해 썼다. 그러다가 현대에 들어 '감'이 '신(神)'을 지시하기도 한다는데 착안하여 '신산(神山)'으로도 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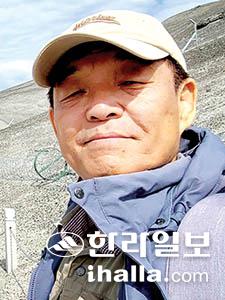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서귀포 앞바다에 신종 쏙류… 수천 개체 서식 추정
- 2

제주에 스페인 화가 '헤수스 수스 미술관' 개관
- 3

[영상] "제주 고향사랑기금, 국민 사랑으로 70억 원 돌파"
- 4

ICC제주 서울출장사무소 20년만에 잠정 폐지
- 5

"양궁의 매력에 훔뻑" 현대백화점 선수단 올해도 재능기부
- 6

제주 15분 도시 조성 속도… 예산 확대 투자
- 7

고수온에 난류성 해파리 출몰… 제주 바다 10대 뉴스
- 8

[영상] 유튜버 김뭉먕, 제주도 홍보대사 위촉
- 9

[종합] "순직 처리 협조" 발언… 교육단체 "이행" 교육청 "최…
- 10

제주 등 4개 특별자치시도 "포괄적 권한 이양해야"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6] 3부 오름-(115) 돌…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5] 3부 오름-(114)성…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4] 3부 오름-(113) 이…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3] 3부 오름-(112) 새…
- 02: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2] 3부 오름-(111)비…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1] 3부 오름-(110)볼…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0] 3부 오름-(109)베…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49] 3부 오름-(108)수…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48] 3부 오름-(107)머…
- 03:3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47] 3부 오름-(106)ᄉ…















 2025.12.27(토) 08:13
2025.12.27(토) 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