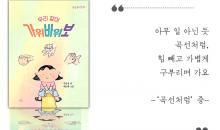[김관후 작가의 詩(시)로 읽는 4·3] (71)풀-김수영
- 입력 : 2020. 08.13(목) 00:00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고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
시에 꼭 정해진 해석이란 없다. 시는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다. 민중은 풀과 같은 것이다. '풀'은 여리고 상처받기 쉽지만 질긴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바람'은 무수히 많은 생명들을 괴롭히고 억누르는 힘으로 상정해 보자. 바람이 불면 풀이 흔들리고 또 땅까지 휘어진다. 풀의 움직임이 반복된다. 풀이 먼저 흔들리고 이어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을 때도 있다. 일어설 경우 역시 어떤 때는 풀이 먼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바람이 먼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제주민중도 풀과 같다. 풀처럼 일어선다. 상처 난 자기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자기를 역사의 정방 향으로 세운다. 주체자의 몫을 다하기 위하여 4·3에 물든 피를 씻어내며 희생당한 이웃들의 무덤을 다듬으며 맺힌 원한을 풀고 있다. 양민을 학살한 모든 세력들을 낱낱이 찾아내어 아직은 상하좌우에 진쳐있는 예리한 칼벽을 넘고 있다. '풀'을 '민중'으로 바람을 '억압자'로 볼 수도 있다. 제주민중은 70여년의 어둠과 짓밟힘을 헤치고 다시 딛고 일어서는 아침의 해를 마중하였다. 4·3은 밟아도 베어도 잘라도 찢어도 쏘아도 오히려 땅속 아래서 엉키고 부둥켜안으며 아침 해와 더불어 슬며시 일어서서 드디어 푸르름을 지니며 꽃을 피우고 열매 맺고 있다. 그래서 '풀'에서 민중의 의미는 한결 풍요로워진다. 민중은 억압 세력에 눌려 늘 고통을 당하고 늘 좌절한다. 순간순간 보면 그런 것 같지만 긴 시간을 두고 전체적으로 보면, 민중이란 그러면서도 늘 삶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억압 세력을 압도하기도 한다.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고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
시에 꼭 정해진 해석이란 없다. 시는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다. 민중은 풀과 같은 것이다. '풀'은 여리고 상처받기 쉽지만 질긴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바람'은 무수히 많은 생명들을 괴롭히고 억누르는 힘으로 상정해 보자. 바람이 불면 풀이 흔들리고 또 땅까지 휘어진다. 풀의 움직임이 반복된다. 풀이 먼저 흔들리고 이어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을 때도 있다. 일어설 경우 역시 어떤 때는 풀이 먼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바람이 먼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제주민중도 풀과 같다. 풀처럼 일어선다. 상처 난 자기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자기를 역사의 정방 향으로 세운다. 주체자의 몫을 다하기 위하여 4·3에 물든 피를 씻어내며 희생당한 이웃들의 무덤을 다듬으며 맺힌 원한을 풀고 있다. 양민을 학살한 모든 세력들을 낱낱이 찾아내어 아직은 상하좌우에 진쳐있는 예리한 칼벽을 넘고 있다. '풀'을 '민중'으로 바람을 '억압자'로 볼 수도 있다. 제주민중은 70여년의 어둠과 짓밟힘을 헤치고 다시 딛고 일어서는 아침의 해를 마중하였다. 4·3은 밟아도 베어도 잘라도 찢어도 쏘아도 오히려 땅속 아래서 엉키고 부둥켜안으며 아침 해와 더불어 슬며시 일어서서 드디어 푸르름을 지니며 꽃을 피우고 열매 맺고 있다. 그래서 '풀'에서 민중의 의미는 한결 풍요로워진다. 민중은 억압 세력에 눌려 늘 고통을 당하고 늘 좌절한다. 순간순간 보면 그런 것 같지만 긴 시간을 두고 전체적으로 보면, 민중이란 그러면서도 늘 삶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억압 세력을 압도하기도 한다.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영상] "제주 고향사랑기금, 국민 사랑으로 70억 원 돌파"
- 2

"양궁의 매력에 훔뻑" 현대백화점 선수단 올해도 재능기부
- 3

제주 15분 도시 조성 속도… 예산 확대 투자
- 4

고수온에 난류성 해파리 출몰… 제주 바다 10대 뉴스
- 5

[영상] 유튜버 김뭉먕, 제주도 홍보대사 위촉
- 6

[종합] "순직 처리 협조" 발언… 교육단체 "이행" 교육청 "최…
- 7

제주 등 4개 특별자치시도 "포괄적 권한 이양해야"
- 8

지난해 제주 1인당 개인소득 2461만원 전국 최저
- 9

강재섭 전 농축산식품국장 제주도의원 선거 출마 공식화
- 10

'침체' 제주 태권도 활성화.. 한라일보 첫 품새대회 개최















 2025.12.27(토) 14:12
2025.12.27(토)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