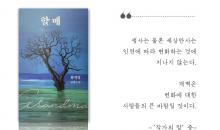[제주바다와 문학] (13)한창훈 소설 '삼도노인회 제주 여행기'
"생선 껍데기가 얼마나 맛있는디…"
- 입력 : 2019. 07.19(금) 00:00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남도의 한 바다에서 어부들이 배를 띄워 작업을 하고 있다.
칠순 삼도 노인들 제주 가다
껍질 안벗긴 재리 구이 설전
걸쭉한 입담 속 수난의 바다
남쪽 바다에 있는 삼도(三島). 가상의 공간을 배경으로 써나간 단편을 읽어가는 동안 슬그머니 웃음이 나왔다. 전남 여수 태생 한창훈 작가(1963~)의 '삼도노인회 제주 여행기'(2007)다.
소설 속 삼도 노인들은 밭이나 바다로 나가 무엇이든 캐고 다듬어 돈 만드는 버릇이 몸에 뱄다. 섬을 버리고 도시에 사는 자식에게 향했던 노인들은 꼭 탈이 났다. '아침에 심심하고, 점심때 무료하고, 저녁때 쓸쓸하고, 밤에는 잠 또한 오지 않아 시름시름 앓는 병'을 얻었다.
어느날 삼도노인회는 자식들이 해마다 부어온 곗돈을 밑천 삼아 3박 4일 관광을 떠난다. 때는 4월, 쑥 뜯는 철도 지나고 삼치낚시도 끝물인 시기였다.
여행지를 두고 열댓명 의견이 남녀로 갈렸다. 바닷일을 해온 남자들은 산을 원했다. 여자들은 삼도에서 훤히 보이는 제주로 가자고 했다. 첫날 밤을 지리산 온천 여관에서 보내고 다음날 제주 여행길에 올랐다.
"오메, 뜨네. 쐿덩어리가 뜬다등만, 진짜 뜨네이. 어이, 배도 쐰듸 물에 뜨잖어, 하늘인들 못 뜨것능가. 근디 왜 이리 흔들린다냐. 멀미 나겄네. 휴게소는 언지 들린단가. 우동 한 그릇 묵었으믄 좋겄는디." 비행기가 여수공항을 이륙하자 여기저기서 말소리가 터졌다. 비행기에서 내려 마주한 제주는 '낯선 대륙'이었다.
제주섬의 환상은 이내 깨졌다. 바다를 끼고 살아온 노인들은 '버버리 전복'인 오분자기탕과 '베말'로 만든 반찬에 시큰둥했다. 저녁 때 찾은 자리돔구이집에선 비늘을 벗기지 않고 굵은 소금 뿌려 구운 '재리'(자리돔)에 목청이 높아졌다. "제주도까지 와서 재리 구어 밥 묵는 것두 거시기한디 비늘도 안 벗긴 것을 워치게 묵으라고." "생선 맛 통 모르는구만. 껍데기가 얼마나 맛있는디. 이렇게 간을 하믄 간도 잘 안 배고 껍데기도 못 먹잖어." 귀하다는 다금바리회로 진정시키려 하지만 삼도에서 그 물고기는 '닥치는 대로 묵어조지는 허천뱅이'였다.
칠순 노인들을 모시는 청년회장 역만이 그들을 이끈 곳은 결국 극장식 나이트클럽이다. 삼도의 노인들은 반라의 무희들이 등장하는 나이트클럽에서 제주의 마지막 밤을 보낸다.
작가 특유의 걸쭉하고 능청스러운 입담 덕에 제주 여행담이 재미나게 표현됐지만 갈피갈피 고단한 바닷가 사람들의 사연이 밀려든다. 병들어 죽은 가두리양식장의 참돔과 우럭을 퍼내는 것만으로 하루 일과가 꽉찬 역만이 그렇다. 삶의 터전이 황폐화되며 생계를 위협받는 그들이지만 바다를 떠날 순 없다. '삼도노인회 제주 여행기' 등 8편이 묶인 '나는 여기가 좋다'(2009)엔 삼도 같은 섬에서 살아가는 또다른 존재들이 보인다. 그들은 다짐한다. 거친 바다를 씩씩하게 뚫고 나아가겠다. 진선희기자
껍질 안벗긴 재리 구이 설전
걸쭉한 입담 속 수난의 바다
남쪽 바다에 있는 삼도(三島). 가상의 공간을 배경으로 써나간 단편을 읽어가는 동안 슬그머니 웃음이 나왔다. 전남 여수 태생 한창훈 작가(1963~)의 '삼도노인회 제주 여행기'(2007)다.
소설 속 삼도 노인들은 밭이나 바다로 나가 무엇이든 캐고 다듬어 돈 만드는 버릇이 몸에 뱄다. 섬을 버리고 도시에 사는 자식에게 향했던 노인들은 꼭 탈이 났다. '아침에 심심하고, 점심때 무료하고, 저녁때 쓸쓸하고, 밤에는 잠 또한 오지 않아 시름시름 앓는 병'을 얻었다.
어느날 삼도노인회는 자식들이 해마다 부어온 곗돈을 밑천 삼아 3박 4일 관광을 떠난다. 때는 4월, 쑥 뜯는 철도 지나고 삼치낚시도 끝물인 시기였다.
여행지를 두고 열댓명 의견이 남녀로 갈렸다. 바닷일을 해온 남자들은 산을 원했다. 여자들은 삼도에서 훤히 보이는 제주로 가자고 했다. 첫날 밤을 지리산 온천 여관에서 보내고 다음날 제주 여행길에 올랐다.
"오메, 뜨네. 쐿덩어리가 뜬다등만, 진짜 뜨네이. 어이, 배도 쐰듸 물에 뜨잖어, 하늘인들 못 뜨것능가. 근디 왜 이리 흔들린다냐. 멀미 나겄네. 휴게소는 언지 들린단가. 우동 한 그릇 묵었으믄 좋겄는디." 비행기가 여수공항을 이륙하자 여기저기서 말소리가 터졌다. 비행기에서 내려 마주한 제주는 '낯선 대륙'이었다.
제주섬의 환상은 이내 깨졌다. 바다를 끼고 살아온 노인들은 '버버리 전복'인 오분자기탕과 '베말'로 만든 반찬에 시큰둥했다. 저녁 때 찾은 자리돔구이집에선 비늘을 벗기지 않고 굵은 소금 뿌려 구운 '재리'(자리돔)에 목청이 높아졌다. "제주도까지 와서 재리 구어 밥 묵는 것두 거시기한디 비늘도 안 벗긴 것을 워치게 묵으라고." "생선 맛 통 모르는구만. 껍데기가 얼마나 맛있는디. 이렇게 간을 하믄 간도 잘 안 배고 껍데기도 못 먹잖어." 귀하다는 다금바리회로 진정시키려 하지만 삼도에서 그 물고기는 '닥치는 대로 묵어조지는 허천뱅이'였다.
칠순 노인들을 모시는 청년회장 역만이 그들을 이끈 곳은 결국 극장식 나이트클럽이다. 삼도의 노인들은 반라의 무희들이 등장하는 나이트클럽에서 제주의 마지막 밤을 보낸다.
작가 특유의 걸쭉하고 능청스러운 입담 덕에 제주 여행담이 재미나게 표현됐지만 갈피갈피 고단한 바닷가 사람들의 사연이 밀려든다. 병들어 죽은 가두리양식장의 참돔과 우럭을 퍼내는 것만으로 하루 일과가 꽉찬 역만이 그렇다. 삶의 터전이 황폐화되며 생계를 위협받는 그들이지만 바다를 떠날 순 없다. '삼도노인회 제주 여행기' 등 8편이 묶인 '나는 여기가 좋다'(2009)엔 삼도 같은 섬에서 살아가는 또다른 존재들이 보인다. 그들은 다짐한다. 거친 바다를 씩씩하게 뚫고 나아가겠다. 진선희기자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현장] “두쫀쿠가 뭐길래”… 제주서도 웨이팅 열풍
- 2

6·3 지방선거 反오영훈 연대 공식화..제주혁신포럼 출범
- 3

'제 살 깎아먹기' 제주 농어촌민박 6년 새 1800곳 폭증
- 4

월정리 바다서 의문의 목선 발견… 선박에는 '한자'
- 5

행안부 "제주~칭다오 투자심사 대상"… 궁지 몰린 제주도
- 6

제주~칭다오 투자심사 패스 논란… 법률 자문 상반
- 7

[현장] “신구간 특수 사라진 지 오래” 서문가구거리 한산
- 8

제주개발공사, 탐라영재관 운영 손 떼나
- 9

[문화人터뷰] 학생 천 명 ‘좌우명’ 새긴 아흔의 현수언 서…
- 10

"단식 농성 돌입" 제주대 미래융합대학 갈등 격화
- 17:54

화가 김창열, 제주의 관계성… 계간 '제주작가' …
- 17:14

원도심 무근성 옆 전시장에 '작은 미술시장'
- 21:00

뿌려진 듯한 작은 색점… '말의 형상'
- 18:01

제주비엔날레 10년… "미술관 넘어 원도심으로"
- 15:14

제52회 한국아동문학상에 제주 박희순 시인
- 13:39

탐라도서관 '열두 달 고전 읽기' 참가자 모집
- 15:19

한라도서관 '탐라를 읽다, 제주를 보다'… 새해 …
- 14:46

[문화쪽지]음악극 '탐라순력도'… 서귀포예술단 …
- 13:58

제주 숲 반딧불이가 남긴 빛의 궤적… 유진희 사…
- 13:55

내면과 외부 충돌의 흔적… 양묵 작가 '자아-존…















 2026.01.14(수) 00:03
2026.01.14(수)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