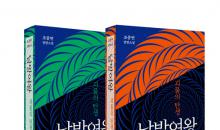[김영호의 월요논단] 제2회 제주비엔날레, 어떻게 준비하나
- 입력 : 2018. 02.05(월)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제주미술인들의 숙원사업이던 제주비엔날레가 창설되어 첫 행사를 마쳤다. 제주비엔날레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그 전시에 대한 도내외의 비판적 평가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으므로 여기서 논외로 하겠다. 다만 녹록지 않은 조건 속에서도 제주비엔날레를 창설하는데 기여한 몇몇 미술인들의 노고와 제주도지사와 도의원들의 후원 의지는 향후 제주 미술사에 기록될 것이다. 첫 행사를 치르고 난 지금 제주비엔날레를 바라보는 도내외 전문가들의 관심은 이미 차기 비엔날레로 향해 있다. 첫 행사의 무리한 일정과 조직 그리고 운영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1995년 제주도는 광주비엔날레보다 몇 달 앞서 제주프리비엔날레를 출범시킨 호기로움을 보였으나 단발성으로 그친 전력을 가지고 있다. 20여년 만에 재도전한 제주비엔날레가 다시 단발성으로 끝난다면 미술인은 물론 제주도 당국과 도의회 모두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2회 제주비엔날레를 위한 준비 기간은 여유롭지 않다. 2019년 바로 내년으로 다가왔다. 도내 미술인들도 이제 침묵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지하듯이 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리는 국제규모의 미술 행사다. 3년마다 열리면 트리엔날레, 4년마다 열리면 콰트리엔날레라 부른다. 5년 또는 10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경우도 있는데 독일의 카셀도큐멘터와 뮌스터조각프로젝트가 그 예다. 세계 각국에서 2년마다 개최하는 비엔날레를 선호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국제행사의 특성상 매년 행사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삶의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비엔날레의 실험적 역할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한 비엔날레에서 두 개의 장르를 택하고 교차로 매년 격년제 행사를 담당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가령 베니스비엔날레재단이 운영하는 건축전이나 광주비엔날레재단이 개최하는 디자인비엔날레가 그것이다. 이 경우는 재단의 역사와 노하우가 축적된 경우이거나 비엔날레를 가동할 전문인력이 정비된 조직을 전제로 할 때야 가능한 것이다.
제주비엔날레가 신생비엔날레로서 지속 가능하고 지역 간 문화교류의 발전소로 정착하기 위해서 해야 할 기본적 요소들이 있다. 우선 비엔날레를 위한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2019 제주비엔날레 조직위원회를 발족하고, 아울러 제주비엔날레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골자다. 1회 행사 때처럼 제주도립미술관이 비엔날레를 치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은 비엔날레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우리나라 관계법은 미술관을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장품 중심의 운영규정은 국제박물관협의회가 정한 윤리강령을 따른 것으로 세계 각국의 미술관이 준수하고 있는 사항이다. 제주비엔날레가 현대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반응하는 미술인들의 작업들을 통해 지역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유기적이고 실험적인 문화장치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독립된 조직과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제주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의 발족을 위한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시되고 도민들의 논의와 합의를 거치며 진행해야 한다.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축제를 위한 두 번째 행보에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김영호의 미술평론가·중앙대 교수>
주지하듯이 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리는 국제규모의 미술 행사다. 3년마다 열리면 트리엔날레, 4년마다 열리면 콰트리엔날레라 부른다. 5년 또는 10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경우도 있는데 독일의 카셀도큐멘터와 뮌스터조각프로젝트가 그 예다. 세계 각국에서 2년마다 개최하는 비엔날레를 선호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국제행사의 특성상 매년 행사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삶의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비엔날레의 실험적 역할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한 비엔날레에서 두 개의 장르를 택하고 교차로 매년 격년제 행사를 담당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가령 베니스비엔날레재단이 운영하는 건축전이나 광주비엔날레재단이 개최하는 디자인비엔날레가 그것이다. 이 경우는 재단의 역사와 노하우가 축적된 경우이거나 비엔날레를 가동할 전문인력이 정비된 조직을 전제로 할 때야 가능한 것이다.
제주비엔날레가 신생비엔날레로서 지속 가능하고 지역 간 문화교류의 발전소로 정착하기 위해서 해야 할 기본적 요소들이 있다. 우선 비엔날레를 위한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2019 제주비엔날레 조직위원회를 발족하고, 아울러 제주비엔날레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골자다. 1회 행사 때처럼 제주도립미술관이 비엔날레를 치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은 비엔날레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우리나라 관계법은 미술관을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장품 중심의 운영규정은 국제박물관협의회가 정한 윤리강령을 따른 것으로 세계 각국의 미술관이 준수하고 있는 사항이다. 제주비엔날레가 현대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반응하는 미술인들의 작업들을 통해 지역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유기적이고 실험적인 문화장치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독립된 조직과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제주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의 발족을 위한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시되고 도민들의 논의와 합의를 거치며 진행해야 한다.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축제를 위한 두 번째 행보에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김영호의 미술평론가·중앙대 교수>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2026.01.16(금) 14:09
2026.01.16(금)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