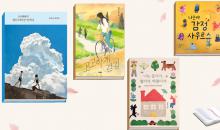[김양훈의 한라시론] 잔인한 국가
- 입력 : 2025. 10.23(목) 03:00 수정 : 2025. 10. 23(목) 08:55
-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한라일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심에서 집 팔아서 몇 년씩 재판하고 겨우 무죄를 받으면 항소심에 가서 5% 뒤집힌다. 95%는 헛고생하는 것 아니냐, 국가가 왜 이렇게 잔인하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기소를 해서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기 위해 상소하며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100년 전 이와 비슷한 장면을 프란츠 카프카는 소설 '소송'에서 보여주었다.
소설은 이렇게 시작한다. "누군가 요제프 K를 중상모략한 것이 틀림없다. 그가 무슨 특별한 나쁜 짓을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아침 느닷없이 체포됐기 때문이다." 그의 무죄 주장에도 재판은 끝없이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법은 진실을 가려내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소진케 하는 미궁(迷宮)이다. 카프카는 이 작품을 통해 개인이 넓은 의미의 사법 권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카프카가 소설 속에서 비판하는 "사법제도"는 헌법상 사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보조하는 제도 전체를 가리킨다. 헌법이 규정하는 사법권인 법원과 함께 그 집행·보조기구인 검찰, 경찰, 법무부까지 아우르는 것이다.
기약 없이 길어지는 긴 소송절차에 정신이 피폐해지고 삶이 무너져 내리는 요제프 K처럼, 오늘날 한국의 피고인들도 비슷한 지옥을 경험한다. 검찰의 항소권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보장돼 있고, 무죄 판결을 받아도 검사는 면책을 위해 다시 상소한다. 그사이 변호사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또 한편, 사회는 피의자에게 '무죄 추정' 대신 '유죄 낙인'을 찍기 일쑤다.
'소송'의 '대성당' 편에서 신부가 들려주는 '문지기 우화'는 카프카의 이러한 현실을 압축해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법의 입구는 열려 있지만, 시골 남자는 정작 내부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 남자는 평생 문 앞에서 서성이다 생을 마감한다. 법이 정의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들어갈 수 없는 문으로 바뀌는 순간 그 문은 폭력이 된다. 성역 같다는 우리 대법원의 문은 과연 이와 다른가? 결국, K는 채석장에서 "개 같군"이란 말을 남기고 처형당한다. 인간이 인간으로 죽을 수 없는 세계, 이것이 카프카가 고발한 사법제도이다. 사법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잃었을 때, 법은 정의의 이름으로 잔혹해진다.
해방 이후 한 번도 제대로 바뀌지 않은 사법부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런데 개혁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는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대희 대법원장의 모습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한마디 답변도 없이 90분 동안 입을 닫았다. 사법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시험 권력인 법관은 국민의 심부름꾼일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무소불위의 선민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의 문'을 새롭게 고치지 않는다면, '문지기 우화'처럼 법은 정의의 이름을 빌린 잔인한 폭력으로 계속 남게 될 것이다. <김양훈 프리랜서 작가>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소설은 이렇게 시작한다. "누군가 요제프 K를 중상모략한 것이 틀림없다. 그가 무슨 특별한 나쁜 짓을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아침 느닷없이 체포됐기 때문이다." 그의 무죄 주장에도 재판은 끝없이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법은 진실을 가려내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소진케 하는 미궁(迷宮)이다. 카프카는 이 작품을 통해 개인이 넓은 의미의 사법 권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카프카가 소설 속에서 비판하는 "사법제도"는 헌법상 사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보조하는 제도 전체를 가리킨다. 헌법이 규정하는 사법권인 법원과 함께 그 집행·보조기구인 검찰, 경찰, 법무부까지 아우르는 것이다.
기약 없이 길어지는 긴 소송절차에 정신이 피폐해지고 삶이 무너져 내리는 요제프 K처럼, 오늘날 한국의 피고인들도 비슷한 지옥을 경험한다. 검찰의 항소권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보장돼 있고, 무죄 판결을 받아도 검사는 면책을 위해 다시 상소한다. 그사이 변호사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또 한편, 사회는 피의자에게 '무죄 추정' 대신 '유죄 낙인'을 찍기 일쑤다.
'소송'의 '대성당' 편에서 신부가 들려주는 '문지기 우화'는 카프카의 이러한 현실을 압축해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법의 입구는 열려 있지만, 시골 남자는 정작 내부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 남자는 평생 문 앞에서 서성이다 생을 마감한다. 법이 정의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들어갈 수 없는 문으로 바뀌는 순간 그 문은 폭력이 된다. 성역 같다는 우리 대법원의 문은 과연 이와 다른가? 결국, K는 채석장에서 "개 같군"이란 말을 남기고 처형당한다. 인간이 인간으로 죽을 수 없는 세계, 이것이 카프카가 고발한 사법제도이다. 사법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잃었을 때, 법은 정의의 이름으로 잔혹해진다.
해방 이후 한 번도 제대로 바뀌지 않은 사법부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런데 개혁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는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대희 대법원장의 모습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한마디 답변도 없이 90분 동안 입을 닫았다. 사법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시험 권력인 법관은 국민의 심부름꾼일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무소불위의 선민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의 문'을 새롭게 고치지 않는다면, '문지기 우화'처럼 법은 정의의 이름을 빌린 잔인한 폭력으로 계속 남게 될 것이다. <김양훈 프리랜서 작가>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합격자 대부분이 '지인'… 돌문화공원 불공정 채용 논란
- 2

제주시청 공무원 음주사고 후 측정 거부해 검찰 송치
- 3

"서광로 주민이 테스트베드냐" 섣부른 BRT 추진 질타
- 4

제주발 'GM볼' 역베팅 투자사기 피해·범죄 규모 '눈덩이'
- 5

막판까지 접전… '탐라기' 결승전 끝으로 폐막
- 6

[현장] “직원 총출동”… 설 맞아 물량 쏟아진 우편집중국
- 7

남방큰돌고래 제주 밖 해역 첫 출현… 동해서 발견
- 8

제주자치도 공무원 또 증원.. 이번엔 근로감독 22명
- 9

[종합] 제주 삼양동·봉개동 도의원 선거구 현행 유지 가닥
- 10

제주 공략 나선 국힘… 중앙당 제2공항 특위 위원장 선임
- 00:00

[문명숙 시민기자의 눈] 깨끗한 제주 만들기, 오…
- 00:00

[열린마당] 화목보일러의 낭만은 안전관리로부…
- 00:00

[현장시선] 체류가 여는 지역소비, 제주 관광의 …
- 00:00

[열린마당] 제주 저탄소농업, 땅을 살리면 농업…
- 03:00

[김완병의 목요담론] “자식들한테 우던 닮았다…
- 01:00

[열린마당]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성패를 가…
- 01:00

[열린마당] 겨울철 전기용품, 습관이 안전을 좌…
- 02:00

[김용성의 한라시론] AI 시대, 창의성을 위한 '창…
- 02:00

[강준혁의 건강&생활] 겨울철 독감과 감기 대처…
- 01:00

[열린마당] 유학사상에서 삶의 지혜를 배웁시다















 2026.02.13(금) 21:28
2026.02.13(금)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