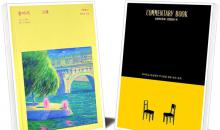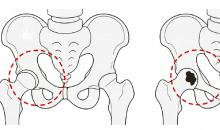- 입력 : 2025. 09.30(화) 03:00 수정 : 2025. 09. 30(화) 08:12
-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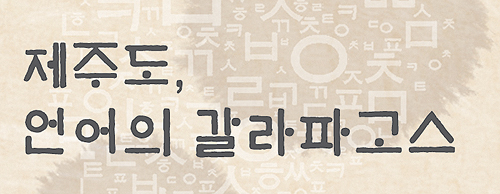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039-1이다. 표고 137.3m, 자체 높이 97m다. 이 오름은 전 사면이 완만하게 이루어져 있다. 길게 산마루가 이어지고, 정상 부분의 가운데는 얕은 분화구가 넓게 형성돼 있다.
1439년 세종실록 세종 21년 기미 조에 수산(水山)으로 기록한 것이 이른 시기의 지명이다. 이후 1530년 신중동국여지승람에 역시 수산(水山)으로 표기했다. 그러다가 1653년 탐라지를 비롯한 여러 고전에 수산(首山)으로 나온다. 이러던 것이 일제강점기 지도에 수산봉(水山峯),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 대수산봉으로 표기했다.

물미, 정면 오른쪽, 그 뒤로 대왕산, 두산봉(말미오름), 지미봉이 보인다. 낭끼오름에서 촬영. 김찬수
제주의 오름이라는 제주도가 발간한 책에는 "원래 물뫼(물미)라고 했던 것을 동쪽에 이웃한 족은물뫼(小水山峰)와 구별해 큰물뫼(큰물미)라고 부르게 됐다"라고 소개해 있다. 쟁점은 왜 이 오름을 물미, 물메, 물뫼 등으로 부르는가 하는 것이다.
물미, 물과는 관계없어
마을 이름으로서의 수산(성산읍 수산리)을 지역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1994년 수산리지(水山里誌)를 인용한 2021년 발간 개정증보판 수산리지(水山里誌)의 관련 요지다. "수산리의 명칭은 원래 수산(首山)이다. 17세기까지는 수산(水山)이란 명칭을 사용했다. 이후 수(水)를 수(首)라로 바꾸어 수산(首山)이란 이름을 사용하다가 다시 수산(水山)으로 회귀했다. 이처럼 수산(水山)으로 사용하게 된 연유가 기록돼 있는데, 마을이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학숙당이 생겨나 양촌으로서의 입지가 굳어지면서 수산(首山)의 수(首)는 우두머리, 처음, 먼저, 머리 등을 표현하는 반면에 '꾸벅거리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양촌으로서의 양반, 선비가 사는 마을 이름으로서는 부적당하다고 해서 수산(水山)으로 개명됐다." "어질고 인자하고 예의 바르고 슬기로우며 신의 있는 사람이 인자(仁者)가 되고, 지자(智者)가 된다는 말로 인자요산(仁者樂山), 지자요수(知者樂水)에서 수(水)자와 산(山)자를 따서 수산리(水山里)라고 개명했다."

물미, 정면 오른쪽, 가운데 족은물미, 섬처럼 보이는 지형은 섭지코지다. 두산봉에서 촬영. 김찬수
그러나 수산(水山)이건 수산(首山)이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작명한 지명은 거의 없다. 한자라는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부터 부르던 것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어느 글자를 선택하느냐가 결정한다. '수산'이란 마을 지명의 기원지는 '물미'일 것이다. 발음하는 사람과 받아적는 사람의 조합에 따라 '믈미', '물미', '믈메', '물메', '믈매', '물매', '믈뫼', '물뫼', 어쩌면 훈민정음으로도 이루 다 표기하기 어려운 음성들이 있었을 수 있다. '수산리지'는 마을의 옛 이름이 여러 가지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대체로 물미, 물메, 물뫼였을 것으로 기록했다.
이 이름들은 대수산봉의 지명이기도 하다. 오름이 인접할 경우 마을 이름은 그 오름 지명을 따르게 마련이다. 수산리지는 수산이라는 지명에 대해 설명했지만 그 기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도 알 수 있는 부분은 '물(水)'과 관련지어 설명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수산(水山)과 수산(首山)은 같은 뜻
지금까지 기록에 나타난 이 오름의 이름 중 수산(水山)의 수(水)는 '물 수'자이다. 어떤 전문가는 훈독자 표기라 했다. 그렇다면 이 오름과 물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무 관련이 없다면 훈가자로 쓴 것이라 해야 맞는다. 물과는 관련이 없으되 물이라고 발음한다는 것이다. 아마 개음절로 발음했던 고대인은 '무르' 혹은 '마르'라 했을 것이다. 산(山) 역시 '마르'를 차자할 때 흔히 쓰는 글자다. '마르마르'라는 이중첩어 지명이다. 수산(首山)이란 지명에 대해 수산(水山)의 수(水)를 수(首)로 잘못 표기했다는 전문가도 있다. 그런 게 아니다. 이 수(首)는 '머리 수'자다. 역시 훈가자로 표기해 발음만 '머리'임을 나타내고자 한 글자다. 수산망(首山望)의 망(望)은 '바랄 망'이지만 이 경우는 음가자로 쓴 것이다. 즉, 망(望)의 어두음 '마'를 표현하려고 동원 글자다. 마르, 마루 등은 폐음절로 발음하면 'ㄹ'이 생략되면서 '마' 혹은 '마'로도 나타난다. 제주 지명에 '마르'를 '망(望)'으로 차자한 예를 여럿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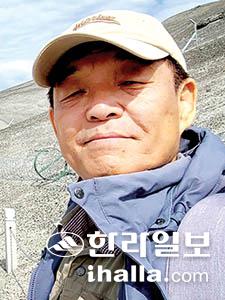
김찬수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1

제주대학교 제12대 총장 1순위 후보자 양덕순..54.6% 득표
- 2

[현장] 보행자 우선도로인데… 정작 보행자는 ‘아슬아슬’
- 3

제주서 생애 최초 내집 갖기 '양극화 현상' 뚜렷
- 4

일반고 전환 앞둔 제주여상, 새 교명 최종 후보 3개 공개
- 5

제주대 총장 선거 양덕순 49.67% 득표.. 2차 투표 돌입
- 6

정부 "제주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 시행 가능"
- 7

내년도 예산에 제주형 기초지자체 홍보비?... "엇박자 행정"
- 8

제주 1호 관광도로 '구좌 숨비해안로'는 어디 있나?
- 9

제주 비양도 '친환경 관광지'로 '한국 관광의 별' 됐다
- 10

사람·차량 뒤엉킨 우도 도항선에서 차량 먼저 내린다
- 02: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2] 3부 오름-(111)비…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1] 3부 오름-(110)볼…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0] 3부 오름-(109)베…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49] 3부 오름-(108)수…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48] 3부 오름-(107)머…
- 03:3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47] 3부 오름-(106)ᄉ…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46] 3부 오름-(105)물…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45] 3부 오름-(104)북…
- 02: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44] 3부 오름-(103)빈…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43] 3부 오름-(102)갯…















 2025.11.28(금) 21:02
2025.11.28(금)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