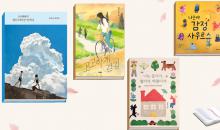[현승훈의 문화광장] 1945년부터 만드는 집
- 입력 : 2025. 08.05(화) 03:00
-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한라일보] 오래된 집을 고쳐 작업실로 활용한 지 어느덧 7년이 됐다. 옛집에 새집을 잇는 방식으로 증축한 터라 연결 부위에서 비가 새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었다.
7년 전 집을 고칠 때, 가족과 함께했다. 아버지와 해묵은 지붕 판자를 뜯어내면, 어머니는 좀먹은 서까래 사이로 물을 세차게 뿌리며 먼지를 걷어냈고, 동생은 오래된 나무를 사포질 해서 차곡차곡 쌓았다. 기술자에게 맡기면 수월한 일에 왜 굳이 가족을 데려다 힘들게 작업했을까? 함께 집을 짓는 행위는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
옛집은 1945년 해방 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근처 비행장에서 나무를 직접 짊어와 뼈대를 올렸다고 한다. 당시 제주 사회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서로의 집 짓기를 돕는 '수눌음' 공동체 문화가 있었다.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자연 재료로 만들었기에 집은 다소 거칠었지만, 살면서 가족 구성원들의 꾸준한 관리를 통해 애착을 갖는 보금자리가 됐다. 아버지는 1984년 결혼을 준비하며 할머니가 지은 옛집을 고쳤고, 이후 어머니와 함께 옛집에 이웃한 시멘트블록 집을 지었다.
작년에 그 블록집을 고치기 시작했다. 1991년에 만든 건물이 지닌 단열과 방수의 문제를 인정하면서 기존 집 안으로 새로운 벽을 세워 집 안에 집을 만들었다. 기존 벽과 새로운 벽 사이는 완벽한 실내도 실외도 아닌 중간 성격의 공간이 됐다. 결함이 건네준 새로운 발상이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집 짓기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많은 부분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현실이다. 결함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로 집을 짓고, 짓고 나서 유지관리를 최소화하고자 애쓴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물이 한번 지어지면 영구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역설적으로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건축물이 우리와 정서적 유대감을 만들지 않거나 흠이 생기면 더 빨리 철거돼, 후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건축학자 모센 모스타파비(Mohsen Mostafavi)는 저서 '풍화에 대하여(On Weathering)'에서 마감 공사가 끝난 시점을 건물의 완성으로 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지속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건물의 새로운 시작으로, 건물이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는 완성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건물은 자연에 의해 서서히 노후화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풍화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지난 80여 년간, 우리 집에도 여러 번의 마감 공사가 있었다. 건축이 한순간에 만들어져 영구적으로 서 있는 물질의 차원을 넘어,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가꿔나가야 하는 '문화'임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된다. 훗날, 지금의 집은 또다시 어떻게 고쳐지게 될까? <현승훈 다랑쉬 건축사사무소>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7년 전 집을 고칠 때, 가족과 함께했다. 아버지와 해묵은 지붕 판자를 뜯어내면, 어머니는 좀먹은 서까래 사이로 물을 세차게 뿌리며 먼지를 걷어냈고, 동생은 오래된 나무를 사포질 해서 차곡차곡 쌓았다. 기술자에게 맡기면 수월한 일에 왜 굳이 가족을 데려다 힘들게 작업했을까? 함께 집을 짓는 행위는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
옛집은 1945년 해방 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근처 비행장에서 나무를 직접 짊어와 뼈대를 올렸다고 한다. 당시 제주 사회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서로의 집 짓기를 돕는 '수눌음' 공동체 문화가 있었다.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자연 재료로 만들었기에 집은 다소 거칠었지만, 살면서 가족 구성원들의 꾸준한 관리를 통해 애착을 갖는 보금자리가 됐다. 아버지는 1984년 결혼을 준비하며 할머니가 지은 옛집을 고쳤고, 이후 어머니와 함께 옛집에 이웃한 시멘트블록 집을 지었다.
작년에 그 블록집을 고치기 시작했다. 1991년에 만든 건물이 지닌 단열과 방수의 문제를 인정하면서 기존 집 안으로 새로운 벽을 세워 집 안에 집을 만들었다. 기존 벽과 새로운 벽 사이는 완벽한 실내도 실외도 아닌 중간 성격의 공간이 됐다. 결함이 건네준 새로운 발상이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집 짓기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많은 부분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현실이다. 결함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로 집을 짓고, 짓고 나서 유지관리를 최소화하고자 애쓴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물이 한번 지어지면 영구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역설적으로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건축물이 우리와 정서적 유대감을 만들지 않거나 흠이 생기면 더 빨리 철거돼, 후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건축학자 모센 모스타파비(Mohsen Mostafavi)는 저서 '풍화에 대하여(On Weathering)'에서 마감 공사가 끝난 시점을 건물의 완성으로 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지속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건물의 새로운 시작으로, 건물이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는 완성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건물은 자연에 의해 서서히 노후화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풍화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지난 80여 년간, 우리 집에도 여러 번의 마감 공사가 있었다. 건축이 한순간에 만들어져 영구적으로 서 있는 물질의 차원을 넘어,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가꿔나가야 하는 '문화'임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된다. 훗날, 지금의 집은 또다시 어떻게 고쳐지게 될까? <현승훈 다랑쉬 건축사사무소>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합격자 대부분이 '지인'… 돌문화공원 불공정 채용 논란
- 2

"서광로 주민이 테스트베드냐" 섣부른 BRT 추진 질타
- 3

제주시청 공무원 음주사고 후 측정 거부해 검찰 송치
- 4

제주자치도 공무원 또 증원.. 이번엔 근로감독 22명
- 5

제주발 'GM볼' 역베팅 투자사기 피해·범죄 규모 '눈덩이'
- 6

[종합] 제주 삼양동·봉개동 도의원 선거구 현행 유지 가닥
- 7

제주 올해 지방공무원 572명 선발.. 2006년 이후 최대
- 8

[현장] “직원 총출동”… 설 맞아 물량 쏟아진 우편집중국
- 9

"만다린 무관세 수입 위기?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 10

제주 공략 나선 국힘… 중앙당 제2공항 특위 위원장 선임
- 00:00

[문명숙 시민기자의 눈] 깨끗한 제주 만들기, 오…
- 00:00

[열린마당] 화목보일러의 낭만은 안전관리로부…
- 00:00

[현장시선] 체류가 여는 지역소비, 제주 관광의 …
- 00:00

[열린마당] 제주 저탄소농업, 땅을 살리면 농업…
- 03:00

[김완병의 목요담론] “자식들한테 우던 닮았다…
- 01:00

[열린마당]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성패를 가…
- 01:00

[열린마당] 겨울철 전기용품, 습관이 안전을 좌…
- 02:00

[김용성의 한라시론] AI 시대, 창의성을 위한 '창…
- 02:00

[강준혁의 건강&생활] 겨울철 독감과 감기 대처…
- 01:00

[열린마당] 유학사상에서 삶의 지혜를 배웁시다















 2026.02.15(일) 18:45
2026.02.15(일)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