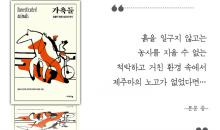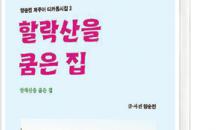[2025 해양탐사 제주바다, 그 변화의 기록] (7)동일리 마을어장
"하얗게 변한 바다에 생명이 다시 돋아난다"
- 입력 : 2025. 07.24(목) 03:00 수정 : 2025. 07. 24(목) 13:38
- 고대로 오소범 기자 hl@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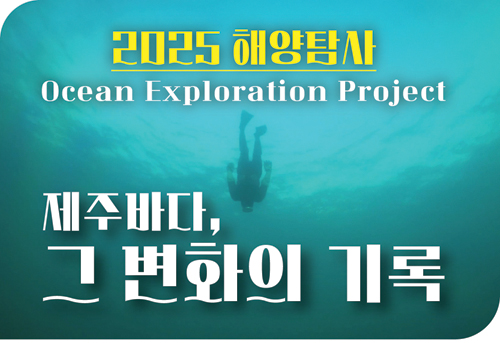
갯녹음 확산으로 수심 5m 이내까지 생태계 붕괴 '심각'
4㏊ 규모 인공어초 설치…패조류·어류 서식처 역할 톡톡
수중탐사 결과, 해조류 번식·생물 다양성 회복 징후 뚜렷
"자연 천이·플랑크톤 증가"… 생산성 회복 가능성에 주목
[한라일보]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마을어장은 제주 해역 중 갯녹음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다. 제주 지역의 갯녹음은 일반적으로 조하대 수심 5~7m 이내의 얕은 수심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지만, 동일리 역시 갯녹음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해양생태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23년 동일리 마을어장에 '이중돔형 인공어초'를 설치했다. 설치 규모는 총 4㏊(2단지)로, 둥근 반구 형태로 제작된 이중돔 어초는 전복과 소라 같은 패조류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동시에, 내부 공간은 조피볼락 등 정착성 어류의 은신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생태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23년 동일리 마을어장에 '이중돔형 인공어초'를 설치했다. 설치 규모는 총 4㏊(2단지)로, 둥근 반구 형태로 제작된 이중돔 어초는 전복과 소라 같은 패조류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동시에, 내부 공간은 조피볼락 등 정착성 어류의 은신처 역할도 하고 있다.
본보 해양탐사팀은 지난 1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제주도어초어장관리사업팀과 함께 동일리 해역을 찾았다.
 이날 오후 3시, 모슬포항에서 출발한 조사선은 동쪽 해상으로 10여 분을 달려 동일리 앞바다에 도착했다. 잔잔한 바다 위에서 조사선이 멈추자 탐사팀은 곧장 장비 점검에 들어갔다. 스쿠버 다이빙 슈트를 착용하고, 공기통과 레귤레이터, 수중카메라 등 장비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탐사 준비를 마쳤다.
이날 오후 3시, 모슬포항에서 출발한 조사선은 동쪽 해상으로 10여 분을 달려 동일리 앞바다에 도착했다. 잔잔한 바다 위에서 조사선이 멈추자 탐사팀은 곧장 장비 점검에 들어갔다. 스쿠버 다이빙 슈트를 착용하고, 공기통과 레귤레이터, 수중카메라 등 장비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탐사 준비를 마쳤다.
김대종 제주오션 대표(인공어초사후영향조사팀장)의 입수 신호에 따라 탐사팀과 조사팀은 차례로 바다로 몸을 던졌다. 수면 아래로 들어선 순간, 해수가 온몸을 감싸고 시야가 급격히 좁아졌다. 수심 5m, 10m, 15m… 깊어질수록 수압이 귀를 눌렀고, 맑던 물빛은 점차 어두운 검푸른색으로 변해갔다.


 수심 약 18~19m 지점, 해저에 이르자 모래 바닥이 펼쳐졌고, 그 위로 인공어초가 모습을 드러냈다. 양쪽으로 둥글게 곡선을 그린 시멘트 구조물 위에는 미역과 감태가 다발처럼 엉켜 있었다. 물살이 흐를 때마다 해조류 잎이 유영하듯 일렁였다. 탐사팀은 수중카메라로 어초 구조물의 표면을 촬영하고, 어초 틈 사이의 생물 서식 상태를 확인했다.
수심 약 18~19m 지점, 해저에 이르자 모래 바닥이 펼쳐졌고, 그 위로 인공어초가 모습을 드러냈다. 양쪽으로 둥글게 곡선을 그린 시멘트 구조물 위에는 미역과 감태가 다발처럼 엉켜 있었다. 물살이 흐를 때마다 해조류 잎이 유영하듯 일렁였다. 탐사팀은 수중카메라로 어초 구조물의 표면을 촬영하고, 어초 틈 사이의 생물 서식 상태를 확인했다.
인공어초 조사팀은 해조류 군락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며 표본을 채집했다. 어초 틈새에서는 따개비와 작은 갑각류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탐사팀이 접근하자 암반 틈에 숨어 있던 돌돔 한 마리가 순식간에 도망쳤다.


 어초 주변 암반에는 유절·무절 석회조류가 하얗게 덮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자연 번식한 감태와 미역이 돋아나 있었다. 따녹색열말미잘은 암반 위에서 우산처럼 펼쳐져 촉수를 꿈틀거리며 먹이를 포착하고 있었다.
어초 주변 암반에는 유절·무절 석회조류가 하얗게 덮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자연 번식한 감태와 미역이 돋아나 있었다. 따녹색열말미잘은 암반 위에서 우산처럼 펼쳐져 촉수를 꿈틀거리며 먹이를 포착하고 있었다.
이날 수중 시야는 2~3m로 좋지 않았지만, 조류의 흐름은 비교적 완만해 탐사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 탐사팀과 조사팀은 약 1시간 동안 수중 생태계의 변화를 관찰하고, 사진과 메모를 통해 바닷속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겼다.
김만철 한국수산자원공단 자원조성실장은 "이곳 인공어초에서 방출되는 해조류 포자가 인근 자연 암반 지역으로 퍼지면서 자연 천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어초에 부착된 조류와 미생물들이 배출하는 유기물이 수면 근처로 공급되면서 식물성 플랑크톤 생성을 유도하고, 이는 곧 어류와 패류, 갑각류의 먹이 자원이 풍부해지는 선순환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김대종 제주오션 대표는 현장 평가에서 "이곳은 수심 5m 이내의 얕은 구역은 여전히 상태가 좋지 않지만, 그 아래 깊은 지역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며 "과거 생태계가 일시적으로 악화된 시기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대종 제주오션 대표는 현장 평가에서 "이곳은 수심 5m 이내의 얕은 구역은 여전히 상태가 좋지 않지만, 그 아래 깊은 지역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며 "과거 생태계가 일시적으로 악화된 시기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지역과의 차이점도 강조했다. "표선이나 위미 마을어장의 경우, 동일한 수심대임에도 해조류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특히 과거 15~20년 전까지만 해도 매우 생산적인 어장이었지만, 한 번 악화된 후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어장은 자연적인 복원력이 작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생태적 기반이 무너진 경우 회복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양탐사취재팀 : 고대로 편집국장·오소범 기자/수중영상촬영 : 오하준 감독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4㏊ 규모 인공어초 설치…패조류·어류 서식처 역할 톡톡
수중탐사 결과, 해조류 번식·생물 다양성 회복 징후 뚜렷
"자연 천이·플랑크톤 증가"… 생산성 회복 가능성에 주목
[한라일보]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마을어장은 제주 해역 중 갯녹음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다. 제주 지역의 갯녹음은 일반적으로 조하대 수심 5~7m 이내의 얕은 수심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지만, 동일리 역시 갯녹음이 확산되고 있다.

동일리 탐사지점 바다에서 바라 본 육상.
본보 해양탐사팀은 지난 1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제주도어초어장관리사업팀과 함께 동일리 해역을 찾았다.

동일리 탐사 포인트.
김대종 제주오션 대표(인공어초사후영향조사팀장)의 입수 신호에 따라 탐사팀과 조사팀은 차례로 바다로 몸을 던졌다. 수면 아래로 들어선 순간, 해수가 온몸을 감싸고 시야가 급격히 좁아졌다. 수심 5m, 10m, 15m… 깊어질수록 수압이 귀를 눌렀고, 맑던 물빛은 점차 어두운 검푸른색으로 변해갔다.

조사선에서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

현장 도착 탐사팀 육상 촬영 모습.

바다에 입수하는 탐사팀과 조사팀.
인공어초 조사팀은 해조류 군락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며 표본을 채집했다. 어초 틈새에서는 따개비와 작은 갑각류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탐사팀이 접근하자 암반 틈에 숨어 있던 돌돔 한 마리가 순식간에 도망쳤다.

미역과 감태가 다발처럼 얽혀 있는 인공어초.

미역과 감태가 착생하고 있는 암반지대.

수중 조사 모습.
이날 수중 시야는 2~3m로 좋지 않았지만, 조류의 흐름은 비교적 완만해 탐사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 탐사팀과 조사팀은 약 1시간 동안 수중 생태계의 변화를 관찰하고, 사진과 메모를 통해 바닷속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겼다.
김만철 한국수산자원공단 자원조성실장은 "이곳 인공어초에서 방출되는 해조류 포자가 인근 자연 암반 지역으로 퍼지면서 자연 천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어초에 부착된 조류와 미생물들이 배출하는 유기물이 수면 근처로 공급되면서 식물성 플랑크톤 생성을 유도하고, 이는 곧 어류와 패류, 갑각류의 먹이 자원이 풍부해지는 선순환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암반에 착생한 따녹색열말미잘 모습.

암반에 부착한 소라.
그는 이어 다른 지역과의 차이점도 강조했다. "표선이나 위미 마을어장의 경우, 동일한 수심대임에도 해조류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특히 과거 15~20년 전까지만 해도 매우 생산적인 어장이었지만, 한 번 악화된 후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어장은 자연적인 복원력이 작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생태적 기반이 무너진 경우 회복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양탐사취재팀 : 고대로 편집국장·오소범 기자/수중영상촬영 : 오하준 감독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03:00

[2025 해양탐사 제주바다, 그 변화의 기록 2부 (2)…
- 03:00

[2025 해양탐사 제주바다, 그 변화의 기록-(2부)] (1…
- 02:00

[2025 해양탐사 제주바다, 그 변화의 기록] 에필로…
- 03:00

[2025 해양탐사 제주바다, 그 변화의 기록] (11) 북…
- 03:00

[2025 해양탐사 제주바다, 그 변화의 기록] (10)고…
- 03:00

[2025 해양탐사 제주바다, 그 변화의 기록] (9)하도…
- 03:00

[2025 해양탐사 제주바다, 그 변화의 기록] (8)하귀…
- 03:00

[2025 해양탐사 제주바다, 그 변화의 기록] (7)동일…
- 03:00

[2025 해양탐사 제주바다, 그 변화의 기록] (6)함덕…
- 03:00

[2025 해양탐사 제주바다, 그 변화의 기록] (5)신도…















 2026.02.02(월) 11:42
2026.02.02(월)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