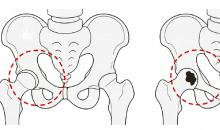“외로움마저 무뎌져”… 홀로 추석 보내는 노인들
3~9일 추석 황금연휴… 명절 때면 더 쓸쓸해
복지센터 문 닫아 외출 힘든 이들에겐 ‘고역’
“자식들 보고 싶은데도 연락 기다리는 수밖에”
복지센터 문 닫아 외출 힘든 이들에겐 ‘고역’
“자식들 보고 싶은데도 연락 기다리는 수밖에”
- 입력 : 2025. 10.02(목) 06:00 수정 : 2025. 10. 07(화) 15:22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 즐거워야 할 추석 명절이 홀로 남겨진 이들에겐 ‘일상’보다 더 외로운 시간이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일주일 간의 황금연휴가 낀 민족 대명절 추석. 가족들이 한데 모여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명절에도 홀로 쓸쓸하게 연휴를 보내는 이들이 있다. 특히 연휴 기간 주간보호센터들이 문을 닫으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의 명절은 더욱 적막하다.
지난달 29일 우리 주변 곳곳에 있지만 지나치기 쉬운 독거노인들을 만나 추석 나기와 일상을 물었다.
김전수(88·남)씨는 어릴 적 4·3으로 아버지와 형, 친척들을 잃었다.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김씨는 18세부터 일본과 부산 등을 오가며 뱃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객지 생활 도중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는 남은 가족마저 모두 잃었다.
김씨는 20대 중반쯤 결혼했지만 딸이 태어난 지 100일이 되기도 전에 아내와 헤어졌다. 이후로는 영영 두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렇게 60여 년의 시간을 홀로 지냈다. 가족이 그립지 않느냐는 물음에 김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젠 그런 것도 없어. 가족이 있다 해도 외롭지.”
명절이면 종종 제사음식을 들고 찾아오던 지인들의 발길이 끊긴 지도 10년이 훌쩍 지났다. 김씨에게 명절은 여느 평일과 다를 바 없는 하루하루일 뿐이다. 그는 자신의 옛이야기를 신나게 말하다가도 씁쓸한 얼굴로 변했다. “오래 살다 보니 외로움이 뭔지도 몰라. 명절이라고 다를 게 있나. 바라는 것도 없어.”
최병민(82·여)씨는 서울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끝내고 20여 년 전 제주로 이주했다. 고즈넉한 제주의 풍경이 최씨 부부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이다. 여행으로 찾은 제주는 그렇게 두 번째 고향이 됐다.
최씨에게 남편은 둘도 없는 단짝이었다. 하지만 5년 전 코로나 시기 남편을 잃으면서 최씨는 혼자가 됐다. 두 아들은 미국과 서울에 흩어져 있어 명절이라 하더라도 얼굴 보기가 힘들다.
“항상 기다리긴 하지만 아들들도 자기들 삶이 있는데 어떡해요. 나이 들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걸 계속 체감하는 것 같아요. 보고 싶어도 참을 수밖에요.”
송연복(70·남)씨는 시각장애인이다. 2년 전 알 수 없는 이유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올해부터는 아예 보이지 않게 됐다. 외출은 매주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시각장애인 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전부다.
서울 태생인 송씨는 과거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이력으로 소위 ‘빨간줄’이 생겨 취업이 어려웠다. “제주만 오면 두통이 사라졌다”는 송씨는 제주에 정착해 인테리어, 한옥 짓기 등의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마흔이 되던 해에 늦은 결혼을 하고 사랑스러운 두 아이를 가졌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 때쯤 아내와 이혼하며 가족과 멀어졌다. 아이들과의 연락은 더욱 뜸해졌고 얼굴을 못 본지는 벌써 몇 해가 흘렀다.
홀로 남은 송씨의 가장 친한 친구는 ‘책’이다. 어릴 적부터 책 읽기와 시 쓰기를 즐겼던 송씨의 연휴 계획은 역시나 ‘책 듣기’다.
“얘들이 명절에 찾아오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전화나 해주면 고맙죠. 앞이 보이지 않고 나서부터는 오디오북이 없으면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연휴에 읽을 단편소설들을 센터에서 더 빌려올 계획입니다.”
송씨는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알퐁스 도데의 ‘별’을 꼽았다. 책 이야기에 들뜬 표정을 한 송씨의 침대 맡에는 명절을 함께 보낼 오디오북 CD 10여 개가 차곡히 쌓여 있었다.
모두가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 즐거워야 할 추석 명절이 홀로 남겨진 이들에겐 ‘일상’보다 더 외로운 시간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지난달 29일 우리 주변 곳곳에 있지만 지나치기 쉬운 독거노인들을 만나 추석 나기와 일상을 물었다.
김전수(88·남)씨는 어릴 적 4·3으로 아버지와 형, 친척들을 잃었다.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김씨는 18세부터 일본과 부산 등을 오가며 뱃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객지 생활 도중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는 남은 가족마저 모두 잃었다.
김씨는 20대 중반쯤 결혼했지만 딸이 태어난 지 100일이 되기도 전에 아내와 헤어졌다. 이후로는 영영 두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렇게 60여 년의 시간을 홀로 지냈다. 가족이 그립지 않느냐는 물음에 김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젠 그런 것도 없어. 가족이 있다 해도 외롭지.”
명절이면 종종 제사음식을 들고 찾아오던 지인들의 발길이 끊긴 지도 10년이 훌쩍 지났다. 김씨에게 명절은 여느 평일과 다를 바 없는 하루하루일 뿐이다. 그는 자신의 옛이야기를 신나게 말하다가도 씁쓸한 얼굴로 변했다. “오래 살다 보니 외로움이 뭔지도 몰라. 명절이라고 다를 게 있나. 바라는 것도 없어.”
최병민(82·여)씨는 서울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끝내고 20여 년 전 제주로 이주했다. 고즈넉한 제주의 풍경이 최씨 부부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이다. 여행으로 찾은 제주는 그렇게 두 번째 고향이 됐다.
최씨에게 남편은 둘도 없는 단짝이었다. 하지만 5년 전 코로나 시기 남편을 잃으면서 최씨는 혼자가 됐다. 두 아들은 미국과 서울에 흩어져 있어 명절이라 하더라도 얼굴 보기가 힘들다.
“항상 기다리긴 하지만 아들들도 자기들 삶이 있는데 어떡해요. 나이 들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걸 계속 체감하는 것 같아요. 보고 싶어도 참을 수밖에요.”
송연복(70·남)씨는 시각장애인이다. 2년 전 알 수 없는 이유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올해부터는 아예 보이지 않게 됐다. 외출은 매주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시각장애인 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전부다.
서울 태생인 송씨는 과거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이력으로 소위 ‘빨간줄’이 생겨 취업이 어려웠다. “제주만 오면 두통이 사라졌다”는 송씨는 제주에 정착해 인테리어, 한옥 짓기 등의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마흔이 되던 해에 늦은 결혼을 하고 사랑스러운 두 아이를 가졌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 때쯤 아내와 이혼하며 가족과 멀어졌다. 아이들과의 연락은 더욱 뜸해졌고 얼굴을 못 본지는 벌써 몇 해가 흘렀다.
홀로 남은 송씨의 가장 친한 친구는 ‘책’이다. 어릴 적부터 책 읽기와 시 쓰기를 즐겼던 송씨의 연휴 계획은 역시나 ‘책 듣기’다.
“얘들이 명절에 찾아오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전화나 해주면 고맙죠. 앞이 보이지 않고 나서부터는 오디오북이 없으면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연휴에 읽을 단편소설들을 센터에서 더 빌려올 계획입니다.”
송씨는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알퐁스 도데의 ‘별’을 꼽았다. 책 이야기에 들뜬 표정을 한 송씨의 침대 맡에는 명절을 함께 보낼 오디오북 CD 10여 개가 차곡히 쌓여 있었다.
모두가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 즐거워야 할 추석 명절이 홀로 남겨진 이들에겐 ‘일상’보다 더 외로운 시간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제주대학교 제12대 총장 1순위 후보자 양덕순..54.6% 득표
- 2

일반고 전환 앞둔 제주여상, 새 교명 최종 후보 3개 공개
- 3

정부 "제주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 시행 가능"
- 4

제주대 총장 선거 양덕순 49.67% 득표.. 2차 투표 돌입
- 5

준공영제 운영비 '싹둑' ..상임위 새해 예산 640억원 삭감
- 6

제주 1호 관광도로 '구좌 숨비해안로'는 어디 있나?
- 7

제주 면허 갱신 대상자 역대 최대… 시험장 연일 ‘북적’
- 8

제주도 12월 한달간 탐나는전 5% 할인 발행
- 9

제주 '악성' 준공후 미분양 주택 20% 폭증.. 사상 최고치
- 10

제주 비양도 '친환경 관광지'로 '한국 관광의 별' 됐다
- 16:06

남의 밭 감귤 밭떼기 거래… '봉이 김선달'이 따…
- 11:16

찬공기 남하… 제주, 12월 첫주부터 춥겠다
- 11:12

국가숲길 지정 기념 한라산둘레길 돌오름길서 …
- 17:25

제주도 ‘공수화’ 원칙 삭제 검토에 시민사회 …
- 16:49

제주 경찰서 직원 숙취 음주운전으로 적발
- 16:37

삼양해수욕장서 2.5m 남방큰돌고래 사체 발견
- 16:20

제주 면허 갱신 대상자 역대 최대… 시험장 연일…
- 13:46

쓰레기로 뒤덮인 ‘제주의 허파’ 곶자왈… 대…
- 13:05

악기상 뚫고 폐 이식 환자 이송… 제주소방 ‘적…
- 09:29

한밤중 동문시장 식당서 화재… 인명피해 없어















 2025.11.30(일) 19:36
2025.11.30(일)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