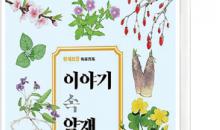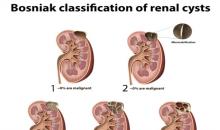- 입력 : 2009. 12.21(월) 00:00
- 강문규 기자 mgkang@hallailbo.co.kr

▲100년전 제주에는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열렸을까. 1910년대의 것으로 보이는 관덕정 앞 시장의 풍경에는 지금은 완전히 자취를 감춘 옛모습이 담겨있다. 지금 이런 풍경을 되살릴 수는 없을까. /그림=강부언
1930년대 상설시장 州城을 비롯 11개 노천시장 열려
제주도가 도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펴낸 사진집 '제주 100년'에는 제주의 과거와 현재를 반추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들이 수록돼 있다. 그 중에서도 1914년 일제식민통치의 초기에 찍은 것으로 소개되고 있는 '관덕정 앞 광장에서 시장이 열리는 모습'은 여러가지를 풀어낼 수 있는 압축된 정보파일이다.
우선 전체 사진 구도를 보면 가운데 기와지붕이 헐린 관덕정을 중심으로 오른쪽(남쪽)에는 고풍스러운 여러채의 기와집과 초가들이 도로변에 들어서 있다. 왼쪽에는 제주목 관아의 정문인 포정문이 2층 누각으로 서 있고, 주민들에게 정보를 알리기 위한 게시판이 겹돌담 사이에 보인다. 관덕정 앞 광장은 1970년대 후반 도로확장으로 더 넓혀졌다.
사진 속에는 수백여명의 사람들이 광장에 몰려 있다. 나뭇단을 진 사람들과 노천에서 좌판을 벌이거나 흥정을 하는 듯한 모습들, 그 중에는 아이들도 끼리끼리 놀고 있는 장면도 들어 있다. 짐을 운반할 마소는 눈에 띄지 않는다. 시장판에는 출입을 금했을지 모른다. 대부분의 상인과 손님들은 하얀옷을 입고 있다. 겐테는 제주사람들은 육지부와 달리 흰옷을 입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진속의 풍경은 그렇지 않다.
1930년대 제주를 찾았던 아베 요시시게(安倍能成)이 남긴 '탐라만필'을 보면 "제주읍내의 시장 가득히 진열돼 있는 유약을 바르지 않은 흑(黑)·적(赤)·회색(灰色)의 거칠게 구은 항아리에서는 호감이 가는 형체나 빛깔 또는 글씨를 잘 모르는 어린아이가 장난삼아 썼을 것 같은 재미있는 것들도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제주의 시장에서는 독이나 항아리 외에도 대바구니가 많다. 전라도 일대와 마찬가지로 대바구니가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일이 이 지방(제주) 만큼 많은 곳은 전 조선에 드물 것이다. 밖에 나가는 섬 여인들은 넣을 물건이 없더라도 반드시 옆구리에 대바구니를 끼고 간다."고 소개하고 있다. 사진에도 대바구니를 옆에 끼고 시장을 돌아다니는 여인들의 모습이 보인다.
성안 시장은 언제부터 열렸던 것일까. 제주성안의 경우 원래 시장은 동·서·남문 밖에 있었다. 고로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동문 밖에는 각종 잡화를 파는 시장이 있었다. 이는 동문이 육지를 잇는 관문인 건입포구와 인접한 지역이라는 특성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육지부의 물건이 들어오고 제주의 특산품이 반출되는 곳이기 때문에 시장은 가장 다양하고 번창했을 것이다. 제주 최초의 상설시장인 동문시장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관덕정 앞 광장은 시대를 달리하며 축적된 역사의 현장이다. 건물은 한층 말쑥하게 단장되고 있지만 사람사는 동네의 향기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사진=강희만기자
이처럼 성문 밖에서 이루어지던 특색있는 시장은 성문이 헐리면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다. 제주성을 안팎으로 구획지었던 성담이 헐리자 경계가 사라졌고, 상인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사는 성안으로 장터를 옮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1930년에 부산상공회의소가 펴낸 '제주도의 경제'에는 제주에 주성(州城)시장을 비롯한 삼양·애월·한림·모슬포·화순·중문·서귀·남원·성산·조천시장이 있었다고 했다. "일반 (제주)도민의 상거래는 조선의 옛 관습인 시장거래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나 인구가 많이 집단을 이루는 해안에서는 상설점포·행상인 등에 의해 행해지며 행상자와의 사이에서도 아직도 물물교환을 하는 일이 많다. 상설점포의 대부분은 잡화상으로 다음이 포목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읍내의 상설시장 1개소를 제외하고는 노천에 오두막을 세워 영업하고 있어 여러 곳에서 상설시장을 바라는 소리가 높다고 했다. 10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변해도 예나 지금에나 시장 활성화 문제는 지역의 주요 관심사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시장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끝>
[연재를 마치며]
"올해는 1910년 8월29일 일본에게 구권을 강탈 당했던 '경술국치(庚戌國恥)'가 있은지 100년이 되는 해다. 5백년의 역사를 간직한 조선왕조가 '한일합방'이라는 이름의 을사늑약에 의해 사라졌다. 온 나라가 치욕에 떨며 통곡소리 가득했지만 통치권은 일제에 넘어갔다. 뜻있는 백성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만주벌판 등지로 유랑의 길을 떠났다.(중략) '변방의 섬'인 제주 역시 일제의 질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을사늑약으로부터 시작됐다.(중략)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날을 기억하는 일은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고 있다. 과오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다."
'경술국치 100년, 제주의 원풍경을 되살린다'는 이런 의도로 기획됐다. 그러나 과연 당초의 취지에 맞게 연재 되었는 지는 의문이다.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남긴' 것 같은 자괴감이 든다. 그렇더라도 기획의도에 공감하는 독자가 있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바쁜 가운데도 그림으로 옛 제주를 복원해 준 강부언 화가에게 감사드린다.
- 1

'곧 추석인데' 제주 관급공사 임금 체불… 공정 중단
- 2

[종합] 제주 연인 살해 20대 남성 체포… 교제 폭력 신고 5건
- 3

제주서 연인 살해한 20대 남성 긴급체포
- 4

런던의 특별한 인연 찾아 제주 터잡은 강하나 씨 [제주愛]
- 5

최명동 전 기조실장,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 지명
- 6

이재명 정부 대출규제에도 외지인 제주 주택 매입 늘었다
- 7

제주 여성 4명 중 1명 "성희롱 등 성폭력 피해 경험"
- 8

제주지방 산간 제외 다시 열대야.. 오늘 최고 80㎜ 비
- 9

만 65세 이상 최대 10만원... 어르신 스포츠 이용권 2차 신청
- 10

'한풀 꺾인 무더위' 제주지방 오늘 밤부터 다시 최고 60㎜ 비
- 00:00

['경술국치 100년' 제주 원풍경을 되살린다](21·끝…
- 00:00

['경술국치 100년' 제주 원풍경을 되살린다](20)노…
- 00:00

['경술국치 100년' 제주 원풍경을 되살린다](19) 해…
- 00:00

['경술국치 100년' 제주 원풍경을 되살린다](18)제…
- 00:00

['경술국치 100년' 제주 원풍경을 되살린다](17)조…
- 00:00

['경술국치 100년' 제주 원풍경을 되살린다](16)조…
- 00:00

['경술국치 100년' 제주 원풍경을 되살린다](15)한…
- 00:00

['경술국치 100년' 제주 원풍경을 되살린다](14)명…
- 00:00

['경술국치 100년' 제주 원풍경을 되살린다](13)애…
- 00:00

['경술국치 100년' 제주 원풍경을 되살린다](12)알…















 2025.09.18(목) 23:23
2025.09.18(목)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