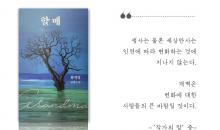[황학주의 제주살이] (45)정화수 한 그릇
- 입력 : 2022. 08.02(화) 00:00
- 최다훈 기자 orca@ihalla.com

[한라일보] 당신이 몹시도 앓던 여름밤, 의원을 부르러 가던 나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당신은 크게 아팠고, 많이 아픈 사람으로 늙어갔습니다. 아마도 어디선가 나도 늙고 힘없는 사람으로 당신의 나이가 되어야 생을 마감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작고 고색이 서린 고향집 장독대 위엔 아직도 당신이 올려둔 정화수 한 그릇이 자식들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닷가 조천마을에 자주 차를 세우고 올레 18코스 주변을 걷습니다. 용천 코스라 불릴 만큼 옛 엉물빨래터나 용천수가 잘 보존된 마을엔 골목 초입 담장가에 능소화가 붉습니다. 어제 새벽 산책길에선 작은 항아리에 용천수를 길어가는 노파를 만났습니다. 백발을 뒤로 빗어넘겼으나 몽당한 머리털은 곧추서 마치 당신이 이생에 출현한 모습이어서 놀랐습니다. 길어가는 물은 아마도 정화수로 쓰려는 적은 물 아니었을까요. 예전에 정화수는 새벽에 길은 맑은 우물물이며 장독대 위나 부뚜막에 떠놓은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렇듯 이 땅의 많은 어머니들은 집안의 평화와 무병함을 위해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빌고 치성을 드리는 용도로 썼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미명을 배경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마음과 소망은 정화수에 대한 기억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의 핏속에도 흘러갈 것입니다. 젊은 날 당신의 긴 목의 그림자, 탐스러운 머릿결의 흔들림도 할머니의 또 할머니의 정화수 한 그릇이 만든 것인지 모릅니다. 가장 간소하나 가장 정갈한 제수로서, 치성의 간절함을 상징하는 정화수는 제주에선 흔히 용천수를 사용했습니다. 이때, 새벽의 맑음과 짝지어진 정화수의 맑음에 비는 사람의 치성의 맑음이 투영되는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볼륨이 싸악 내려가듯 '당신'이 조천리 좁은 마을 골목 안으로 물항아리를 안고 발걸음을 돌릴 무렵 막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의 이 협소하고 편치 않은 우주의 한 귀퉁이에서 나는 양분을 잃은 식물처럼 흔들립니다. 당신이 흰 나리꽃처럼 잠시 내 눈앞에 보였던 새벽 미명,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마음이란 인간 자신,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일과도 통한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자주 조천마을 휑한 바닷가를 따라가는 것은 그곳에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커다란 폐허가 있으며 그 내력엔 무엇보다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무 속으로 사라져가는 당신의 뒷모습과 걸음걸이는 내게 당신과의 사랑은 사실이자 환상이며 그 둘의 그림자이자 그것들의 결합이기도 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하여 내가 세상에 없던 오래전의 시간조차 당신에게 가 멎고 나의 남은 여정은 마지막 남은 당신과의 서사이며, 시라고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당신은 언제나 여행하고 생각하며 사랑하는 내 안에 함께 있습니다. <시인>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바닷가 조천마을에 자주 차를 세우고 올레 18코스 주변을 걷습니다. 용천 코스라 불릴 만큼 옛 엉물빨래터나 용천수가 잘 보존된 마을엔 골목 초입 담장가에 능소화가 붉습니다. 어제 새벽 산책길에선 작은 항아리에 용천수를 길어가는 노파를 만났습니다. 백발을 뒤로 빗어넘겼으나 몽당한 머리털은 곧추서 마치 당신이 이생에 출현한 모습이어서 놀랐습니다. 길어가는 물은 아마도 정화수로 쓰려는 적은 물 아니었을까요. 예전에 정화수는 새벽에 길은 맑은 우물물이며 장독대 위나 부뚜막에 떠놓은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렇듯 이 땅의 많은 어머니들은 집안의 평화와 무병함을 위해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빌고 치성을 드리는 용도로 썼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미명을 배경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마음과 소망은 정화수에 대한 기억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의 핏속에도 흘러갈 것입니다. 젊은 날 당신의 긴 목의 그림자, 탐스러운 머릿결의 흔들림도 할머니의 또 할머니의 정화수 한 그릇이 만든 것인지 모릅니다. 가장 간소하나 가장 정갈한 제수로서, 치성의 간절함을 상징하는 정화수는 제주에선 흔히 용천수를 사용했습니다. 이때, 새벽의 맑음과 짝지어진 정화수의 맑음에 비는 사람의 치성의 맑음이 투영되는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볼륨이 싸악 내려가듯 '당신'이 조천리 좁은 마을 골목 안으로 물항아리를 안고 발걸음을 돌릴 무렵 막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의 이 협소하고 편치 않은 우주의 한 귀퉁이에서 나는 양분을 잃은 식물처럼 흔들립니다. 당신이 흰 나리꽃처럼 잠시 내 눈앞에 보였던 새벽 미명,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마음이란 인간 자신,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일과도 통한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자주 조천마을 휑한 바닷가를 따라가는 것은 그곳에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커다란 폐허가 있으며 그 내력엔 무엇보다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무 속으로 사라져가는 당신의 뒷모습과 걸음걸이는 내게 당신과의 사랑은 사실이자 환상이며 그 둘의 그림자이자 그것들의 결합이기도 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하여 내가 세상에 없던 오래전의 시간조차 당신에게 가 멎고 나의 남은 여정은 마지막 남은 당신과의 서사이며, 시라고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당신은 언제나 여행하고 생각하며 사랑하는 내 안에 함께 있습니다. <시인>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02:30

[열린마당] 택배 상자에 적힌 소비의 방향
- 01:00

[김봉희의 월요논단] SNS, 안전한 진입로가 필요…
- 08:40

[열린마당] 도민의 눈으로 행정을 보다
- 02:30

[열린마당] 제주, 청년이 남고 싶은 섬이 되려면
- 01:30

[송규진의 현장시선] 2026년, 제주 교통정책의 대…
- 03:00

[열린마당] 견위수명(見危授命)의 숭고한 정신을…
- 02:00

[이성용의 목요담론] 제주를 유토피아(utopia)로
- 00:00

[열린마당] 아파트 화재안전, 가장 중요한 것은 …
- 21:30

[열린마당] 함께하는 일자리로 희망을 잇는 제주…
- 01:00

[문영인의 한라시론] 비닐하우스 사후관리기간 1…















 2026.01.12(월) 17:32
2026.01.12(월)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