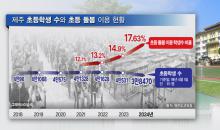[제주바다와 문학] (51.끝) 현기영 장편 '바람 타는 섬' ③
- 입력 : 2020. 05.01(금) 00:00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1'(2009)에 실린 1980년대 중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해안의 해초 건지는 해녀들.
"우리가 캔 전복, 왜 우리가 못 먹나"
거친 외세의 파도에 맞선
‘해녀 항쟁'은 4·3의 전사
제주바다의 꿈은 진행형
파래와 톳나물은 해녀들의 주식이었다. 목이 칵칵 메이는 시퍼런 파래밥, 불그죽죽한 톳밥을 먹으며 춘궁기를 견뎠다. 겨울 물질을 끝내고 불턱으로 돌아오면 점심 대용으로 닭창자같이 우툴두툴하게 생긴 미역귀를 구워 먹으며 허기를 채웠다. '출가배'에 오른 해녀들의 밥바구니엔 청좁쌀밥 한가운데 달걀 노른자위처럼 된장 보시기가 박힌 게 전부다.
일제강점기 해녀들이 먹었던 음식은 그랬다. 현기영의 장편 '바람타는 섬'(1989)은 오늘날 제주 바닷가 마을의 '해녀 식당'에서 파는 '해녀 음식'에 대한 통념을 깬다.
그 시절 갯가엔 고등어, 전갱이 같은 싱싱한 물고기들이 집더미처럼 쌓였다. 하지만 생선 배를 따는 아낙네들이 일당 대신에 얻어가는 건 물고기 내장이다. 물고기 내장으로 담근 젓갈은 멸치젓 못지 않는 훌륭한 밥반찬이 되어줬다. 소설엔 "갓장이(갓 만드는 사람) 헌 갓 쓰고, 무당 남 빌어 굿하는 격으로 자신이 잡은 물고기, 소라, 전복을 못 먹는 것이 해촌 백성들의 신세. 그것을 팔아야 모자란 양식을 구할 수 있는지라 생선 한 손 먹기 어려운 것"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소설 속 해녀들이 현실에 눈을 뜨는 배경 중 하나엔 음식이 주는 절망감이 있었다. 군중집회에서 주인공 여옥은 물질을 하다 너무 배가 고파 자신이 직접 수확한 전복을 몰래 먹다가 '어멍'한테 들켜서 꾸중듣던 기억을 꺼내놓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우리가 캔 전복 우리가 못 먹고, 우리가 캔 우무풀로 만든 구리무 우리가 못 씁네다. 우리가 면화를 키워도, 우리가 그걸로 옥양목 짜도 우리는 옷 한벌 제대로 못 사 입습네다."
작가는 소설 뒤에 붙인 글에서 이 작품을 제주4·3의 전사(前史)를 탐구하려는 의도로 썼다고 적었다. 그는 "나는 4·3항쟁이 제주도에 특유한 항쟁의 전통에다 급진적 이념이 접목되어 발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하나"라며 "육지부와 격절되어 있어서 유달리 공동체 의식이 강한 도민은 예로부터 거친 외세의 파도에 공동체적으로 대처하는 항쟁이 잇따랐다"고 했다. 단행본 발간 시점으로 4·3을 그린 '순이삼촌'(1979), 방성칠·이재수의 난을 다룬 '변방에 우짖는 새'(1983)에 이은 '바람 타는 섬'은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섬의 역사를 문학으로 또 한 번 천착했다.
72주년 4·3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다"고 했다. 제주바다의 꿈은 잠시 멈췄을 뿐이다. 이름없는 제주 백성들, 해녀들의 오래된 열망이 저 바다 위를 항해할 날이 머잖아 오리라. <끝> 진선희기자
거친 외세의 파도에 맞선
‘해녀 항쟁'은 4·3의 전사
제주바다의 꿈은 진행형
파래와 톳나물은 해녀들의 주식이었다. 목이 칵칵 메이는 시퍼런 파래밥, 불그죽죽한 톳밥을 먹으며 춘궁기를 견뎠다. 겨울 물질을 끝내고 불턱으로 돌아오면 점심 대용으로 닭창자같이 우툴두툴하게 생긴 미역귀를 구워 먹으며 허기를 채웠다. '출가배'에 오른 해녀들의 밥바구니엔 청좁쌀밥 한가운데 달걀 노른자위처럼 된장 보시기가 박힌 게 전부다.
일제강점기 해녀들이 먹었던 음식은 그랬다. 현기영의 장편 '바람타는 섬'(1989)은 오늘날 제주 바닷가 마을의 '해녀 식당'에서 파는 '해녀 음식'에 대한 통념을 깬다.
그 시절 갯가엔 고등어, 전갱이 같은 싱싱한 물고기들이 집더미처럼 쌓였다. 하지만 생선 배를 따는 아낙네들이 일당 대신에 얻어가는 건 물고기 내장이다. 물고기 내장으로 담근 젓갈은 멸치젓 못지 않는 훌륭한 밥반찬이 되어줬다. 소설엔 "갓장이(갓 만드는 사람) 헌 갓 쓰고, 무당 남 빌어 굿하는 격으로 자신이 잡은 물고기, 소라, 전복을 못 먹는 것이 해촌 백성들의 신세. 그것을 팔아야 모자란 양식을 구할 수 있는지라 생선 한 손 먹기 어려운 것"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소설 속 해녀들이 현실에 눈을 뜨는 배경 중 하나엔 음식이 주는 절망감이 있었다. 군중집회에서 주인공 여옥은 물질을 하다 너무 배가 고파 자신이 직접 수확한 전복을 몰래 먹다가 '어멍'한테 들켜서 꾸중듣던 기억을 꺼내놓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우리가 캔 전복 우리가 못 먹고, 우리가 캔 우무풀로 만든 구리무 우리가 못 씁네다. 우리가 면화를 키워도, 우리가 그걸로 옥양목 짜도 우리는 옷 한벌 제대로 못 사 입습네다."
작가는 소설 뒤에 붙인 글에서 이 작품을 제주4·3의 전사(前史)를 탐구하려는 의도로 썼다고 적었다. 그는 "나는 4·3항쟁이 제주도에 특유한 항쟁의 전통에다 급진적 이념이 접목되어 발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하나"라며 "육지부와 격절되어 있어서 유달리 공동체 의식이 강한 도민은 예로부터 거친 외세의 파도에 공동체적으로 대처하는 항쟁이 잇따랐다"고 했다. 단행본 발간 시점으로 4·3을 그린 '순이삼촌'(1979), 방성칠·이재수의 난을 다룬 '변방에 우짖는 새'(1983)에 이은 '바람 타는 섬'은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섬의 역사를 문학으로 또 한 번 천착했다.
72주년 4·3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다"고 했다. 제주바다의 꿈은 잠시 멈췄을 뿐이다. 이름없는 제주 백성들, 해녀들의 오래된 열망이 저 바다 위를 항해할 날이 머잖아 오리라. <끝> 진선희기자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7:18

첫발 뗀지 7년째... '제주어 대사전' 편찬 부지하…
- 14:40

일상에서 문화예술공연 향유... '新탐라문화가 …
- 14:14

제주목 관아 야간 관광명소 자리매김 박차
- 11:26

"신의 정원"으로 봄나들이... 이달 27~28일 제21회 …
- 10:35

5월 광주의 아픔 제주 예술인과 보듬는다
- 00:00

[황학주의 詩읽는 화요일] (64)쾰른성당-곡두8-김…
- 17:36

온전히 모습 드러낸 '이건희 컬렉션' 제주 특별…
- 14:29

제50회 제주도사진대전 대상 최영철의 '쇠머리대…
- 15:07

발달장애인 부모의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 "함…
- 14:04

예비예술가 키우는 청년장애예술가랩 '두 번째 …














 2024.04.23(화) 22:30
2024.04.23(화)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