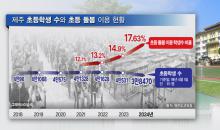[제주바다와 문학] (49) 현기영 장편 '바람 타는 섬'
“저 바다 물결 위 시달리는 잠녀들”
- 입력 : 2020. 04.17(금) 00:00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지난 1월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 일대에서 열린 제88회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거리행진을 하며 항일운동을 재연하고 있다.
1932년 ‘잠녀항일투쟁’ 그려
해녀사회 덮친 검은 손 맞서
공동체 결속 다지는 노래들
1932년 '잠녀항일투쟁'을 다룬 제주출신 현기영 작가의 장편소설 '바람 타는 섬'(1989)엔 무수한 노래가 흐른다. 대개 여자들이 가창자로 등장하지만 남녀가 부르는 노래도 있다. 맷돌질하며 홀로 읊는 소리를 제외하면 그 노래들은 메기고 받으며 합창으로 바람 따라 퍼진다.
이른 새벽, 구좌 하도리 포구에 출향 해녀들이 모여든다. 그들은 가랑잎 같은 풍선에 의지해 바다 건너 울산으로 향한다. 마파람(남풍)을 타고 이대로 미끄러져 가면 거문도를 시작으로 다도해를 휘돌아 사흘 뒤쯤 목적지에 닿겠지만 샛바람(동풍)을 만나면 열흘도 넘게 걸릴 수 있다.
'바람 타는 섬'의 해녀들인 여옥, 영녀, 정심, 순주, 도아는 다섯 척의 돛단배 중 하나에 몸을 싣는다. 수시로 물에 드는 그들이지만 그때 비로소 바다에 산다는 걸 실감한다. 배가 포구에서 멀어지는 동안 한라산 발밑에 여며 들어간 오름이며 해변이 눈에 들어온다. '아, 내가 섬에서 태어났구나' 하는 새삼스러운 생각에 빠지는 것도 잠시, 화탈섬이 빠꼼 얼굴을 내밀면 바다가 불안스레 뛰논다. 마파람의 기운이 약해지자 해녀들의 입에서 일제히 '이어싸나!'가 터져 나오고 그에 맞춰 역군들이 젓는 노가 동시에 움직인다. '이어싸 이어싸나/ 우리 배는 잘도 간다/ 솔솔 가는 건 소나무배/ 느릿느릿 가는 건 누룩나무배/ 우리 배는 쑥대나무배라/ 쑥쑥쑥쑥 잘도 간다'는 뱃노래는 '넘어가네 넘어가네/ 사수바다 넘어가네'로 이르며 힘을 돋운다.
동일집단에서 소속되어 함께 일하고 노래하는 일은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회문화적 행위(양영자의 '제주학으로서 제주민요')다. '바람 타는 섬'에 담긴 노동요 등 일련의 노래는 고단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면서 해녀 사회가 보여주는 이상적 공동체의 원형을 드러내는 장치로 쓰인다. 소설은 섬 밖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온 아나키스트의 말을 빌려, 알몸으로 자연과 밀착하며 살아가는 해녀들은 바다밭의 공동 소유, 공동 관리를 통해 평등사회를 만들고 권력의 억압을 받지 않은 개인들의 상호 부조로 공동체를 꾸려간다고 했다.
항일투쟁은 사람이 자연과 일체를 이루고, 사람과 사람이 일체를 이룬 해녀 사회에 검은 손이 덮치면서 벌어졌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평등의 바다가 착취와 원한의 바다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장터 거리에 나선 세화 해녀들은 그 사실을 차츰 깨달아가며 압제자 앞에서 울분의 잠녀애가를 토해낸다. '우리들은 제주도의 가이없는 잠녀들/ 비참한 살림살이 세상이 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바람 부는 날에도/ 저 바다 물결 위에 시달리는 몸'.
진선희기자
해녀사회 덮친 검은 손 맞서
공동체 결속 다지는 노래들
1932년 '잠녀항일투쟁'을 다룬 제주출신 현기영 작가의 장편소설 '바람 타는 섬'(1989)엔 무수한 노래가 흐른다. 대개 여자들이 가창자로 등장하지만 남녀가 부르는 노래도 있다. 맷돌질하며 홀로 읊는 소리를 제외하면 그 노래들은 메기고 받으며 합창으로 바람 따라 퍼진다.
이른 새벽, 구좌 하도리 포구에 출향 해녀들이 모여든다. 그들은 가랑잎 같은 풍선에 의지해 바다 건너 울산으로 향한다. 마파람(남풍)을 타고 이대로 미끄러져 가면 거문도를 시작으로 다도해를 휘돌아 사흘 뒤쯤 목적지에 닿겠지만 샛바람(동풍)을 만나면 열흘도 넘게 걸릴 수 있다.
'바람 타는 섬'의 해녀들인 여옥, 영녀, 정심, 순주, 도아는 다섯 척의 돛단배 중 하나에 몸을 싣는다. 수시로 물에 드는 그들이지만 그때 비로소 바다에 산다는 걸 실감한다. 배가 포구에서 멀어지는 동안 한라산 발밑에 여며 들어간 오름이며 해변이 눈에 들어온다. '아, 내가 섬에서 태어났구나' 하는 새삼스러운 생각에 빠지는 것도 잠시, 화탈섬이 빠꼼 얼굴을 내밀면 바다가 불안스레 뛰논다. 마파람의 기운이 약해지자 해녀들의 입에서 일제히 '이어싸나!'가 터져 나오고 그에 맞춰 역군들이 젓는 노가 동시에 움직인다. '이어싸 이어싸나/ 우리 배는 잘도 간다/ 솔솔 가는 건 소나무배/ 느릿느릿 가는 건 누룩나무배/ 우리 배는 쑥대나무배라/ 쑥쑥쑥쑥 잘도 간다'는 뱃노래는 '넘어가네 넘어가네/ 사수바다 넘어가네'로 이르며 힘을 돋운다.
동일집단에서 소속되어 함께 일하고 노래하는 일은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회문화적 행위(양영자의 '제주학으로서 제주민요')다. '바람 타는 섬'에 담긴 노동요 등 일련의 노래는 고단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면서 해녀 사회가 보여주는 이상적 공동체의 원형을 드러내는 장치로 쓰인다. 소설은 섬 밖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온 아나키스트의 말을 빌려, 알몸으로 자연과 밀착하며 살아가는 해녀들은 바다밭의 공동 소유, 공동 관리를 통해 평등사회를 만들고 권력의 억압을 받지 않은 개인들의 상호 부조로 공동체를 꾸려간다고 했다.
항일투쟁은 사람이 자연과 일체를 이루고, 사람과 사람이 일체를 이룬 해녀 사회에 검은 손이 덮치면서 벌어졌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평등의 바다가 착취와 원한의 바다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장터 거리에 나선 세화 해녀들은 그 사실을 차츰 깨달아가며 압제자 앞에서 울분의 잠녀애가를 토해낸다. '우리들은 제주도의 가이없는 잠녀들/ 비참한 살림살이 세상이 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바람 부는 날에도/ 저 바다 물결 위에 시달리는 몸'.
진선희기자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7:18

첫발 뗀지 7년째... '제주어 대사전' 편찬 부지하…
- 14:40

일상에서 문화예술공연 향유... '新탐라문화가 …
- 14:14

제주목 관아 야간 관광명소 자리매김 박차
- 11:26

"신의 정원"으로 봄나들이... 이달 27~28일 제21회 …
- 10:35

5월 광주의 아픔 제주 예술인과 보듬는다
- 00:00

[황학주의 詩읽는 화요일] (64)쾰른성당-곡두8-김…
- 17:36

온전히 모습 드러낸 '이건희 컬렉션' 제주 특별…
- 14:29

제50회 제주도사진대전 대상 최영철의 '쇠머리대…
- 15:07

발달장애인 부모의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 "함…
- 14:04

예비예술가 키우는 청년장애예술가랩 '두 번째 …














 2024.04.23(화) 22:30
2024.04.23(화)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