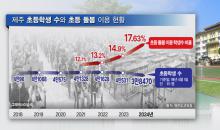[제주바다와 문학] (46)리사 시의 장편 ‘해녀들의 섬’ ②
"바다는 삶의 중심… 늘 그 자리에"
- 입력 : 2020. 03.27(금) 00:00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물질 작업을 하고 있는 제주 해녀. 리사 시는 해녀공동체를 이상적인 사회로 그려냈다.
강인함 너머 핍박받는 존재
“여자로 나느니 소가 낫다”
해녀공동체 이상적 사회로
우리말로 번역되어 나온 미국 리사 시(Lisa See)의 장편소설 '해녀들의 섬(The Island of Sea Women)'(2019)은 작가가 제주 땅을 직접 밟고 단기간에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온갖 자료를 열심히 뒤져 읽으며 쓰여졌다. 바깥에 정보가 거의 드러나지 않은 지역이라면 소설을 통해 더듬어가는 이야기들이 새로울 수 있겠지만 제주는 '은둔의 섬'이 아니다. 제주4·3, 해녀문화, 한라산, 돌담 등 이 섬이 안은 유산들은 여러 경로로 알려져 왔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르 클레지오처럼 리사 시 보다 앞서 제주를 다녀간 뒤 기고한 글이나 창작한 문학 작품도 적지 않다.
'해녀들의 섬'은 작정하고 제주를 말하려 한다. 거기엔 일제강점기 이래 우리가 아는, 제주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다 들어있다. 삼성혈에서 영등굿까지 갖가지 역사·문화 유산들도 녹여냈다. 김영숙과 한미자를 주인공으로 해녀와 4·3을 두 기둥으로 삼아 해녀박물관이 있는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집단학살이 일어난 조천읍 북촌리를 주요 배경으로 했다는 점도 의도적이다. 두 마을을 오가며 제주의 비극을 극적으로 풀어내려 했다.
다소 진부해보이는 설정 속에 작가는 여성주의 시각으로 해녀의 존재를 파고들었다. 해녀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에 현실감이 떨어지긴 하나 작가는 '강인함'으로 포장된 해녀 이미지 너머에 핍박받는 군상들을 봤다. 해녀로 대표되는 제주 여자들의 생애는 작가가 소설 속에 때때로 끌어다 인용하는 속담 중 하나인 '여자로 태어나느니 소로 태어나는 것이 낫다'에 압축되어 있다.
불턱에 모인 해녀들이 한마디씩 한다. "우리 남편은 내가 번 돈을 술로 다 탕진해버려요." "우리 남편이 하는 일이라고는 정자나무 아래서 자기가 무슨 성공한 농부라도 되는 양 유교 사상에 대해 논하고 앉아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 남편이 작은마누라를 집에 데려와도 내버려둬야 했어요." 해녀들은 집안의 가장 노릇을 했지만 미자처럼 더러 폭력 남편에 시달렸다. 숨이 차는 물질로 해산물을 캐내 어촌계를 꾸려가지만 정작 조직을 이끄는 자리는 남자들에게 돌아갔다.
소설 속 바다는 해녀들에게 '여신 설문대할망'으로 은유되는 한라산과 동격이다. "바다는 그녀에게 삶의 중심이었다.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녀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가기도 했지만, 바다는 한 번도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작가는 너른 바다에서 인생을 배우는 해녀공동체를 이상적인 사회로 묘사했다. 바다에 갈 때면 해녀들은 일과 위험을 똑같이 나눠 가진다. 함께 수확하고, 함께 고르고, 함께 판매한다. 바다는 공동의 것이기 때문이다. '해녀들의 섬' 결말에서 영숙이 먼 곳에서 온 증손녀를 바다로 이끄는 장면은 미래 세대의 공동체 회복에 대한 염원과 닿아 있다.
진선희기자
“여자로 나느니 소가 낫다”
해녀공동체 이상적 사회로
우리말로 번역되어 나온 미국 리사 시(Lisa See)의 장편소설 '해녀들의 섬(The Island of Sea Women)'(2019)은 작가가 제주 땅을 직접 밟고 단기간에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온갖 자료를 열심히 뒤져 읽으며 쓰여졌다. 바깥에 정보가 거의 드러나지 않은 지역이라면 소설을 통해 더듬어가는 이야기들이 새로울 수 있겠지만 제주는 '은둔의 섬'이 아니다. 제주4·3, 해녀문화, 한라산, 돌담 등 이 섬이 안은 유산들은 여러 경로로 알려져 왔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르 클레지오처럼 리사 시 보다 앞서 제주를 다녀간 뒤 기고한 글이나 창작한 문학 작품도 적지 않다.
'해녀들의 섬'은 작정하고 제주를 말하려 한다. 거기엔 일제강점기 이래 우리가 아는, 제주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다 들어있다. 삼성혈에서 영등굿까지 갖가지 역사·문화 유산들도 녹여냈다. 김영숙과 한미자를 주인공으로 해녀와 4·3을 두 기둥으로 삼아 해녀박물관이 있는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집단학살이 일어난 조천읍 북촌리를 주요 배경으로 했다는 점도 의도적이다. 두 마을을 오가며 제주의 비극을 극적으로 풀어내려 했다.
다소 진부해보이는 설정 속에 작가는 여성주의 시각으로 해녀의 존재를 파고들었다. 해녀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에 현실감이 떨어지긴 하나 작가는 '강인함'으로 포장된 해녀 이미지 너머에 핍박받는 군상들을 봤다. 해녀로 대표되는 제주 여자들의 생애는 작가가 소설 속에 때때로 끌어다 인용하는 속담 중 하나인 '여자로 태어나느니 소로 태어나는 것이 낫다'에 압축되어 있다.
불턱에 모인 해녀들이 한마디씩 한다. "우리 남편은 내가 번 돈을 술로 다 탕진해버려요." "우리 남편이 하는 일이라고는 정자나무 아래서 자기가 무슨 성공한 농부라도 되는 양 유교 사상에 대해 논하고 앉아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 남편이 작은마누라를 집에 데려와도 내버려둬야 했어요." 해녀들은 집안의 가장 노릇을 했지만 미자처럼 더러 폭력 남편에 시달렸다. 숨이 차는 물질로 해산물을 캐내 어촌계를 꾸려가지만 정작 조직을 이끄는 자리는 남자들에게 돌아갔다.
소설 속 바다는 해녀들에게 '여신 설문대할망'으로 은유되는 한라산과 동격이다. "바다는 그녀에게 삶의 중심이었다.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녀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가기도 했지만, 바다는 한 번도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작가는 너른 바다에서 인생을 배우는 해녀공동체를 이상적인 사회로 묘사했다. 바다에 갈 때면 해녀들은 일과 위험을 똑같이 나눠 가진다. 함께 수확하고, 함께 고르고, 함께 판매한다. 바다는 공동의 것이기 때문이다. '해녀들의 섬' 결말에서 영숙이 먼 곳에서 온 증손녀를 바다로 이끄는 장면은 미래 세대의 공동체 회복에 대한 염원과 닿아 있다.
진선희기자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7:18

첫발 뗀지 7년째... '제주어 대사전' 편찬 부지하…
- 14:40

일상에서 문화예술공연 향유... '新탐라문화가 …
- 14:14

제주목 관아 야간 관광명소 자리매김 박차
- 11:26

"신의 정원"으로 봄나들이... 이달 27~28일 제21회 …
- 10:35

5월 광주의 아픔 제주 예술인과 보듬는다
- 00:00

[황학주의 詩읽는 화요일] (64)쾰른성당-곡두8-김…
- 17:36

온전히 모습 드러낸 '이건희 컬렉션' 제주 특별…
- 14:29

제50회 제주도사진대전 대상 최영철의 '쇠머리대…
- 15:07

발달장애인 부모의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 "함…
- 14:04

예비예술가 키우는 청년장애예술가랩 '두 번째 …














 2024.04.23(화) 19:30
2024.04.23(화)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