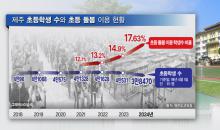[좌정묵의 하루를 시작하며] 마취(痲醉) 권하는 사회
- 입력 : 2019. 12.04(수)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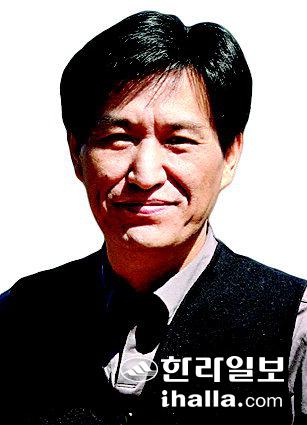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을 앞두고 있던 말로리(George Mallory)는 한 강연에서 위험해서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산에 오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산이 그곳에 있기 때문(Because it is there)'이라고 대답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산에 오른다. 왜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선택하는 것일까. 추동감소이론에 따르면 긴장과 각성을 피하고 편안함을 추구한다고 하지 않는가.
사고나 질병으로 대여섯 시간 수술을 받아본 사람들은 수술 전후의 고통을 알고 있다. 수술 후의 고통은 비록 무통 주사를 맞지 않는다 해도 심하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왜냐하면 상태가 호전되고 치료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다만 수술을 통해 치료 과정을 거쳤다고 해도 상태가 반드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도 심리적 기준으로만 본다면 이전보다 고통이 덜하다고 한다.
이런 치료의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을 지우기 위해 마취를 하게 된다. 마취는 반드시 각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해와 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고 마취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이들도 더러 있다. 이 경우 본인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잠에 빠질 수도 있지만, 가족과 주위 사람들은 육체적 피로는 물론이려니와 정신적 고통을 받기도 한다.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경우도 많다.
고통은 반드시 육체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것만도 아니다. 고통에 시달리는 이를 보면서 심한 통증을 느낄 수도 있다. 지진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가난과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거나 또는 아무런 죄 없이 테러를 당해 어린 생명들까지 잃고 울부짖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가질 고통처럼 슬픔에 빠지기도 한다. 고통의 인지와 공감은 우리의 뇌가 각성인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겨울이 이미 싸늘하게 스며들고 있고 무엇보다 따뜻함이 그리운 때가 됐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마취를 권하는 것처럼 고통을 외면하면서 지내왔다. 한 개인과 가족은 물론이려니와 계층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고통 등을 외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조롱하기까지 한다. 자신의 통증은 물론이고 타인의 통증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마취 상태와 같다. 우리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1920년대를 풍자한 현진건의 '술 권하는 사회'에서 백 년쯤 지난 오늘, 우리 사회는 흥청거리는 것을 넘어 '마취를 권하는 사회'로 치닫고 있는지도 모른다. 도청과 도의회 사이의 길을 하루에 한 번씩 지나면서도 저녁이면 시청 앞 골목을 찾고, 휴일이면 그 길을 지나치며 한라수목원으로 달려간다. 통증과 슬픔을 인지하려는 뇌를 스스로 제어하고 외부의 자극들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미국의 심리학자 역스와 다슨은 최적의 각성일 때 사람들의 수행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각성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너무 긴장이 된다는 의미이고, 각성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은 졸리고 집중이 안 된다는 뜻이다. 달리 말한다면 마취가 무통이라면 각성은 통증에 가깝다. 오늘은 상고대가 내린 백록담을 바라보면서 가을 풀들이 이운, 겨울 들길을 걸어보고 싶다. <좌정묵 시인·문학평론가>
사고나 질병으로 대여섯 시간 수술을 받아본 사람들은 수술 전후의 고통을 알고 있다. 수술 후의 고통은 비록 무통 주사를 맞지 않는다 해도 심하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왜냐하면 상태가 호전되고 치료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다만 수술을 통해 치료 과정을 거쳤다고 해도 상태가 반드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도 심리적 기준으로만 본다면 이전보다 고통이 덜하다고 한다.
이런 치료의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을 지우기 위해 마취를 하게 된다. 마취는 반드시 각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해와 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고 마취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이들도 더러 있다. 이 경우 본인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잠에 빠질 수도 있지만, 가족과 주위 사람들은 육체적 피로는 물론이려니와 정신적 고통을 받기도 한다.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경우도 많다.
고통은 반드시 육체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것만도 아니다. 고통에 시달리는 이를 보면서 심한 통증을 느낄 수도 있다. 지진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가난과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거나 또는 아무런 죄 없이 테러를 당해 어린 생명들까지 잃고 울부짖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가질 고통처럼 슬픔에 빠지기도 한다. 고통의 인지와 공감은 우리의 뇌가 각성인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겨울이 이미 싸늘하게 스며들고 있고 무엇보다 따뜻함이 그리운 때가 됐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마취를 권하는 것처럼 고통을 외면하면서 지내왔다. 한 개인과 가족은 물론이려니와 계층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고통 등을 외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조롱하기까지 한다. 자신의 통증은 물론이고 타인의 통증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마취 상태와 같다. 우리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1920년대를 풍자한 현진건의 '술 권하는 사회'에서 백 년쯤 지난 오늘, 우리 사회는 흥청거리는 것을 넘어 '마취를 권하는 사회'로 치닫고 있는지도 모른다. 도청과 도의회 사이의 길을 하루에 한 번씩 지나면서도 저녁이면 시청 앞 골목을 찾고, 휴일이면 그 길을 지나치며 한라수목원으로 달려간다. 통증과 슬픔을 인지하려는 뇌를 스스로 제어하고 외부의 자극들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미국의 심리학자 역스와 다슨은 최적의 각성일 때 사람들의 수행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각성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너무 긴장이 된다는 의미이고, 각성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은 졸리고 집중이 안 된다는 뜻이다. 달리 말한다면 마취가 무통이라면 각성은 통증에 가깝다. 오늘은 상고대가 내린 백록담을 바라보면서 가을 풀들이 이운, 겨울 들길을 걸어보고 싶다. <좌정묵 시인·문학평론가>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1:52

[열린마당] 전자레인지 사용 용기 어떤 제품이 …
- 00:00

[홍인숙의 문연路에서] “한 뼘의 턱을 넘어 공…
- 00:00

[열린마당] 전염성 높은 백일해 유행 주의
- 00:00

[열린마당] 누웨마루 '차 없는 거리'를 아시나요
- 00:00

[김준기의 문화광장] 한국의 비엔날레 30년
- 00:00

[열린마당]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 00:00

[열린마당] “바당에 나가신 삼춘들, 부디 괴양 …
- 00:00

[열린마당] 부주의로 인한 산불, 예방이 최선이…
- 00:00

[김태일의 월요논단] 도시 대개조가 도시민의 삶…
- 00:00

[열린마당] 제주도 AI 아나운서 '제이나'를 아시…














 2024.04.23(화) 22:30
2024.04.23(화)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