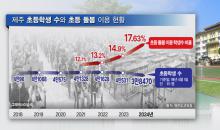[허상문의 에세이로 읽는 세상] 불빛
- 입력 : 2018. 07.25(수)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어린 시절 밤늦도록 강가 언덕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명멸하는 불빛을 바라보면서 놀았던 기억이 난다. 공기가 워낙 청정했던지라 주변에서는 반딧불이 날아다니고, 강 건너편에서는 띄엄띄엄 푸른 도깨비불이 반짝인다.
외딴집에서 저 혼자 외롭게 불을 밝히고 있는 불빛, 앞뒤로 나란히 어깨동무한 동네 이웃집의 불빛, 마을 저 멀리 상가에서는 조등이 문상객들을 밝혀준다. 마을의 불빛을 헤아리거나 집집마다 간직하고 있는 등불로 동네의 집들을 하나하나 알아맞히기도 한다.
그런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안아주고 있는 빛은 밤하늘의 별빛이다. 우리는 별을 바라보며 알고 있는 별 이야기를 모두 다 쏟아낸다. 북두칠성, 북극성, 큰곰자리, 작은 곰자리….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별들 중에서 내가 바라보는 별 하나,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별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었다. '어린 왕자'를 기억하면서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별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깊어가는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빛은 우리의 귀가를 재촉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불빛은 기다림의 대명사이며 희망이었다. 늦은 가장을 기다리는 가족, 수험공부에 지친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 기다림을 위한 '빛'이라는 글자는 얼마나 포근하고 따스한가. 또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의 '빛'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견뎌 낼 수 있다. 빛은 기다림과 희망의 동의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기독교의 역사는 빛의 역사에 다름 아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찾아간 곳은 바로 멀리서 비추어진 불빛 때문이었다. 예수의 복음은 마음의 빛을 따라 멀고도 험난한 길을 찾아갔다, 빛의 순례가 없었다면 기독교가 우리에게 마음의 등불을 밝힐 수 있었을까.
어느 고요한 사찰에서 우리를 엄숙하게 만드는 것은 사원 경내에 자리하고 있는 석등(石燈)이다. 사원의 경내에 불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둔 등불은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해준다. 밤이 되어 적막만이 가득한 사찰의 대웅전 앞 석등에 서면, 부처님의 자비는 우리의 가슴 속으로 깊이 스며든다.
철학자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고 묻는다. 과연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일까. 사람 같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등불을 들고 다니면 혹시라도 사람다운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인가. 아니면 자신만의 소중한 행복을 아끼면서 남에게 그 행복의 빛을 나누어 주고자 함인가.
어두운 골목길, 어릴 때는 마냥 겁 없이 뛰어다니던 길이 이제는 왠지 음산하고 무섭기만 하다. 저 어두운 골목길을 훤하게 밝혀줄 불빛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옛날에는 밤하늘의 별과 달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었지만, 이제는 길가의 가로등만이 우리의 길을 밝혀준다. 밤하늘의 별빛과 달빛 속에는 여전히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담겨 있지만, 가로등불에는 낮 동안의 소란과 혼잡이 그대로 남아 있다.
우리들에게서 불빛이 자꾸 사라져 가고 있다. 희망의 불빛, 사랑의 불빛, 그리움의 불빛…. 불빛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나면 이 세상에는 어둠과 고통만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가슴 속에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음의 등불을 하나 둘씩 밝혀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불빛이 우리 자신을 밝히고, 또한 이웃과 세상을 밝히는 불빛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문학평론가·영남대교수>
외딴집에서 저 혼자 외롭게 불을 밝히고 있는 불빛, 앞뒤로 나란히 어깨동무한 동네 이웃집의 불빛, 마을 저 멀리 상가에서는 조등이 문상객들을 밝혀준다. 마을의 불빛을 헤아리거나 집집마다 간직하고 있는 등불로 동네의 집들을 하나하나 알아맞히기도 한다.
그런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안아주고 있는 빛은 밤하늘의 별빛이다. 우리는 별을 바라보며 알고 있는 별 이야기를 모두 다 쏟아낸다. 북두칠성, 북극성, 큰곰자리, 작은 곰자리….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별들 중에서 내가 바라보는 별 하나,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별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었다. '어린 왕자'를 기억하면서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별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깊어가는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빛은 우리의 귀가를 재촉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불빛은 기다림의 대명사이며 희망이었다. 늦은 가장을 기다리는 가족, 수험공부에 지친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 기다림을 위한 '빛'이라는 글자는 얼마나 포근하고 따스한가. 또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의 '빛'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견뎌 낼 수 있다. 빛은 기다림과 희망의 동의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기독교의 역사는 빛의 역사에 다름 아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찾아간 곳은 바로 멀리서 비추어진 불빛 때문이었다. 예수의 복음은 마음의 빛을 따라 멀고도 험난한 길을 찾아갔다, 빛의 순례가 없었다면 기독교가 우리에게 마음의 등불을 밝힐 수 있었을까.
어느 고요한 사찰에서 우리를 엄숙하게 만드는 것은 사원 경내에 자리하고 있는 석등(石燈)이다. 사원의 경내에 불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둔 등불은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해준다. 밤이 되어 적막만이 가득한 사찰의 대웅전 앞 석등에 서면, 부처님의 자비는 우리의 가슴 속으로 깊이 스며든다.
철학자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고 묻는다. 과연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일까. 사람 같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등불을 들고 다니면 혹시라도 사람다운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인가. 아니면 자신만의 소중한 행복을 아끼면서 남에게 그 행복의 빛을 나누어 주고자 함인가.
어두운 골목길, 어릴 때는 마냥 겁 없이 뛰어다니던 길이 이제는 왠지 음산하고 무섭기만 하다. 저 어두운 골목길을 훤하게 밝혀줄 불빛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옛날에는 밤하늘의 별과 달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었지만, 이제는 길가의 가로등만이 우리의 길을 밝혀준다. 밤하늘의 별빛과 달빛 속에는 여전히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담겨 있지만, 가로등불에는 낮 동안의 소란과 혼잡이 그대로 남아 있다.
우리들에게서 불빛이 자꾸 사라져 가고 있다. 희망의 불빛, 사랑의 불빛, 그리움의 불빛…. 불빛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나면 이 세상에는 어둠과 고통만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가슴 속에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음의 등불을 하나 둘씩 밝혀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불빛이 우리 자신을 밝히고, 또한 이웃과 세상을 밝히는 불빛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문학평론가·영남대교수>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1:52

[열린마당] 전자레인지 사용 용기 어떤 제품이 …
- 00:00

[홍인숙의 문연路에서] “한 뼘의 턱을 넘어 공…
- 00:00

[열린마당] 전염성 높은 백일해 유행 주의
- 00:00

[열린마당] 누웨마루 '차 없는 거리'를 아시나요
- 00:00

[김준기의 문화광장] 한국의 비엔날레 30년
- 00:00

[열린마당]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 00:00

[열린마당] “바당에 나가신 삼춘들, 부디 괴양 …
- 00:00

[열린마당] 부주의로 인한 산불, 예방이 최선이…
- 00:00

[김태일의 월요논단] 도시 대개조가 도시민의 삶…
- 00:00

[열린마당] 제주도 AI 아나운서 '제이나'를 아시…














 2024.04.23(화) 18:17
2024.04.23(화)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