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43] 3부 오름-(102)갯거리오름, 구부러지고 비스듬한 오름
- 흩어져 있어도 이름은 하나, 일반명사처럼 사용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 입력 : 2025. 09.09. 03: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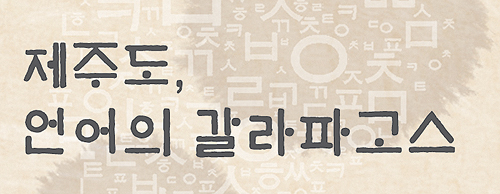
갯거리는 개 꼬리가 아니다
[한라일보]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에 있는 표고 253.5m, 비고 69m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오름이다. 제주도가 발간한 제주의 오름이라는 책에는 1963년도 간행 한림읍지를 인용하여 두 마리 개가 꼬리를 끌고 누워 있는 형상으로 '개꼬리오름'이라고 풀이한다고 소개했다.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피문악(皮文岳)이라 표기한 이래 고전에 따라 객항산(客巷山), 갯거리오름, 구미악(狗尾岳), 개골이오름, 갓그리오름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했다. 네이버지도에는 갯거리오름이라고 나오고, 지역에서는 개꼬리오름이라고도 한다.
 피문악(皮文岳)의 '피(皮)'는 '가죽 피'인데, 가죽은 '갓' 또는 '갗'이라고도 했다. '문(文)'은 '글월 문'이므로 '피문(皮文)'은 '갓그리'처럼 된다. 훈가자 차용 방식이다. 객항산(客巷山)의 '객(客)'은 '손 객'이다. '객'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므로 음가자 차용방식으로 쓴 것이다. '항(巷)'은 '거리 항'자이므로 훈가자 차용방식이다. 즉, '객항(客巷)'은 갯거리오름을 나타낸 지명이다. 구미악(狗尾岳)의 '구(狗)'는 '개 구', '미(尾)'는 '꼬리 미'자이다. 역시 '개꼬리'라는 지명을 표기하려고 했다. 개골이오름, 갓그리오름, 개꼬리오름 등 모두 이의 변음일 것이다.
피문악(皮文岳)의 '피(皮)'는 '가죽 피'인데, 가죽은 '갓' 또는 '갗'이라고도 했다. '문(文)'은 '글월 문'이므로 '피문(皮文)'은 '갓그리'처럼 된다. 훈가자 차용 방식이다. 객항산(客巷山)의 '객(客)'은 '손 객'이다. '객'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므로 음가자 차용방식으로 쓴 것이다. '항(巷)'은 '거리 항'자이므로 훈가자 차용방식이다. 즉, '객항(客巷)'은 갯거리오름을 나타낸 지명이다. 구미악(狗尾岳)의 '구(狗)'는 '개 구', '미(尾)'는 '꼬리 미'자이다. 역시 '개꼬리'라는 지명을 표기하려고 했다. 개골이오름, 갓그리오름, 개꼬리오름 등 모두 이의 변음일 것이다.
이와 똑같은 지명이 또 있다. 서귀포시 대포동 표고 708.4m, 비고 38m의 낮은 오름이다. 서귀포휴양림에서 거린사슴에 연하는 방향으로 긴 오름이다. 1100도로 서귀포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가다가 옛 탐라대학을 조금 지나면 거린사슴이라는 지점이 나온다. 이곳은 급커브면서 급경사이기도 하다. 도로 왼쪽은 거린사슴이고 오른쪽이 이 오름이다. 올라가는 방향 즉, 이 오름 기준 남서쪽은 급경사이고 북동쪽은 완만하다. 서귀포휴양림에서 이 오름의 정상까지는 거의 오름이라는 걸 알 수 없을 정도로 평평하다.
어찌 된 셈인지 카카오맵에는 이 오름을 '갯머리오름'으로 표기했다. 여기서 '머리'는 '마르'의 변음이다. 산마루가 평평한 이 오름의 지형 특징으로 본다면 적절한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 그렇게 부르는지는 의문이다.

'거리'는 오름, '갯'은?
갯거리오름이라는 지명에 대해 도로 북쪽이 낮고 남쪽이 높아 그 형세가 일반의 오름과는 반대로 되어 있다는 데서 '갯거리오름' 또는 '갓그리오름'이라고 했다는 설명이 있다. 아마 이 지명 '갯거리' 혹은 '갓그리'가 '거꾸로'에서 온 말로 보는 모양이다. 중세어에 이런 어휘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설명은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름이 '북쪽은 높고 남쪽은 낮다'라는 건 그 근거가 희박하다. 이런 혼자만의 생각을 일반화해서 주장의 근거로 슬쩍 끼워 넣는 건 곤란하다.
갯거리오름은 '갯+거리+오름'의 구조다. 여기서 '거리'란 북방어에서 '(낮은) 산'을 지시하기도 하고, 몽골 고어에서는 벼랑이나 급경사를 지시한다. '넙거리' 오름 편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러므로 '거리+오름'은 '오름+오름'이 되어 '오름'이 덧붙은 구조다.
그렇다면 '갯'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몽골고어에서 '겟~'으로 발음하여 '비스듬한', '완곡한', '경사가 심한'의 뜻으로 쓴다. 돌궐어서는 '갯~'으로 발음하여 '비스듬한', '기울어진' 등의 의미를 갖는다. 갯거리오름은 북쪽은 완만하고 남쪽은 경사가 심하다. 기울어진 듯 혹은 구부러져 완곡한 듯도 보인다.
붉은오름, 민오름, 당오름처럼 같은 지명을 갖는 오름들이 꽤 있다. 고대인들은 형태에 따라 일반명사로 썼기 때문이다. 갯거리오름도 이 외에 지명이 유사한 오름이 또 있다. 서귀포시 하원동과 회수동 경계에 구산봉이란 오름이다. 남북으로 긴 등성마루 양 끝에 두 봉우리를 이룬다. 동사면 상부는 비교적 평탄하여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서사면은 급경사를 이룬다. 구산망(狗山望), 구산봉(狗山峰)이라고도 부른다. 구산망(狗山望)은 옛날 봉수대가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하는 설명도 있지만 실은 위기 평평해서 '마르'라 했던 음을 '망'으로 차자한 것이다. '산(山)' 역시 '마르'의 변음 '뫼'를 이렇게 쓴 것이다.
갯거리오름, 기울어졌거나 비스듬해
세종실록 세종 21년 조(1439년)에 거옥(居玉)이라 한 이후 거옥악(居玉岳), 구악(龜岳), 구산망(龜山望), 구산봉(龜山烽), 굴산봉(窟山烽), 굴산봉(屈山烽), 구악(龜岳), 굴산봉(窟山峰), 굿산망, 구산망(狗山望) 등으로 표기했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 굿산망으로 표기했다.
망, 봉, 악 등 덧붙은 지명소를 제외하면, 거옥(居玉), 구악(龜), 구산(龜山), 굴산(窟山), 굴산(屈山), 굿산, 구산(狗山) 등 7가지다. 가장 이른 시기에 나오는 '거옥(居玉)'이란 지명에 대해 예전부터 '거옥오름'이라 부르고, 이 '거옥'이란 거북의 방언이며, 이는 이 오름이 거북 모양이란 데서 유래한 것이라 한 전문가가 있다. 문제는 '거옥오름'이라 불렀는지 확인이 안 되고, 제주 방언에 거북이를 '거옥'이라고 하는지도 의문이며, 이 오름이 거북이를 닮았다는 것도 개인 의견일 뿐이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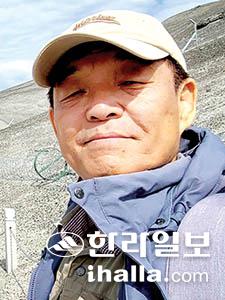 '거옥(居玉)'의 옥(玉)은 말음 'ㄱ'만을 표현하려고 동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거옥(居玉)'은 '걱'이 되어 '갯'과 가까운 음이 된다. 받침 'ㅅ'은 제주어에서 간혹 'ㄱ'과 대체되는 경우가 있다. '굿가시낭'은 '국가시낭'으로도 발음한다. 앞의 명월리 갯거리오름을 '객항산(客巷山)'이라고 표기한 예가 이런 추정을 더욱 뒷받침한다. 구산(龜山)은 '갓마;르'를, 굴산(窟山), 굴산(屈山), 굿산, 구산(狗山) 등은 '굿마르' 즉 '갯마르'와 음이 같거나 약간의 변음을 나타낸 것일 것이다. 갯거리오름은 기울어졌거나 비스듬한 오름을 말한다.
'거옥(居玉)'의 옥(玉)은 말음 'ㄱ'만을 표현하려고 동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거옥(居玉)'은 '걱'이 되어 '갯'과 가까운 음이 된다. 받침 'ㅅ'은 제주어에서 간혹 'ㄱ'과 대체되는 경우가 있다. '굿가시낭'은 '국가시낭'으로도 발음한다. 앞의 명월리 갯거리오름을 '객항산(客巷山)'이라고 표기한 예가 이런 추정을 더욱 뒷받침한다. 구산(龜山)은 '갓마;르'를, 굴산(窟山), 굴산(屈山), 굿산, 구산(狗山) 등은 '굿마르' 즉 '갯마르'와 음이 같거나 약간의 변음을 나타낸 것일 것이다. 갯거리오름은 기울어졌거나 비스듬한 오름을 말한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한라일보]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에 있는 표고 253.5m, 비고 69m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오름이다. 제주도가 발간한 제주의 오름이라는 책에는 1963년도 간행 한림읍지를 인용하여 두 마리 개가 꼬리를 끌고 누워 있는 형상으로 '개꼬리오름'이라고 풀이한다고 소개했다.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피문악(皮文岳)이라 표기한 이래 고전에 따라 객항산(客巷山), 갯거리오름, 구미악(狗尾岳), 개골이오름, 갓그리오름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했다. 네이버지도에는 갯거리오름이라고 나오고, 지역에서는 개꼬리오름이라고도 한다.

갯거리오름, 일부는 완만하고 일부는 급경사로서 구부러지고 비스듬하다. 김찬수
이와 똑같은 지명이 또 있다. 서귀포시 대포동 표고 708.4m, 비고 38m의 낮은 오름이다. 서귀포휴양림에서 거린사슴에 연하는 방향으로 긴 오름이다. 1100도로 서귀포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가다가 옛 탐라대학을 조금 지나면 거린사슴이라는 지점이 나온다. 이곳은 급커브면서 급경사이기도 하다. 도로 왼쪽은 거린사슴이고 오른쪽이 이 오름이다. 올라가는 방향 즉, 이 오름 기준 남서쪽은 급경사이고 북동쪽은 완만하다. 서귀포휴양림에서 이 오름의 정상까지는 거의 오름이라는 걸 알 수 없을 정도로 평평하다.
어찌 된 셈인지 카카오맵에는 이 오름을 '갯머리오름'으로 표기했다. 여기서 '머리'는 '마르'의 변음이다. 산마루가 평평한 이 오름의 지형 특징으로 본다면 적절한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 그렇게 부르는지는 의문이다.

갯거리오름, 갯머리라고도 하며, 거린사슴 동쪽이다. 김찬수
'거리'는 오름, '갯'은?
갯거리오름이라는 지명에 대해 도로 북쪽이 낮고 남쪽이 높아 그 형세가 일반의 오름과는 반대로 되어 있다는 데서 '갯거리오름' 또는 '갓그리오름'이라고 했다는 설명이 있다. 아마 이 지명 '갯거리' 혹은 '갓그리'가 '거꾸로'에서 온 말로 보는 모양이다. 중세어에 이런 어휘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설명은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름이 '북쪽은 높고 남쪽은 낮다'라는 건 그 근거가 희박하다. 이런 혼자만의 생각을 일반화해서 주장의 근거로 슬쩍 끼워 넣는 건 곤란하다.
갯거리오름은 '갯+거리+오름'의 구조다. 여기서 '거리'란 북방어에서 '(낮은) 산'을 지시하기도 하고, 몽골 고어에서는 벼랑이나 급경사를 지시한다. '넙거리' 오름 편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러므로 '거리+오름'은 '오름+오름'이 되어 '오름'이 덧붙은 구조다.
그렇다면 '갯'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몽골고어에서 '겟~'으로 발음하여 '비스듬한', '완곡한', '경사가 심한'의 뜻으로 쓴다. 돌궐어서는 '갯~'으로 발음하여 '비스듬한', '기울어진' 등의 의미를 갖는다. 갯거리오름은 북쪽은 완만하고 남쪽은 경사가 심하다. 기울어진 듯 혹은 구부러져 완곡한 듯도 보인다.
붉은오름, 민오름, 당오름처럼 같은 지명을 갖는 오름들이 꽤 있다. 고대인들은 형태에 따라 일반명사로 썼기 때문이다. 갯거리오름도 이 외에 지명이 유사한 오름이 또 있다. 서귀포시 하원동과 회수동 경계에 구산봉이란 오름이다. 남북으로 긴 등성마루 양 끝에 두 봉우리를 이룬다. 동사면 상부는 비교적 평탄하여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서사면은 급경사를 이룬다. 구산망(狗山望), 구산봉(狗山峰)이라고도 부른다. 구산망(狗山望)은 옛날 봉수대가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하는 설명도 있지만 실은 위기 평평해서 '마르'라 했던 음을 '망'으로 차자한 것이다. '산(山)' 역시 '마르'의 변음 '뫼'를 이렇게 쓴 것이다.
갯거리오름, 기울어졌거나 비스듬해
세종실록 세종 21년 조(1439년)에 거옥(居玉)이라 한 이후 거옥악(居玉岳), 구악(龜岳), 구산망(龜山望), 구산봉(龜山烽), 굴산봉(窟山烽), 굴산봉(屈山烽), 구악(龜岳), 굴산봉(窟山峰), 굿산망, 구산망(狗山望) 등으로 표기했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 굿산망으로 표기했다.
망, 봉, 악 등 덧붙은 지명소를 제외하면, 거옥(居玉), 구악(龜), 구산(龜山), 굴산(窟山), 굴산(屈山), 굿산, 구산(狗山) 등 7가지다. 가장 이른 시기에 나오는 '거옥(居玉)'이란 지명에 대해 예전부터 '거옥오름'이라 부르고, 이 '거옥'이란 거북의 방언이며, 이는 이 오름이 거북 모양이란 데서 유래한 것이라 한 전문가가 있다. 문제는 '거옥오름'이라 불렀는지 확인이 안 되고, 제주 방언에 거북이를 '거옥'이라고 하는지도 의문이며, 이 오름이 거북이를 닮았다는 것도 개인 의견일 뿐이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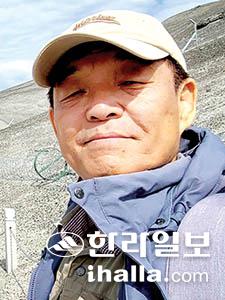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