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38] 3부 오름-(98)민대가리동산과 큰두레왓, 위가 평평하다
- 민대가리, '등성마루가 길고 평평한 오름'의 고대어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 입력 : 2025. 08.12. 03: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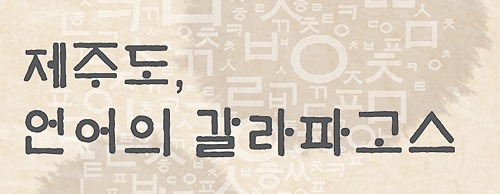
제주도의 지명은 고대어가 대부분
[한라일보] 민대가리동산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속한다. 표고 1600.5m, 자체높이 76m 정도다. 촛대봉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다. 윗세오름대피소에서 1㎞쯤 하산한 지점의 왼쪽 오름은 만세동산이다. 오른쪽은 어리목계곡으로 이어지는 Y계곡의 지류다. 이 계곡을 건너 멀리 보이는 오름이 민대가리동산이다.
 이 오름의 지명은 쉬운 듯하면서도 한편 아리송한 측면도 있다. "민대가리동산의 '대가리'는 '머리'의 속어이고 '민'은 '나무 따위가 전혀 없다'는 의미로 곧 '풀과 잔디로만 이루어진 민둥산'이라는 데서 유래하였다. 근래에는 촛대와 같이 솟아 있다하여 '촛대봉'이라고도 한다." 어느 인터넷 백과사전의 설명이다. 이런 설명을 어형의 유사성에 기댄 해석이라고 한다.
이 오름의 지명은 쉬운 듯하면서도 한편 아리송한 측면도 있다. "민대가리동산의 '대가리'는 '머리'의 속어이고 '민'은 '나무 따위가 전혀 없다'는 의미로 곧 '풀과 잔디로만 이루어진 민둥산'이라는 데서 유래하였다. 근래에는 촛대와 같이 솟아 있다하여 '촛대봉'이라고도 한다." 어느 인터넷 백과사전의 설명이다. 이런 설명을 어형의 유사성에 기댄 해석이라고 한다.
제주도의 지명은 여기에 사람이 들어와 살기 시작함과 동시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그 역사가 매우 깊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므로 고대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지명에는 고대인의 정서가 담겨 있다. 지명을 해독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오늘날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어로 되었을 개연성이 다분하다는 점이다. 고대어와 현대어는 드물게 거의 형태가 같은 말도 남아있으나, 대부분 거리가 멀어졌다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가리'라는 말이 오늘날 머리를 지시한다고 해서 고대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단정하는 것이야말로 지명해독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셈이 된다.
'대가리'는 들판 같은 오름
또한 ‘민’이라는 말도 오늘날의 정서로 본다면 당연히 ‘나무 따위가 전혀 없이 풀과 잔디로만 되어 있는’의 의미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고대에도 이런 의미로 썼다고 주장한다는 건 그야말로 오늘날의 정서를 덧씌워 해석해 보려는 태도다. ‘나무 따위가 전혀 없어 민둥’이라는 정서는 다분히 산에는 나무가 울창해야 한다는 내면이 깔린 해석이다. 고대인도 산림을 자원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나무 따위가 전혀 없는’의 의미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언어는 다의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본 기획을 통하여 제시해 온 여러 사례로 볼 때 민대가리동산이란 ‘민+대+가리+동산’의 구조다. ‘민’이란 ‘ᄆᆞ르’에서 기원한 말이다. 바로 앞 만세동산 편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ᄆᆞ르’는 ‘ᄆᆞᆯ’로 축약되기도 하고 여기서 ‘ㄹ’이 탈락하여 ‘ᄆᆞ’가 되기도 한다. 여기에 봉우리를 지시하는 후부요소를 만나게 되면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 ‘ᄆᆞᆫ’이 된다. 이 ‘ᄆᆞᆫ’이야말로 상황에 따라 ‘ᄆᆞᆫ’, ‘문’, ‘민’, ‘믠’ 등 다양하게 변신하게 된다. 결국 ‘ᄆᆞ르’에서 기원한 말이라는 뜻이다. ‘ᄆᆞ르’란 오늘날 ‘-마루’라는 지명소로 분화했는데, ‘길게 등성이가 이루어진 산의 정상부’를 가리키게 된다.
지금까지 본 기획을 통하여 제시해 온 여러 사례로 볼 때 민대가리동산이란 ‘민+대+가리+동산’의 구조다. ‘민’이란 ‘ᄆᆞ르’에서 기원한 말이다. 바로 앞 만세동산 편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ᄆᆞ르’는 ‘ᄆᆞᆯ’로 축약되기도 하고 여기서 ‘ㄹ’이 탈락하여 ‘ᄆᆞ’가 되기도 한다. 여기에 봉우리를 지시하는 후부요소를 만나게 되면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 ‘ᄆᆞᆫ’이 된다. 이 ‘ᄆᆞᆫ’이야말로 상황에 따라 ‘ᄆᆞᆫ’, ‘문’, ‘민’, ‘믠’ 등 다양하게 변신하게 된다. 결국 ‘ᄆᆞ르’에서 기원한 말이라는 뜻이다. ‘ᄆᆞ르’란 오늘날 ‘-마루’라는 지명소로 분화했는데, ‘길게 등성이가 이루어진 산의 정상부’를 가리키게 된다.
‘대’라는 지명어는 ‘ᄃᆞᆯ’에서 기원한 말이다. ‘ᄃᆞᆯ’이란 평평한 지형을 말한다. 우리말 ‘들’과도 같은 어원에서 분화했다. 북방어 중 몽골어계 기원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의 월라산 편과 따라비오름 편 등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이 민대가리오름에서 ‘대’로 나타난 것은 ‘ᄃᆞᆯ’에서 ‘ㄹ’이 탈락한 형태다. 이 오름(동산)의 정상은 넓게 평평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마지막 ‘가리’는 무슨 뜻인가? 이 말은 언덕 혹은 산을 지시하는 퉁구스어 ‘걸이(거리)’에서 기원한 말이다. 퉁구스어(만주어)계 나나이어와 오로크어와 공통이다. 걸세오름, 거린사슴, 거인악 등에서 볼 수 있었다. 민대가리동산이란 길게 등성이가 이루면서 위가 평평한 지형을 이룬 언덕과 같은 동산을 의미한다.
촛대봉은 'ᄉᆞᆺ대오름',
두레왓은 '들판 같은'
민대가리동산을 ‘촛대봉’이라고도 한다. ‘촛+대+봉’의 구조다. ‘촛’이란 봉우리를 의미하는 ‘소’, ‘ᄉᆞ’, ‘새’, ‘싀’ 등에 ‘ㅅ’이 개입한 형태다. ‘대’는 위의 ‘ᄃᆞᆯ’과 같다. ‘봉’은 오름이란 뜻이다. 촛대봉이란 원래 ‘ᄉᆞᆺ대동산’ 혹은 ‘ᄉᆞᆺ대오름’이었을 것이다. 이 말이 점차 한자화하고, 어두음 격음화에 연상작용이 겹쳐 ‘촛대봉’으로 된 것이다. 위가 평평한 봉우리라는 뜻이다. ‘촛대와 같이 솟아있어서’라고 해석한다면 얼마나 다른 뜻인가.
이 민대가리오름을 지나 Y계곡의 또 다른 지류를 건너면 정상에서 어리목 대피소에 이르는 웅장한 등성이를 만나게 된다. 이 등성이는 위가 평평한 들판 같은 지형을 이루는데 윗부분을 큰두레왓, 아랫부분을 족은 두레왓이라 한다. 큰두레왓은 한라산 북사면 표고는 대략 1,630m다. 족은두레왓은 표고 1,300m 정도에 해당한다. 오름이라기보다 넓은 고원이라 할만하다.
 1703년 탐라순력도 등에 ‘두리여(斗里礖)’, 1770년경 제작된 제주삼읍도총지도에 ‘대두리(大斗里)’, 1872년 제주지도에는 ‘두리서(斗里嶼)’, 1899년 제주군읍지에 ‘두리봉(斗里峯)’으로 표기했다. 이 지명에 대해 “‘두레’, 또는 ‘두리’는 ‘둥글다’의 의미를 지닌 고어이고, ‘왓’은 ‘밭’의 제주어이다. 오름의 형체가 경사가 완만한 둥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두레왓’이라 부른 것”이라는 설명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언어의 유사성에 기댄 해석이다. ‘둥글다’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민대가리오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레’ 혹은 ‘두리’는 ‘ᄃᆞᆯ’에서 기원한 말이다. ‘ᄃᆞᆯ’의 개음절 발음이 ‘두리’ 혹은 ‘두레’다. 위가 평평한 지형이라는 뜻이다. ‘ᄆᆞ르’가 등성이 평평하다는 산의 윤곽을 위주로 설명하는 말이라면 ‘ᄃᆞᆯ’은 들판처럼 지면이 평평하다는 데 중점을 둔 표현이다.
1703년 탐라순력도 등에 ‘두리여(斗里礖)’, 1770년경 제작된 제주삼읍도총지도에 ‘대두리(大斗里)’, 1872년 제주지도에는 ‘두리서(斗里嶼)’, 1899년 제주군읍지에 ‘두리봉(斗里峯)’으로 표기했다. 이 지명에 대해 “‘두레’, 또는 ‘두리’는 ‘둥글다’의 의미를 지닌 고어이고, ‘왓’은 ‘밭’의 제주어이다. 오름의 형체가 경사가 완만한 둥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두레왓’이라 부른 것”이라는 설명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언어의 유사성에 기댄 해석이다. ‘둥글다’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민대가리오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레’ 혹은 ‘두리’는 ‘ᄃᆞᆯ’에서 기원한 말이다. ‘ᄃᆞᆯ’의 개음절 발음이 ‘두리’ 혹은 ‘두레’다. 위가 평평한 지형이라는 뜻이다. ‘ᄆᆞ르’가 등성이 평평하다는 산의 윤곽을 위주로 설명하는 말이라면 ‘ᄃᆞᆯ’은 들판처럼 지면이 평평하다는 데 중점을 둔 표현이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한라일보] 민대가리동산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속한다. 표고 1600.5m, 자체높이 76m 정도다. 촛대봉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다. 윗세오름대피소에서 1㎞쯤 하산한 지점의 왼쪽 오름은 만세동산이다. 오른쪽은 어리목계곡으로 이어지는 Y계곡의 지류다. 이 계곡을 건너 멀리 보이는 오름이 민대가리동산이다.

민대가리오름, 어리목탐방로에서 찍었다. 김찬수
제주도의 지명은 여기에 사람이 들어와 살기 시작함과 동시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그 역사가 매우 깊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므로 고대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지명에는 고대인의 정서가 담겨 있다. 지명을 해독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오늘날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어로 되었을 개연성이 다분하다는 점이다. 고대어와 현대어는 드물게 거의 형태가 같은 말도 남아있으나, 대부분 거리가 멀어졌다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가리'라는 말이 오늘날 머리를 지시한다고 해서 고대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단정하는 것이야말로 지명해독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셈이 된다.
'대가리'는 들판 같은 오름
또한 ‘민’이라는 말도 오늘날의 정서로 본다면 당연히 ‘나무 따위가 전혀 없이 풀과 잔디로만 되어 있는’의 의미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고대에도 이런 의미로 썼다고 주장한다는 건 그야말로 오늘날의 정서를 덧씌워 해석해 보려는 태도다. ‘나무 따위가 전혀 없어 민둥’이라는 정서는 다분히 산에는 나무가 울창해야 한다는 내면이 깔린 해석이다. 고대인도 산림을 자원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나무 따위가 전혀 없는’의 의미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언어는 다의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정상 오른쪽 위가 평평한 곳이 민대가리오름, 정상 왼쪽에서 이어져 내린 능선이 큰두레왓과 족은두레왓이다. 김찬수
‘대’라는 지명어는 ‘ᄃᆞᆯ’에서 기원한 말이다. ‘ᄃᆞᆯ’이란 평평한 지형을 말한다. 우리말 ‘들’과도 같은 어원에서 분화했다. 북방어 중 몽골어계 기원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의 월라산 편과 따라비오름 편 등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이 민대가리오름에서 ‘대’로 나타난 것은 ‘ᄃᆞᆯ’에서 ‘ㄹ’이 탈락한 형태다. 이 오름(동산)의 정상은 넓게 평평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마지막 ‘가리’는 무슨 뜻인가? 이 말은 언덕 혹은 산을 지시하는 퉁구스어 ‘걸이(거리)’에서 기원한 말이다. 퉁구스어(만주어)계 나나이어와 오로크어와 공통이다. 걸세오름, 거린사슴, 거인악 등에서 볼 수 있었다. 민대가리동산이란 길게 등성이가 이루면서 위가 평평한 지형을 이룬 언덕과 같은 동산을 의미한다.
촛대봉은 'ᄉᆞᆺ대오름',
두레왓은 '들판 같은'
민대가리동산을 ‘촛대봉’이라고도 한다. ‘촛+대+봉’의 구조다. ‘촛’이란 봉우리를 의미하는 ‘소’, ‘ᄉᆞ’, ‘새’, ‘싀’ 등에 ‘ㅅ’이 개입한 형태다. ‘대’는 위의 ‘ᄃᆞᆯ’과 같다. ‘봉’은 오름이란 뜻이다. 촛대봉이란 원래 ‘ᄉᆞᆺ대동산’ 혹은 ‘ᄉᆞᆺ대오름’이었을 것이다. 이 말이 점차 한자화하고, 어두음 격음화에 연상작용이 겹쳐 ‘촛대봉’으로 된 것이다. 위가 평평한 봉우리라는 뜻이다. ‘촛대와 같이 솟아있어서’라고 해석한다면 얼마나 다른 뜻인가.
이 민대가리오름을 지나 Y계곡의 또 다른 지류를 건너면 정상에서 어리목 대피소에 이르는 웅장한 등성이를 만나게 된다. 이 등성이는 위가 평평한 들판 같은 지형을 이루는데 윗부분을 큰두레왓, 아랫부분을 족은 두레왓이라 한다. 큰두레왓은 한라산 북사면 표고는 대략 1,630m다. 족은두레왓은 표고 1,300m 정도에 해당한다. 오름이라기보다 넓은 고원이라 할만하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