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37] 3부 오름-(96)체오름은 봉우리가 있는 오름
-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설날은~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 입력 : 2025. 07.29. 03: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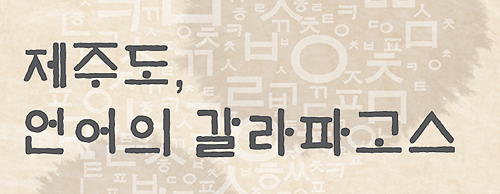
육지에선 ‘푸는체’를 ‘체’라고 불러
[한라일보]체오름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표고 382.2m, 자체높이 117m의 오름이다.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 1653년 탐라지 등에 기악(箕岳)으로 표기된 이래 체악(帖岳), 기산(箕山), 체악(岳), 체산(體山) 등으로도 표기됐다. 이 지명들은 체악(帖岳), 체악(岳), 체악(體山) 등이 하나이고, 기악(箕岳), 기산(箕山) 등이 또 하나다.
 체악(帖岳)의 '체(帖)'라는 글자는 흔히 '문서 첩'으로 익숙하겠지만 한편으로 영수증이라는 뜻의 '체지(帖紙) 체' 혹은 관아에서 이속을 채용할 때에 쓰는 임명장을 의미하는 '체'로도 읽힌다. 그러므로 음가자 차자 방식을 동원해 이 오름을 체오름이라 한다는 점을 나타내려고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체악(帖岳)의 '체(帖)'라는 글자는 흔히 '문서 첩'으로 익숙하겠지만 한편으로 영수증이라는 뜻의 '체지(帖紙) 체' 혹은 관아에서 이속을 채용할 때에 쓰는 임명장을 의미하는 '체'로도 읽힌다. 그러므로 음가자 차자 방식을 동원해 이 오름을 체오름이라 한다는 점을 나타내려고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오름의 지명을 기악(箕岳) 혹은 기산(箕山)이라고 했던 건 이 오름의 모양이 '푸는체' 혹은 '갈체' 모양이라서라는 설명이 있다. 이 설명은 지명에 들어있는 '기(箕)'라는 한자가 '키'를 의미하고, 이 말은 제주어로 '푸는체'를 지시하기 때문이란다.
기악(箕岳)과 기산(箕山)의 '기(箕)'라는 글자는 '키'를 지시하는 한자는 맞다. 이 '키'라는 발음이 지시하는 것이 제주어로는 '푸는체'라는 곡식을 까부르는 데 쓰는 농기구의 하나임에도 틀림없다. 그런데 이 '키'를 '키'라고 발음하는 곳은 경기도의 일부, 황해도 일부, 함경북도 일부, 평안남도 일부, 평안북도 일부에 불과하다. 나머지 경기도의 일부, 강원도 전부, 충북 옥천·영동을 제외한 충북 전부, 충남 거의 전부,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함남, 경북 등 일부 지방에서는 '치'라고 발음한다. '체'라고 하는 곳도 많다. 충남 일부, 전북과 전남의 일부 지방이다. '쳉이'라 부르는 곳이 있다. 사실 전국 대부분이 '키'를 '치'·'체'·'쳉이'로 발음하는 것이다. '푸는체'라 부르는 곳은 오직 제주어뿐이다. 자세한 내용은 1974년에 출판된 서울대 김형규교수의 역저 한국방언연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체오름의 ‘체’는 봉우리
따라서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약 100년 후 1653년 탐라지의 집필자들이 이 오름의 지명을 '기악(箕岳)'이라고 했던 건 이 오름의 모양이 '푸는체' 같아 그렇게 썼다기보다 '체오름'이라는 발음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점이 명백해진다.
 간혹 쳇망오름이나 체오름의 지명을 설명하면서 모양이 체와 같이 둥글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다. 그러나 '체'라는 기구가 언제부터 둥글었을까? 오늘날의 체는 대부분 둥글다. 특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체는 모두 둥글다. 그렇다 해도 오늘날처럼 철사로 그물을 만들어 이것을 나무나 플라스틱 재질로 된 둥근 테에 끼워 만든 체는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옛날에는 갈대, 대나무 같은 식물에서 얻은 재료를 엮어 만들었다. 둥글게 만들려면 더 노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게 대부분이었다. 오늘날 그러니 고대에도 그랬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다.
간혹 쳇망오름이나 체오름의 지명을 설명하면서 모양이 체와 같이 둥글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다. 그러나 '체'라는 기구가 언제부터 둥글었을까? 오늘날의 체는 대부분 둥글다. 특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체는 모두 둥글다. 그렇다 해도 오늘날처럼 철사로 그물을 만들어 이것을 나무나 플라스틱 재질로 된 둥근 테에 끼워 만든 체는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옛날에는 갈대, 대나무 같은 식물에서 얻은 재료를 엮어 만들었다. 둥글게 만들려면 더 노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게 대부분이었다. 오늘날 그러니 고대에도 그랬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다.
'체'라는 말은 '새다'의 '새'와 같은 어원에서 파생한 말이다. '체'라는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새'라는 현상이나 기능이 핵심이다.
체오름의 '체'란 모양이 둥글다거나 '푸는체'처럼 벌어졌다는 뜻이 아니다. 지난 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구려 지명에 '봉우리'를 나타내는 지명어 '솥', '삿', '생', '싕' 등이 나타난다. 이 말은 이어지는 말과 만나면서 받침음이 탈락해 '소', '사', '새', '싀'로도 변할 수 있다. 어승생도 그랬고, 달랑쉬도 그랬다. 때에 따라 격음화하면서 '체'로도 나타난다. 체오름의 '체'란 봉우리를 뜻한다. 고구려어 기원이다.
또 한 가지, 이 지명에서 기산(箕山), 체산(體山)처럼 '산(山)'이 들어간 지명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악(岳)'을 '산(山)'으로 표기한 것이 아니다. 산(山)은 '뫼'를 차자할 때 흔히 쓰는 글자지만 악(岳)의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마르'를 나타내려고 쓴 것이다. 그러므로 체오름은 한 때 '체마르'로도 썼을 것이다. 봉우리가 있는 마르의 뜻이다.
거친오름의 ‘거친’은 ‘작은’의 뜻
이 오름 남서쪽에 거친오름이 인접해 있다. 같은 송당리 지경이다. 표고 354.6m이며, 자체높이는 70m, 저경 578m로 자그마한 오름이다. 이 오름 지명에 대해 '거칠어서' 붙은 지명이란 설명이 있다. 1872년 제주삼읍전도, 1899년 제주지도 등에 황악(荒岳)으로 표기한 것을 비롯해 거친악(巨親岳), 거친오름, 가친악(可親岳) 등으로 표기했다.
 오늘날의 언어로 본다면 '거친'이나 '가친'은 '거칠다'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황악(荒岳)에 이르러서는 더욱 이런 심증을 굳힐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거칠 황'이라는 글자는 훈가자 표기 방식으로 쓴 것이다. '거칠 황'의 '거칠'이라는 발음만 읽으라는 취지다. 실제로 거칠어서 이렇게 쓴 게 아니기 때문이다. '거친'이나 '가친'은 '작은'의 고대어다.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까치 설날은 작은 설날이다. '까치'란 '앛'의 고어형 '갗'의 경음화 발음이다.
오늘날의 언어로 본다면 '거친'이나 '가친'은 '거칠다'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황악(荒岳)에 이르러서는 더욱 이런 심증을 굳힐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거칠 황'이라는 글자는 훈가자 표기 방식으로 쓴 것이다. '거칠 황'의 '거칠'이라는 발음만 읽으라는 취지다. 실제로 거칠어서 이렇게 쓴 게 아니기 때문이다. '거친'이나 '가친'은 '작은'의 고대어다.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까치 설날은 작은 설날이다. '까치'란 '앛'의 고어형 '갗'의 경음화 발음이다.
제주시 봉개동에도 거친오름이 있다. 위의 송당리 거친오름과 이름이 같다. 고전의 표기도 거의 똑같다. 이름만으론 헷갈리기 쉽다. 이 오름을 가시덤불로 이루어져 붙은 이름이라고 설명한다. 역시 현대어로 해독한 결과다. 인접한 절물오름과 개월이오름 등에 비해 작은 오름이라는 뜻이다. 이 부분은 아끈달랑쉬의 '아끈', 안친오름의 '안친' 등과 어원을 공유한다. 체오름은 봉우리가 있는 오름이다. 거친오름은 작은 오름이란 뜻이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한라일보]체오름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표고 382.2m, 자체높이 117m의 오름이다.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 1653년 탐라지 등에 기악(箕岳)으로 표기된 이래 체악(帖岳), 기산(箕山), 체악(岳), 체산(體山) 등으로도 표기됐다. 이 지명들은 체악(帖岳), 체악(岳), 체악(體山) 등이 하나이고, 기악(箕岳), 기산(箕山) 등이 또 하나다.

봉우리가 있는 큰 오름이 체오름. 왼쪽에 거친오름이 작게 보인다. 동남쪽 밧돌오름에서 촬영. 김찬수
이 오름의 지명을 기악(箕岳) 혹은 기산(箕山)이라고 했던 건 이 오름의 모양이 '푸는체' 혹은 '갈체' 모양이라서라는 설명이 있다. 이 설명은 지명에 들어있는 '기(箕)'라는 한자가 '키'를 의미하고, 이 말은 제주어로 '푸는체'를 지시하기 때문이란다.
기악(箕岳)과 기산(箕山)의 '기(箕)'라는 글자는 '키'를 지시하는 한자는 맞다. 이 '키'라는 발음이 지시하는 것이 제주어로는 '푸는체'라는 곡식을 까부르는 데 쓰는 농기구의 하나임에도 틀림없다. 그런데 이 '키'를 '키'라고 발음하는 곳은 경기도의 일부, 황해도 일부, 함경북도 일부, 평안남도 일부, 평안북도 일부에 불과하다. 나머지 경기도의 일부, 강원도 전부, 충북 옥천·영동을 제외한 충북 전부, 충남 거의 전부,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함남, 경북 등 일부 지방에서는 '치'라고 발음한다. '체'라고 하는 곳도 많다. 충남 일부, 전북과 전남의 일부 지방이다. '쳉이'라 부르는 곳이 있다. 사실 전국 대부분이 '키'를 '치'·'체'·'쳉이'로 발음하는 것이다. '푸는체'라 부르는 곳은 오직 제주어뿐이다. 자세한 내용은 1974년에 출판된 서울대 김형규교수의 역저 한국방언연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체오름의 ‘체’는 봉우리
따라서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약 100년 후 1653년 탐라지의 집필자들이 이 오름의 지명을 '기악(箕岳)'이라고 했던 건 이 오름의 모양이 '푸는체' 같아 그렇게 썼다기보다 '체오름'이라는 발음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점이 명백해진다.

남서쪽 선흘 민오름 입구에서 바라본 체오름.김찬수
'체'라는 말은 '새다'의 '새'와 같은 어원에서 파생한 말이다. '체'라는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새'라는 현상이나 기능이 핵심이다.
체오름의 '체'란 모양이 둥글다거나 '푸는체'처럼 벌어졌다는 뜻이 아니다. 지난 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구려 지명에 '봉우리'를 나타내는 지명어 '솥', '삿', '생', '싕' 등이 나타난다. 이 말은 이어지는 말과 만나면서 받침음이 탈락해 '소', '사', '새', '싀'로도 변할 수 있다. 어승생도 그랬고, 달랑쉬도 그랬다. 때에 따라 격음화하면서 '체'로도 나타난다. 체오름의 '체'란 봉우리를 뜻한다. 고구려어 기원이다.
또 한 가지, 이 지명에서 기산(箕山), 체산(體山)처럼 '산(山)'이 들어간 지명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악(岳)'을 '산(山)'으로 표기한 것이 아니다. 산(山)은 '뫼'를 차자할 때 흔히 쓰는 글자지만 악(岳)의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마르'를 나타내려고 쓴 것이다. 그러므로 체오름은 한 때 '체마르'로도 썼을 것이다. 봉우리가 있는 마르의 뜻이다.
거친오름의 ‘거친’은 ‘작은’의 뜻
이 오름 남서쪽에 거친오름이 인접해 있다. 같은 송당리 지경이다. 표고 354.6m이며, 자체높이는 70m, 저경 578m로 자그마한 오름이다. 이 오름 지명에 대해 '거칠어서' 붙은 지명이란 설명이 있다. 1872년 제주삼읍전도, 1899년 제주지도 등에 황악(荒岳)으로 표기한 것을 비롯해 거친악(巨親岳), 거친오름, 가친악(可親岳) 등으로 표기했다.

거친오름.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촬영. 김찬수
제주시 봉개동에도 거친오름이 있다. 위의 송당리 거친오름과 이름이 같다. 고전의 표기도 거의 똑같다. 이름만으론 헷갈리기 쉽다. 이 오름을 가시덤불로 이루어져 붙은 이름이라고 설명한다. 역시 현대어로 해독한 결과다. 인접한 절물오름과 개월이오름 등에 비해 작은 오름이라는 뜻이다. 이 부분은 아끈달랑쉬의 '아끈', 안친오름의 '안친' 등과 어원을 공유한다. 체오름은 봉우리가 있는 오름이다. 거친오름은 작은 오름이란 뜻이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